이런 전통이 존재한다는 것도, 이런 전통을 지키자는 학생들의 움직임도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대학에는 고루한 전통이 적지 않습니다. 졸업식 날 입는 불편한 복장도, 교수의 정년보장이라는 오래된 제도도, 흔히 라틴어로 장식된 대학의 교표도 빨리 변하는 세상에 잘 안 맞는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대학은 스스로 세상과 거리를 두려는 자세를 강력히 견지해왔습니다. 근대적인 대학의 전형이라고 불리는 베를린 훔볼트 대학의 경우, 설립자 훔볼트는 '정치권력에 제약받지 않는 교수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대학의 가장 중요한 지향점이라고 선언했고 이후 많은 대학들이 이러한 정신을 자신의 설립이념에 새겨 넣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우리나라에서는 심지어 헌법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헌법 31조4항은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학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높은 청년실업이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청년실업자를 양산하는 대학이 무슨 소용이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들에서 취업률이 낮은 학과를 줄이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더 큰 목소리로, 산업계에서 필요한 인력수요를 '정확히' 예측해서 그에 맞게 교육을 해내라는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세상의 거리를 없애버리라는 요구이지요. 중세로부터 이어져 온 고집스러운 '거리 두기'의 관습은 이제 해체될 운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살면서 세상과 조금쯤 불화해 보는 기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런 쓸모없는 경험과 생각이 결국 뭔가를 창조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대착오적이지요.
김도현 국민대 경영학 교수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충무로에서]죽이 되든 밥이 되든](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7/2013082711293029880_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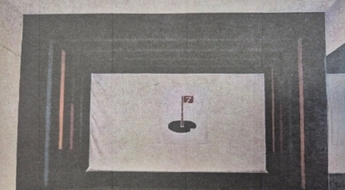

![[초동시각]총수의 국적](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2908090834957A.jpg)
![[정책의 맥]'피크 코리아' 뛰어넘을 지속성장 전략](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2914410547077A.jpg)
![[SCMP 칼럼]남미에서 북극…규칙 바꾸는 트럼프](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2914420252892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속보]대법원, 삼성전자 성과급 평균 임금성 사건 파기환송](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2815262719314_1769581587.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