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소설가 프랑수아즈 사강이 코카인 소지 혐의로 기소됐을 때 법정에서 한 유명한 말이다. 당시 판사는 뭐라고 답했을까. 답변을 알려지지 않았지만 문유석 판사는 책 ‘최소한의 선의’(문학동네)를 통해 “나라면 뭐라고 했을까. 답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다”며 “솔직히 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나로서는 우선 동감부터 했을지 모르겠다. 그러게요. 제가 당신을 처벌할 권리가 있을까요”라고 말한다.
개인주의자인 저자는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무엇이든 할 자유가 있다. 꼭 가치 있고 훌륭한 일만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개인에게는 얼마든지 유별날 자유, 비루할 자유, 불온한 자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불리는 마약, (사기가 아닌) 도박, 자살 등이 행복추구권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대마를 자유롭게 수수하고 흡연할 자유를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영역에 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피해자 없는 범죄 역시 범죄로 규정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도박의 경우 누군가는 내 돈을 내가 탕진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할 수 있지만 엄연히 불법이다. 법원 파산부에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저자는 “도박, 투기적 주식거래 등에 중독돼 가족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가는 사례를 끝도 없이 접했다”며 “‘나를 파괴할 권리’라지만 대부분의 경우 혼자만 파괴되지 않고, 물귀신처럼 주변 사람들까지 같이 수렁 속으로 끌고 들어가게 된다”고 말한다.
마약 역시 마찬가지다. 혼자 골방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게 사회에 무슨 영향을 미치느냐고 항변할 수 있지만,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생겨”나는 게 이치다. 국가로서는 “수요부터 통제”할 수밖에 없다.
자살은 국가에 따라 범죄 유무가 달라진다. 영국은 1962년까지 자살 시도를 범죄시 했다. 미국 역시 1964년까지 앨라배마, 켄터키, 뉴저지,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등 아홉 개 주에서 자살 시도를 흉악 범죄로 간주했다. 옛날 얘기냐고? 아니다. 지난해 8월4일 말레이시아 법원은 투신자살 시도자에게 벌금 3000링깃(약 85만원)을 부과했다. 이 외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레바논, 미얀마, 가나, 케냐, 수단, 우간다 등은 자살시도를 범죄로 규정한다. 우리나라는 자살시도 자체를 범죄시하진 않지만 타인의 자살에 관여한 자에 한해 자살 교사 및 방조죄로 처벌하고 있다.
자살의 처벌은 언뜻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회의 유기적 성향을 고려할 때 공동체에 미치는 파장이 커 제재의 필요성이 없지 않다. 실제로 자살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송인한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명이 약 여섯명의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평균 20명 정도의 주의 사람들이 ‘자살 생존자’로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처럼 인구밀도가 높고 관계지향적인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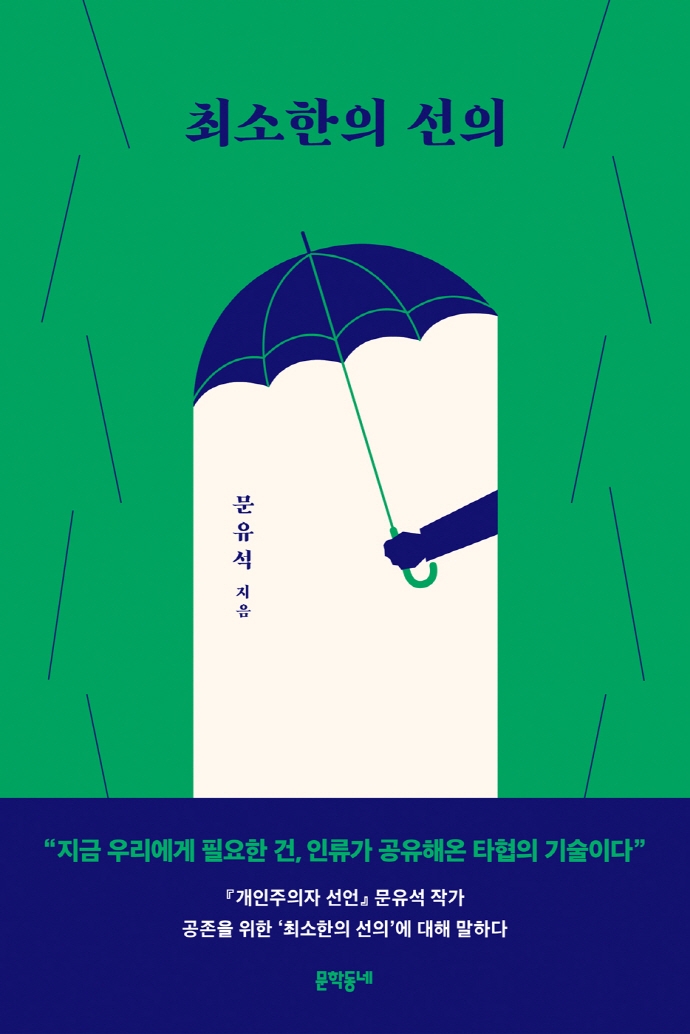
하지만 저자는 “이 모든 논리가 다 맞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유가 원칙이고 제한이 예외다. 자유를 제한하려는 사회 쪽이 개별적인 사안마다 제한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입증해야 하고, 개인은 너무 쉽게 그 제한을 받아들이고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며 “‘나를 파괴하는 행위’조차 당연한 듯 쉽게 규제된다면 다른 행위들은 더더욱 쉽게 규제될 것이다. 시민들이 경계를 게을리 하면 사회는 개인적 자유의 모든 영역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명분으로 침투하려는 유혹을 느끼게 된다”고 역설한다. 그러면서 “자유에 대한 제한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사회는 결국 자유 자체를 잃게 될 것”이라며 “누군가 일견 철없어 보이고, 낯설고, 내가 보기에는 그다지 가치 없어 보이는 자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 해도 가벼이 넘기지 말고 일단 그의 주장을 경청해야 하는 이유”라고 토로한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