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공유경제①] 법적으로 정체 불명확한 전동킥보드
실제 이용자들 헬멧 안 쓰고 인도나 자전거 도로 달려
법제도 정비·인식변화 절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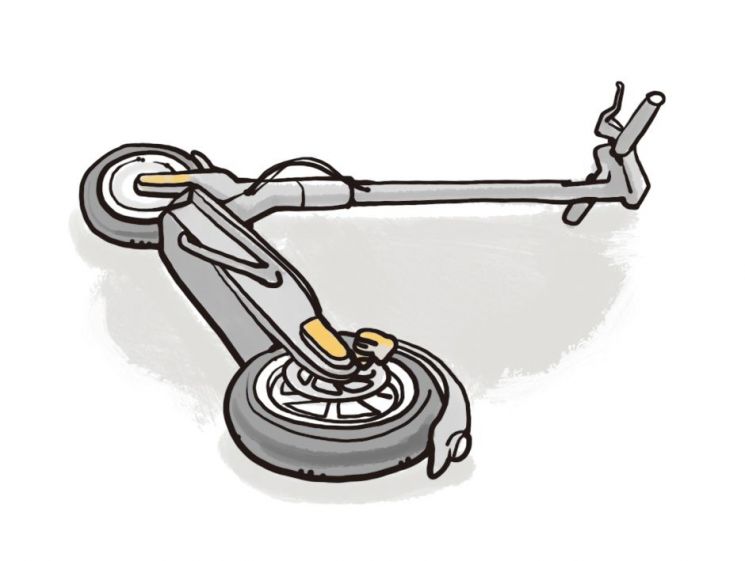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이민우 기자] 직장인 정진영(가명)씨는 지난 주말 서울 마포대교를 산책하다가 문득 발길을 멈췄다. 주인을 잃은 전동킥보드가 휑하니 쓰러져 있었기 때문이다. '혹시 사고가 난 것일까?' 정씨는 걱정되는 마음에 황급히 다가갔다. 하지만 사고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알고보니 누군가 전동킥보드를 빌려 쓰고는 되돌려주지 않고 그냥 떠난 것이었다. 전동킥보드는 이용가능 지역이 있는데 마포대교가 그 경계선이었다. 저렇게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수거하느라 대여 업체 직원들은 수시로 한강다리를 찾고 있다. 정씨는 "공유경제가 새로운 가치로 평가받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며 "새로운 변화에 맞는 제도도 필요하지만 소비자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초단 거리를 이동하는 개인 이동수단 '마이크로모빌리티' 시장에도 공유경제가 확산되고 있다. 대중교통에서 내린 뒤 집까지 마지막 1마일(1.6㎞)을 이동하는 데 주로 쓰인다고 해서 '라스트마일 모빌리티'라고 부른다. 라스트마일 모빌리티의 주인공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다. 이 시장을 노리는 벤처들도 국내에서만 10여곳으로 늘었다. 2018년 국내 최초로 서비스를 시작한 킥고잉은 가입자수가 25만명을 넘어섰다. 경쟁사인 씽씽도 최근 회원수 10만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마이크로모빌리티는 법적으로 정체가 불명확하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따라서 마이크로모빌리티를 이용하려면 원동기 면허나 그에 준하는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도 없고, 헬멧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원리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대중교통에서 내린 뒤 집까지 1마일 이내 거리를 이동한다는 '마지막 1마일'의 취지는 무색해진다.
마이크로모빌리티 이용자들은 알면서도, 혹은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되고 있다. 강남이나 신촌 등 번화가에서는 전동킥보드가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달리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헬멧을 쓴 이용자도 거의 없다. 이처럼 현실과 제도가 충돌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제 자리 걸음이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월 전동킥보드를 자전거 도로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놨다. 앞서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도 전동킥보드의 운행기준과 안전규제를 담은 개정안을 2017년 발의한 바 있다.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은 차량공유서비스 '타다'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불법으로 판단해 불구속 기소한 이후 타다 논란은 공유경제 전반의 논쟁으로 확산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측은 "정부 차원에서 공유경제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공유경제가 자리잡을 틀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공유에 대한 인식 변화, 기술적 개선 등과 함께 서둘러 제도가 마련돼야 공유경제가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