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의 관계 규명한 세 학자
자본주의 역동성 만드는 핵심 개념
정체경제 시스템이 지속성장 좌우
경쟁 촉진과 약자 보호 균형이 답
2025년 노벨경제학상은 조엘 모키르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 필리프 아기옹 프랑스 콜레주 드 프랑스 교수,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교수에게 돌아갔다. 세 학자는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개념을 이어받아서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의 관계를 연구해 왔다. 선정 이유는 "지속적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인 기술 진보와 혁신의 작동 원리를 규명"한 점이다.
창조적 파괴란 기업가가 새로운 상품, 새로운 생산 방법, 새로운 시장 개척 등 혁신을 추구함으로써 기존 경제 구조를 바꾸는 걸 말한다. 자본주의는 이 과정이 끝없이 일어나는 역동성을 특징으로 한다. 시장 경쟁과 이윤 추구가 그 작동 원리인 까닭이다. 혁신이 사회 전반에 빠르게 도입되고 퍼질 수 있게 하면, 성장은 가속한다. 세 학자는 창조적 파괴가 기득권과 갈등하는 과정, 국가가 이를 잘 다스리지 못할 때 기득권 세력이 어떻게 혁신을 저지하는지 보여 주었다.
혁신은 저절로 생겨나거나,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카드웰의 법칙' 탓이다. 영국 사학자 도널드 카드웰에 따르면, 혁신을 주도했던 어떤 나라도 몇 세대 이상 기술 혁신을 이어가지 못한 채, 결국 경쟁력을 잃고 추락했다. 유럽사가 그 증거다. 르네상스 시대에 유럽에서 혁신을 주도했던 곳은 이탈리아 북부와 독일 남부였다. 그러나 선도 지역은 대서양 항로 개척 이후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종교 개혁 땐 네덜란드로, 산업혁명기엔 영국으로, 19세기 말엔 독일과 미국으로 넘어간다. 선도 국가에서 혁신이 점차 시들해지는 이유는 과거 혁신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기득권 세력이 새로운 혁신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기술 혁신은 사회 체제와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 기술 개발과 그 도입 과정은 낡은 믿음이나 통념을 파괴한다. 옛것을 숭상하는 사회, 낡은 종교나 관습이 지배하는 사회에선 혁신은 퍼지지 못한다. 보수 세력은 항상 '고장 나지 않았다면, 고치면 안 된다'라고 말한다. 이들이 갈릴레이를 종교 재판에 부쳤다. 게다가 혁신은 낡은 조직이나 사회를 파괴한다. 기득권 세력은 혁신을 환영하지 않는다. 이들은 압력을 넣어 자기에게 유리하게, 즉 지대 추구와 불로소득을 보장하도록 사회 체제를 바꾼다. 부유세와 상속세를 감면하고, 새로운 기술에 장벽을 세운다. 그에 따라 국가는 점차 활력과 경쟁력을 상실한다. 지속적 발전의 열쇠는 혁신을 억압하지 않고 장려하는 정치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달렸다.
정치가 혁신을 선호하고 북돋우는 사회는 어떻게 가능한가? '성장의 문화'(에코리브르)에서 모키르는 산업혁명 시기 영국과 중국을 비교하면서 문화를 답으로 내놓는다. 그에 따르면, 16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문화 혁명, 즉 계몽주의가 근대 세계에서 두 나라의 성장 격차를 유발했다.
1700년대까지 유럽과 중국은 사회제도나 기술 수준에서 우위를 가릴 수 없었다. 당시 영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상업 활동이 활성화하고 화폐 경제가 발달했으며, 높은 교육 수준과 낮은 문맹률에 책을 통한 지식 보급이 활발했다. 토지 재산권을 보장했고, 광산업에선 자본주의의 맹아가 엿보였다. 그러나 중국에선 혁신의 씨앗이 실제로 발아하지 않았다. 프랜시스 베이컨과 아이작 뉴턴 같은 문화적 기업가가 없었기 때문이다.
개방된 아이디어 시장의 존재는 창조적 파괴의 등장과 경제 성장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 베이컨과 뉴턴은 과학 지식의 체계적 생산을 자극하고, 이를 인간 욕망의 실현을 위한 '유용한 지식'의 축적과 확산으로 이끄는 문화를 일으켰다. 그 결과, 17세기 영국인들은 지적 혁신이 실제로 사회를 개선한다고 믿고, 사실과 실험을 통해 지식을 검증하고, 그 지식을 이용한 기술을 개발해 현실을 바꾸는 데 뛰어들었다. 이에 따라 증기기관 같은 혁신이 장려되면서 산업혁명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선 황제 중심의 위계적 문화, 공직자 배출에 편중된 교육제도, 대가족 중심의 사회 등으로 권위에 대한 도전과 혁신적 사고의 확산이 억제됐다. 문헌학과 고증학에 매달리는 학문 풍토에 따라 실험과 비판은 억압됐고, 이단 지식인과 지적 혁신가가 활동할 수도 없었다. 심지어 상인들조차 지배 질서에 반기를 드는 대신 사대부적 삶의 방식을 모방하려 했다.
1820년대에 들어서면서 두 나라 간의 차이가 벌어졌다. 영국에선 '유용한 지식'을 찬양하는 문화 속에서 기술 혁신과 폭발적 경제 성장이 일어났으나, 중국은 산업혁명 대열에서 탈락하면서 성장이 정체됐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바다. 모키르에 따르면, 다원주의 문화와 아이디어 경쟁을 결합한 사회에서만 혁신이 멈추지 않는다.
'창조적 파괴의 힘'(에코리브르)에서 아기옹은 한 나라에 얼마나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는지를 알려면 등록 특허 숫자를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령, 우리나라의 국제특허 출원 건수는 1985년 23건에서 2005년 4689건으로 스무 해 만에 약 200배 증가했고, 2024년 2만3851건으로 다시 약 5배 증가했다. 생산성 증대와 혁신 강도는 비례하므로, 혁신이 약해지면서 성장도 느려지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혁신을 지속하려면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기옹은 자본 축적만으로 경제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오랜 성장 이론을 비판한다. 낡은 기계나 생산 구조에 자본을 투자해 봐야 창출 가치는 점차 줄고, 성장은 둔화한다. 지속적 경제 성장을 위해선 자본을 지식 발전과 축적, 기술 개발에 투자해서 혁신의 질을 높이고, 기존 세력이 혁신의 전파를 방해 못 하도록 정치가 혁신의 촉매 역할을 맡아야 한다.
국가는 경쟁을 가로막는 요소를 과감히 제거해서 혁신 기업이 시장에 빨리 진입하도록 돕고, 동시에 사회 보장을 강화해 실업이나 실직 등으로 혁신의 피해자가 동요하지 않게 돌봐야 한다. 이처럼 경쟁 촉진과 약자 보호, 경제 성장과 불평등 완화를 함께 추진하지 않으면 결국 혁신은 멈추고 성장은 끝난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벌어진 일이다. 트럼프주의의 발호와 보호무역의 확산은 그 대가이다. 보호무역이 창궐하고 권위주의가 부활하는 오늘의 세계는 결국 기술 혁신을 가로막고 창조적 파괴를 저해해 장기적 성장 정체를 유발할 뿐이다. 노벨위원회는 세 학자에게 노벨경제학상을 줌으로써 이를 경고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장은수 출판문화평론가
꼭 봐야할 주요뉴스
 "이제 일본 안 가요"…명절 연휴 해외여행 '1순위'...
마스크영역
"이제 일본 안 가요"…명절 연휴 해외여행 '1순위'...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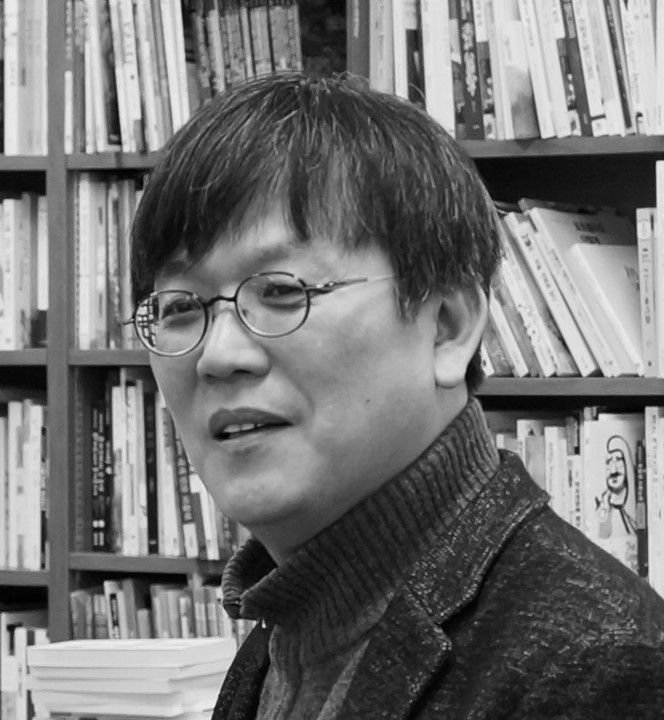















![[주末머니]라부부 VS 헬로키티, 주가는 누가 더 좋을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0810244646962_1765157086.jpg)

![[논단]보이지 않는 병 '괜찮은 척' 요구하는 사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515323064266A.jpg)
![[초동시각]설탕부담금, 세금논쟁보다 설계가 먼저](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308330896636A.jpg)
![[기자수첩]개성공단 '보상'과 '지원'의 간극](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210430293507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