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새 매립지를 찾기 위한 공개모집이 네 번째 시도 끝에 응모지를 확보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는 10일까지 진행된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 4차 공모'에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응모 주체는 개인과 법인으로 이번 공모에서는 처음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외에도 개인·법인·단체·마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다만 응모지와 응모자의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두 곳 모두 해당 기초지자체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비록 4번째 공모에서 처음으로 응모지가 나왔지만 새 매립지 부지 확정까지는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기초지자체장이 지역 내 매립지 조성에 동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 매립지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인천시가 현재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의 설계상 포화 시점인 올해까지만 사용하고 종료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앞서 2015년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등 4자는 3-1 매립장까지만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2021년 1·2차 공모와 지난해 3차 공모 때는 응모한 곳이 전무했다. 이에 4차 공모에서는 조건을 크게 완화했다.
우선 최소 부지 면적을 50만㎡(매립시설 40만㎡, 부대시설 10만㎡)로 설정해 이전 공모의 약 55% 수준으로 축소했다. 또한 부지 면적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매립 용량이 615만㎥ 이상이면 응모가 가능하도록 했다.
'후보지 경계 2㎞ 내 주민 세대주의 50% 이상 동의' 조건은 삭제됐으며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는 필수 요건에서 제외하고 사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매립지가 들어설 지자체에는 최소 3000억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부대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도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지자체의 숙원사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새 매립지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당장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앞서 4자 협의에서 '대체 매립지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약 106만㎡)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 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2022년 대형 건설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으로 인해 매립지 반입 폐기물 양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은 약 107만2000톤(t)으로, 1995년의 917만8000t과 비교하면 8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올해는 9월까지 약 77만6684t이 반입됐다.
또한 생활폐기물을 직접 매립하지 못하고 소각·재활용 후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도 변수로 꼽힌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3-1 매립장의 사용 기간이 수십 년 연장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일반적으로 쓰레기를 소각해 재만 묻을 경우 매립량은 기존의 15~17% 수준으로 감소한다.
애초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이지만 소각장 확보가 충분치 않아 시행 시점을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서울과 경기도는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으며, 인천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후부는 이번 4차 공모 응모지에 대해 4자 협의체를 통해 적합성을 검토한 뒤 '후보 지역 안'을 도출하고, 매립 및 부대시설의 종류·규모, 특별지원금 액수, 지역 숙원사업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협의 조건을 마련해 지자체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인천 지역 공약으로 '수도권매립지 종료 후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123개 국정과제에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가 포함되지 않아 지역 사회의 반발을 불러왔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또 19억 판 아버지, 또 16억 사들인 아들…농심家 '셋째 父子'의 엇갈린 투심[상속자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6013009165322085_1769732214.jpg) 또 19억 판 아버지, 또 16억 사들인 아들…농심家 ...
마스크영역
또 19억 판 아버지, 또 16억 사들인 아들…농심家 ...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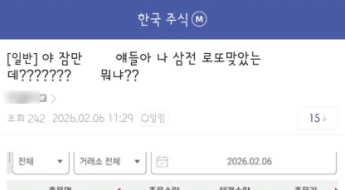






!["쉿! 말하지 마세요" '통 김밥' 베어먹었다간 낭패…지금 일본 가면 꼭 보이는 '에호마키'[日요일日문화]](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6162132271_1770362181.jpg)
!["삼성·하이닉스엔 기회" 한국 반도체 웃는다…엔비디아에 도전장 내민 인텔[칩톡]](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031309072266065_1741824442.jpg)
![[상속자들]신라면 믿고 GO?…농심家 셋째 父子의 엇갈린 투심](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3009165322085_1769732214.jpg)






![[기자수첩]전략적 요충지, 한국GM에 닿지 않나](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1061194711A.jpg)
![[기자수첩]설탕·밀 가격 인하 '눈 가리고 아웅'](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0485436390A.jpg)
![[논단]정말 시장은 정부를 이길 수 없을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710012185549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