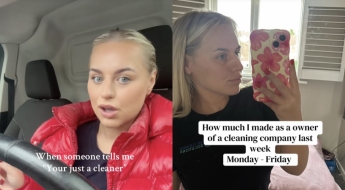'하버드 7.8조원, 스탠포드 10조원, 도쿄대 2.9조원…서울대 1조원…전북대 0.3조원'
세계 주요 대학과 국내 대학들의 예산 규모다. 해외 대학의 10분의 1토막 수준인 대학 재정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인색한 투자가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국내 대학의 수입은 대부분 등록금에 의존하는데 수입과 직결되는 입학자 수는 최근 10년 새 2만8000명이 줄었고, 등록금마저 2009년 이후로 17년째 동결 상태다. 대학 현장에서는 빠듯한 살림으로 대학 내 연구, 인재 양성, 시설 투자 등은 엄두도 안 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민국 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최근 1기 활동을 마치면서 이러한 한국 고등교육의 문제점과 추진과제 등을 다룬 '고등교육 혁신 보고서'를 냈다. 책자형 보고서 출간을 꺼렸던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이 사임한 뒤로 낸, 1기 국교위의 유일무이한 '종이 보고서'다.
국교위 고등교육 혁신팀은 해당 보고서에 '고등교육 재정을 GDP 1% 이상 확보해 대학 인재 투자를 확대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체제를 전면 혁신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20년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2225달러로, OECD 평균 1만8105달러의 67.5% 수준이다. 세계 수준의 대학에 비해 국내 대학 예산 규모는 턱없이 적다. 혁신팀은 노후화된 시설·기자재도 바꿔야 하고 우수 인적자원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OECD 국가 평균인 GDP 대비 1% 고등교육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봤다.
GDP 대비 1% 고등교육재정 확보하려면 지난해 기준으로 10조원가량이 추가돼야 한다. 2025년 이후 향후 10년간 고등교육 예산 전망치를 2026년부터 매년 0.1%포인트씩 증가하는 것으로 해 GDP 대비 1% 확보 달성년도를 2029년으로 해 전망한 결과, 고등교육예산은 2026년에는 19조4000억원, 2027년 23조원, 2028년 27조원, 2029년 31조2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혁신팀은 전망했다. 이를 위해서는 내국세의 일정률 또는 법인세 일정률을 기반으로 확보하거나, 현행 고등교육예산과 고특회계 재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 확보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혁신팀은 이렇게 고등교육재정이 추가되면, 사업비 유형(기본지원금, 사업지원금), 설립유형(국립대학, 사립대학), 지원대상(교육 및 시설, 연구 인프라)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고 봤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많이 잡힌다면서 가격 왜 이래?"…3000원 하던 국...
마스크영역
"많이 잡힌다면서 가격 왜 이래?"…3000원 하던 국...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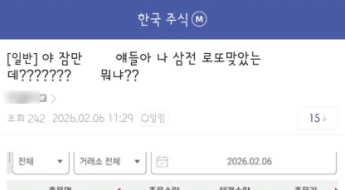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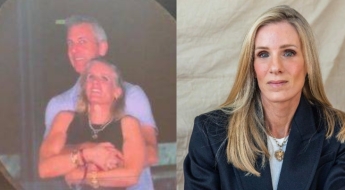












![[기자수첩]전략적 요충지, 한국GM에 닿지 않나](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1061194711A.jpg)
![[기자수첩]설탕·밀 가격 인하 '눈 가리고 아웅'](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0485436390A.jpg)
![[논단]정말 시장은 정부를 이길 수 없을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710012185549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