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상을 바꿀 계획을 만들어 민간연구소 지원해야
민간 손잡는 정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이기는 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세운 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로켓이 지난해 지구로 돌아와 거대한 젓가락 모양 구조물에 잡히는 장면은 과학과 기술 분야 종사자는 물론 평범한 시민, 정책 집행자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우주산업에서 미국을 따라가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각국은 또다시 벌어진 기술 격차에 좌절을 맛봐야 했다.
스페이스X는 어떻게 전 세계 위성 발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초거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으로 거듭났을까. 머스크 CEO의 리더십과 아낌없는 연구개발(R&D) 투자도 있었겠지만 정책 결정의 역할을 부인할 수 없다. 그 배경에는 미 항공우주국(NASA)의 변신이 있다.
냉전 시대,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해 직접 달을 정복하고 우주와 지구를 오가는 우주선을 개발했던 NASA는 21세기 들어 전략을 완전히 바꿨다. 우주왕복선을 폐기하고 국제우주정거장(ISS)에 화물을 운송하는 임무를 스페이스X와 같은 신생 민간 기업에 과감히 맡겼다. 국가기관이 '갑'의 위치를 포기하고 파트너로 돌아선 역발상이었다. NASA는 우주선을 만드는 데 필요한 막대한 초기 개발 자금을 지원하되, 세세한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 대신 'ISS에 화물을 성공적으로 도킹시킨다'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각 단계를 성공할 때마다 약속된 자금을 지급하는 '성과 기반 계약'을 맺었다. 이는 기업연구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과정을 통해 NASA는 과거 우주왕복선 운영 비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했다. 미국이 1960년대에 달에 사람을 보내기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2%를 투입했던 과거는 이제 없다. 오히려 스페이스X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우주 기업을 탄생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정부가 '선수'로 뛰는 대신, 민간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역할에 집중했을 때 상상 이상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세상을 바꿀 계획을 만들어라=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도 기업 연구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정평 나 있다. DARPA는 '세상을 바꿀 기술'이라는 명확하고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대학이나 민간 기업에 연구 과제를 맡겨왔다. 인터넷, GPS, 스텔스 기술 등 현대 문명을 바꾼 혁신 기술 대부분이 바로 DARPA의 과감한 투자에서 시작됐다. 실패를 용인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DARPA 방식은 민간의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촉매제가 됐다.
이런 정책은 여러 미국 기업연구소를 기술 혁신의 선봉장으로 키워냈다. 대표적인 예가 IBM 왓슨연구소를 비롯해 AT&T 산하의 벨연구소(Bell Labs)나 제너럴일렉트릭(GE) 연구소 등이다. 이들은 트랜지스터, 태양전지, 유닉스 운영체제 등 국가적, 인류사적 파급력을 가진 기술들을 쏟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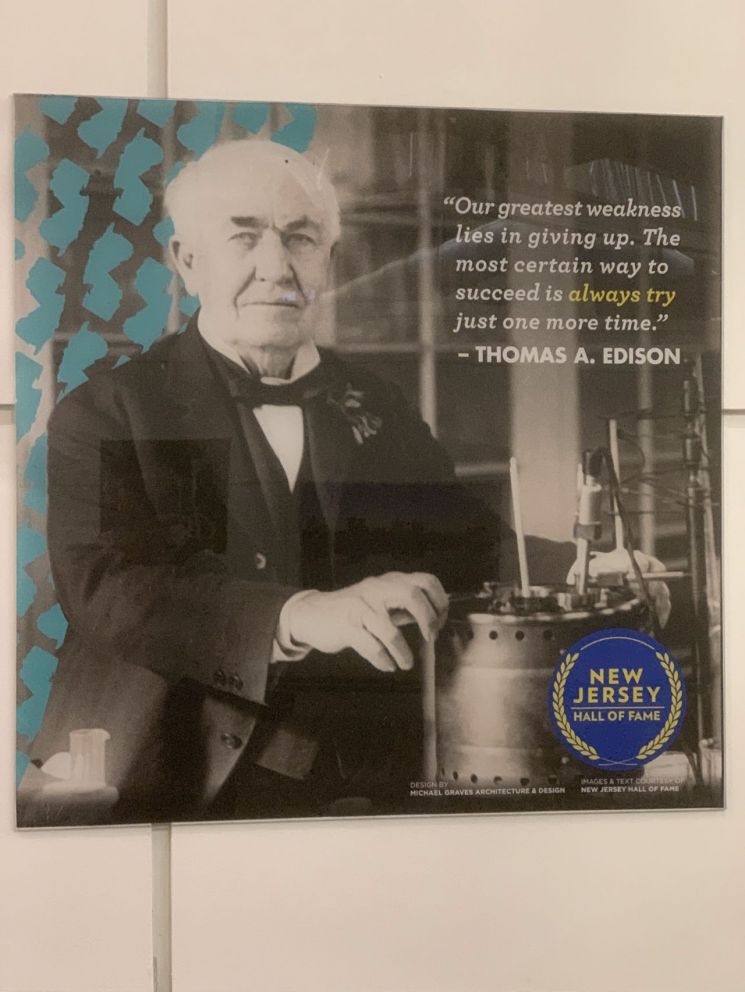
미국 취재를 위해 도착한 미국 뉴저지주 뉴왁공항에는 최초의 민간 기업연구소를 세운 토머스 에디슨의 업적을 기리는 사진이 걸려있다. 에디슨은 뉴저지주 에디슨에 연구소를 세웠고, 지금은 GE 연구소가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에디슨은 실패를 당연하게 생각했고, 끝없는 시도 끝에 백열전구를 완성했다. 백종민 테크 스페셜리스트.
원본보기 아이콘GE 연구소는 미국 최초의 산업 연구 시설이라는 '훈장'도 있다.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이 시발점이다. 텅스텐 전구 필라멘트, 전기 선풍기, 전기스토브, 최초의 가정용 TV, 휴대용 X-레이 기기, 컴퓨터단층촬영(CT) 스캐너, 자기공명영상(MRI) 등이 이 연구소에서 쏟아져 나왔다. 이들 발명품이 인류에 미친 영향은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신뢰도 중요하다. 기업은 정부에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는 신뢰를 줘야 한다. IBM 왓슨연구소에서 만난 한 연구원은 "IBM은 믿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국가적 신뢰가 있었기에 냉전 시대 핵무기 시뮬레이션과 같은 핵심 국가 과제를 수행할 수 있었다"며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 대형 국가과제에는 접근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보안이 철저하다"고 귀띔했다.
정부와 민간의 연합이 영원할 수는 없다. 언젠가는 헤어질 때도 있다. 정부의 '마중물'로 연명하는 건 산소호흡기를 붙이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IBM 양자컴퓨터 프로젝트다. 양자컴 프로젝트도 초기엔 미국 정부의 막대한 자금 지원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기술이 일정 궤도에 오르자 왓슨연구소 경영진은 과감히 정부 프로젝트를 끊는 결단을 내렸다. 정부 과제 수행을 넘어서 확보한 지식재산권(IP)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이유에서다.
◆민관 합작만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이기는 길=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은 이제 개별 기업 간의 싸움을 넘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총력전으로 번졌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과거처럼 정부가 R&D 과제를 기획하고 민간이 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국가 R&D 과제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 환경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막대한 자본과 최고의 인재가 모인 대기업 연구소의 역량을 국가적 자산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특정 기술을 개발해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방식은 이미 시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간한 '정책 조합 관점에서 정부와 민간 R&D 지원의 최적화 방안 탐색의 보고서'는 정부가 특정 과제를 정해 직접 R&D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민간의 자체 투자를 밀어내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보고서는 R&D 상위 국가들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직접 지원은 민간 R&D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 간접 지원이 민간 투자를 견인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었다고 분석했다.
구자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 회장도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강화하는 '원팀(One-team)'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단언했다. GDP 대비 R&D 투자 규모는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절대적인 투자액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민관 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것이다.
백종민 테크 스페셜리스트 cinqang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825조 시장' 활활…"우린 몽클 걸치고 두쫀쿠 먹...
마스크영역
'825조 시장' 활활…"우린 몽클 걸치고 두쫀쿠 먹...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혁신의 심장, 기업연구소⑬]NASA가 스페이스X 키운 비결](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5100209352658699_1759365327.jpg)












!['두쫀쿠 열풍'에 증권가 주목하는이 기업 어디?[주末머니]](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018115837041_1770714718.jpg)




![[경제 인사이트]부동산 세금, 9년을 버틸 수 있을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308282085220A.jpg)
![[초동시각]설탕부담금, 세금논쟁보다 설계가 먼저](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308330896636A.jpg)
![[기자수첩]개성공단 '보상'과 '지원'의 간극](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210430293507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