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은 어떻게 치킨집을 망하게 했나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정산서 분석하니
프랜차이즈 본사 45% vs 배달앱 26% vs 점주 12%
서울 관악구에서 치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이모씨(54)는 하루 100~130마리의 닭을 튀긴다. 하루 매출만 250만~350만원에 달한다. 언뜻 잘되는 가게처럼 보이지만 정산서를 들여다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원가와 수수료, 임대료, 인건비, 세금을 빼면 사실상 남는 게 없다. 순이익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치킨값 2만5000원…점주 손에 쥐는 건 '몇천 원'
21일 본지가 입수한 이씨 점포의 배달 플랫폼 정산서와 프랜차이즈 본사 운영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치킨 신제품 한 마리 판매가는 2만5000원(부가세 제외 2만2727원)이다. 이 가운데 본사 공급가(육계·오일·튀김반죽·소스·포장 박스 등) 1만1480원(45.9%)을 뺀 점주의 예상 수익은 1만1247원이다. 과거 배달 앱이 없던 시절에는 이 금액에서 고정비(월세·인건비·배달비)를 제하면 됐다.
하지만 배달 앱 등장 이후 수익 구조는 완전히 달라졌다. 배달플랫폼이 떼어가는 비용만 마리당 6710원(26.8%)에 달한다. 점주 손에 남는 건 4537원뿐이다. 배달플랫폼 비용은 중개수수료(7.8%) 1950원, 결제수수료(3%) 750원, 배달비 3400원, 부가세 610원 등이다.
이마저도 순이익이 아니다. 월세 150만원, 아르바이트 인건비 300만원을 합치면 한 달 450만원이다. 하루 100마리 닭을 튀긴다고 가정하면 닭 한 마리당 월세 500원과 인건비 1000원, 합계 1500원이 고정비로 붙는다. 실제 남는 금액은 3037원이다. 전기·가스, 세금까지 고려하면 실제 순익은 사실상 '바닥'이다. 이것도 아르바이트생을 최소 1명만 쓰고, 배달플랫폼 광고를 전혀 집행하지 않았을 때 얘기다.
하루 40마리를 팔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고정비가 한 마리당 3750원까지 올라간다. 결국 하루 30마리는 적자, 40마리부터 손익분기점에 간신히 도달한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려면 하루 70마리 이상은 팔아야 한다.
이씨는 "통상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가져가는 공급가가 판매가의 절반 수준"이라며 "여기에 배달플랫폼 수수료까지 떼이면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본사 공급가는 예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배달 앱 광고비 지출이 매출의 목줄을 죄고 있다"며 "광고를 줄이면 주문이 끊기고, 늘리면 수익이 더 줄어드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
하루 300만원 매출…플랫폼 '83만원' 가져갔다
이씨가 배달플랫폼을 통해 하루 300만400원어치의 치킨을 팔았지만 점주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216만5838원에 불과했다. 83만4562원이 플랫폼 몫으로 사라졌다. 배달 플랫폼 노출 서비스 비용인 중개이용료(16만5503원)와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고객할인 비용(쿠폰 지원금·14만6500원) 등이다. 배달비(37만3400원)는 건당 2500~3400원으로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씨의 매장은 광고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다. 만약 광고를 집행할 경우 플랫폼 비용은 전체 주문액의 40%까지 치솟을 수 있다. 클릭당 200~600원의 광고비가 발생하는 구조인데, 주문과 무관하게 클릭만 발생해도 비용이 빠져나간다. 노출 경쟁이 치열해 대부분 가게가 건당 600원을 책정한다. 이씨는 "주문 없이 클릭만 발생해도 돈이 나가고, 광고를 안 하면 상단 노출이 안 돼 주문이 뚝 끊긴다"며 "플랫폼 구조에 갇혀 허덕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달플랫폼이 1인용 소액 배달 정책을 확대하면서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혼밥용 메뉴'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점주들은 "마진은 더 줄어든다"고 입을 모은다. 배달비는 동일하게 지출되는데 주문 단가는 떨어지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186곳의 매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배달 플랫폼을 통한 매출 비중은 평균 48.8%였다. 하지만 현실은 더 심각하다. 또 다른 점주 박모씨(56)는 "우리 가게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매출이 80% 이상"이라며 "코로나19도 버텼는데 배달 앱은 못 버티겠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아 폐업도 고민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치킨 프랜차이즈 3사를 운영하는 전체 점주 중에 20% 이상이 점포를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영업자에게 배달 앱은 시장 확대 수단이라기보다 '참여하지 않으면 기본 매출조차 확보할 수 없는 구조'가 됐다"며 "많이 쓰는 집단이 더 유리해지고 동시에 비용 압박이 강화되는 악순환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자영업 구조적 특성이 다른 국가와 다른데도 이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며 "플랫폼, 본사, 정부가 각자의 역할과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6000명 잘려나간다…"요즘 누가 먹어요" Z세대가 ...
마스크영역
6000명 잘려나간다…"요즘 누가 먹어요" Z세대가 ...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하루에 100마리씩 튀겨도 남는 게 없네…2만5000원 짜리 치킨값 대해부[치킨공화국의 몰락]①](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4071508122050905_1720998740.jpg)
![하루에 100마리씩 튀겨도 남는 게 없네…2만5000원 짜리 치킨값 대해부[치킨공화국의 몰락]①](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5102108031973956_1761001400.png)
![하루에 100마리씩 튀겨도 남는 게 없네…2만5000원 짜리 치킨값 대해부[치킨공화국의 몰락]①](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5102109585874428_1761008337.jpg)



![오입금 된 비트코인 팔아 빚 갚고 유흥비 쓴 이용자…2021년 대법원 판단은[리걸 이슈체크]](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910431234020_1770601391.png)
!["세 낀 집, 8억에 나왔어요" 드디어 다주택자 움직이나…실거주 유예에 기대감[부동산AtoZ]](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509352029563_177025172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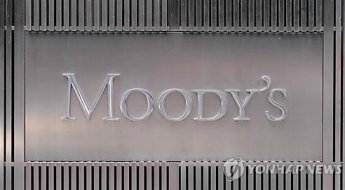
![[서용석의 퓨처웨이브]'도구'가 아니라 '존재'임을 선언하는 AI](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210480619240A.jpg)
![[초동시각]지역의사 10년 '유배' 아닌 '사명' 되려면](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210225661581A.jpg)
![[기자수첩]개성공단 '보상'과 '지원'의 간극](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210430293507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