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 미행·주변 탐문 등
1년 넘게 발로 뛰며 조사
녹취록 증거 2000쪽 만들어
피해 937일째…결론 안 나
수사관 1인 평균 29건 보유
수사 지연에 팔 걷는 고소인들
복수로 변질…2차 피해 노출
에어드롭, 록인, 블록체인 등등.
2023년 12월7일 오후 3시, 서울의 한 경찰서. 낯선 용어에 고소인 김선영씨(47)가 눈썹을 치켜떴다. 선영씨는 코인 전문가에게 500만원대의 비용을 지불하고 수사관에게 코인 업체의 비즈니스 모델과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해 진술해 달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수사관·고소인·변호사가 설명을 듣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 대화는 96쪽 분량의 녹취록으로 작성됐다.
속기록 84쪽. 수사관이 말했다 "이 코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검사나 판사한테 어필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가 답했다. "제가 참고인으로 나가봤는데, 판사님들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제가 '판사님 이것은 아니고요'라고 엎고 옵니다."
2억을 몽땅 잃다
시작은 2022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업체가 '상장 전 코인을 싸게 사라'라는 공지를 주식리딩방에 올렸다. 자녀 교육비라도 벌고 싶어 목돈을 넣은 게 화근이었다. 한참 기업공개(IPO) 붐이 일고 비트코인 억만장자 신화가 생길 때였다.
실체는 사기였다. 2023년 초부터 고소가 시작됐다. A업체 대표는 지난해 4월22일 수원지검에 구속기소 됐다. 2022년 3월16일부터 5월26일까지 두 달여간 377명에게 104억원을 가로챈 혐의가 적용됐다. 선영씨는 2억원을 잃었다. 보험 영업으로 차곡차곡 모은 돈이었다.
가족들의 따가운 눈총이 상처였다. 같은 처지의 고소인들을 만나고 수사관의 증거조사에 힘을 보태는 것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했다. 수사가 진척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믿었다.
추격·미행·잠복
선영씨는 지난해 5월께 회사 명의 등기부등본부터 뗐다. 상위 영업책이 소유한 빌라 주소지가 나왔다. 그곳에 차를 대고 매일 잠복했다. 며칠째 대기를 이어가던 중 영업자로 보이는 사람이 주차하는 모습을 봤다. 몰래 사진을 촬영했다. 차량 번호도 찍어 담당 수사관에게 보냈다.
주변 건물 세입자들도 일일이 찾아갔다. 아직 조사도 받지 않은 피고소인들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핵심 피고소인들의 동선을 쫓아 미행하고, 주변 탐문을 시도하기도 했다. 발로 뛰는 정성을 보여줘야 수사관들의 마음을 움직여 사건이 송치될 것 같았다.
"금고를 옮기는 것 같았다" "작은 건물인데 지문을 찍고 들어가는 게 수상하다"는 이웃들의 진술을 녹음했다. 녹취록으로 만든 다음 인쇄해 경찰에게 건넸다. 작은 증거자료라도 공범을 잡고,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그렇게 올해 9월까지 선영씨가 속기사를 통해 만든 증거자료의 페이지 수는 2000쪽에 달한다. 선영씨가 말했다.
"저는 경제적 살인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살기 위해 끝까지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올해 9월23일 사기 피해 937일째, 업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고 핵심 주범은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
사적 수사, 문제없나
'전국 수사관 1인당 평균 보유 사건 수 29.4건(서울은 33.9건)'.
이 숫자는 선영씨 사례처럼 당사자가 직접 나서는 사적 수사가 빈번한 이유를 잘 말해준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관 1명이 맡은 사건이 많다. 사건을 밀어내기 급급하다 보니 미진한 수사, 지연된 사건이 적체된 것이다. 민생 사건이 특히 그렇다. 답답한 피해 당사자들이 증거조사부터 자료 채증을 위해 직접 발품을 팔아 움직이는 것이 관행이 됐다.
서초동에 사무실을 둔 한 변호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대화하면서 녹음하거나 바깥 장소에서 찍는 사진은 위법 수집 증거로 취급하지 않다 보니 고소인이 직접 대량의 녹취록을 경찰에게 건네는 경우가 하나의 트렌드가 됐다"고 했다.
하지만 당사자가 나설 경우 사적복수로 변질되거나 맞고소의 위험이 상존한다. 윤재선 변호사는 "고소인들이 억울함을 못 참고 피고소인 집을 찾아갔다가 주거침입죄, 스토킹죄, 무고죄로 되레 협박받는 일도 있다"면서 "피해 당사자가 국가형벌권을 믿지 못하고 나서는 것인데 또 다른 2차 피해에 노출되는 것"이라고 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헌법상 엄연히 공소는 수사기관이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피해자들이 수사가 미진하다고 느낀다는 것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수청 도입 이후 난맥상이 반복될 경우 영국처럼 '사소' 제도를 도입하거나 변호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디스커버리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조상님은 어차피 못 드시잖아" 차례상 보다 비싸...
마스크영역
"조상님은 어차피 못 드시잖아" 차례상 보다 비싸...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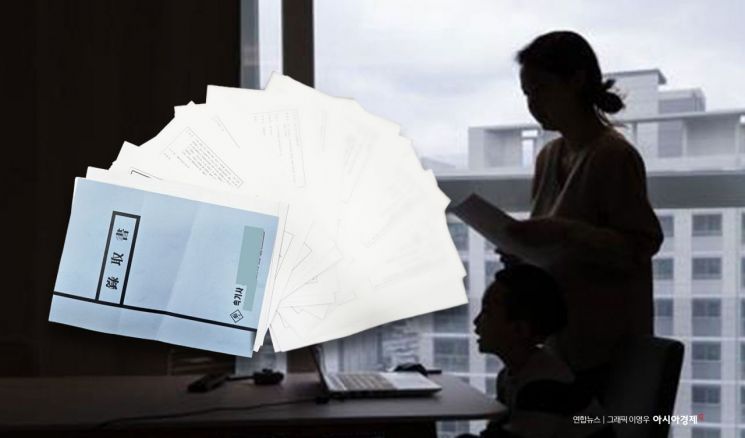
![추격·잠복·미행나선 피해자, ‘스토킹죄’ 맞고소 당할 수도[탐정이 된 고소인]③](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5092215155343066_1758521753.jpg)
![추격·잠복·미행나선 피해자, ‘스토킹죄’ 맞고소 당할 수도[탐정이 된 고소인]③](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5092214482243005_1758520102.jpg)






!["한국 오면 꼭 간다" 비행기 내리자마자 '우르르'…확 바뀐 외국인 관광코스[K관광 新지형도]②](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709335043566_1771288430.png)





![[내일날씨]연휴 마지막 날 전국 맑고 포근…아침엔 '쌀쌀' 일교차 주의](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022613301247266_1740544211.jpg)




![[기자수첩]개성공단 '보상'과 '지원'의 간극](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210430293507A.jpg)
![[초동시각]설탕부담금, 세금논쟁보다 설계가 먼저](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308330896636A.jpg)
![[논단]보이지 않는 병 '괜찮은 척' 요구하는 사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515323064266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