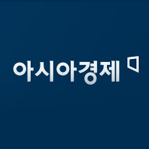고령화 부채 저성장 삼중고 직면
美 정부, 국채 발행 낙관론 주장
안전자산 선호 고령층 유입 기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에 우호적인 경제학자들을 연방준비제도(Fed)에 임명하려는 시도가 금융·정치권의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통화정책과 채권시장, 미국 경제 전망은 훨씬 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
미국 역시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국가처럼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 부채는 늘어나고 경제성장률은 낮아지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지만, 그 대가를 미국의 투자자들과 은퇴자들이 기꺼이 감수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잭슨홀 경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새로운 연구 논문은 보다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이 논문은 고령화가 진행된 국가일수록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고령 인구가 채권을 적극적으로 사들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채권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해당 논문은 금리가 오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미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50%에 달하는 국가 부채도 감당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이는 일본의 부채 수준과 비슷한데, 일본 역시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의 주장이 옳다고 해도, 그 이유가 단순히 고령층이 채권을 선호하기 때문은 아니다. 채권 수요는 대부분 정부의 정책과 규제에 의해 좌우된다. 일본의 사례처럼 미국 경제도 저금리를 유지하기 위해 이른바 '금융 억압(financial repression)' 정책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률과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당 논문은 지난 수십 년간 국가 부채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로 채권 수요가 공급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주로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매수세 덕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들의 수요는 약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국제 무역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앞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채권의 또 다른 큰손은 Fed다. 그러나 Fed의 양적완화 정책이 종료되면서 앞으로 채권시장에서는 뮤추얼펀드(주로 개인 투자자), 브로커-딜러, 그리고 '기타' 항목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의 존재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논문은 앞으로 미국 내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경제학자들은 오래전부터 고령화를 금리 하락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아 왔다. 나이가 들수록 자산 규모가 커지고, 위험 자산보다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가설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령화와 금리 하락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으며, 오히려 반비례할 수도 있다.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채권 비중을 늘리는 것은 아니며, 퇴직연금 같은 제도를 제외하면 일반 개인이 직접 채권을 사는 일은 드물다. 게다가 미국인 대부분은 자산을 이런 퇴직연금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
퇴직연금 계좌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 가입자가 직접 투자 자산을 선택해야 했으며 나이가 들어도 채권에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경향은 뚜렷하지 않았다. 하지만 2006년 도입된 새로운 법률은 퇴직연금 계좌에 자동 가입되도록 하고, 투자 상품 역시 가입자가 따로 선택하지 않아도 사전에 지정된 방식으로 자동 운용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제도 변화로 인해 '타깃데이트펀드(target-date funds)'가 빠르게 확산했다. 이 펀드는 가입자의 은퇴 시점에 맞춰 투자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주식 비중은 줄이고 채권 비중은 점차 늘리는 구조다. 이는 기본 투자 상품이 시간이 흐르면서 위험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에 맞춰 설계됐다. 대부분의 가입자가 이 기본 옵션을 유지하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고령자일수록 실제로 채권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
타깃데이트펀드가 은퇴 시점에 맞춰 주식에서 채권으로 자산을 옮겨가는 속도가 충분히 빠르다면, 미국이 발행하는 막대한 부채를 떠안을 수 있을 만큼의 수요가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이런 채권 매입은 고령층이 스스로 채권을 선호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규제의 결과라는 사실이다.
물론 이런 규제들이 모두 부당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은퇴한 고령층은 노후에 소득이 불안정해질 위험에 직면한다. 만약 이들이 연금 상품을 구매하거나(보험사는 그 자금으로 채권을 더 많이 사게 된다), 직접 장기 채권에 투자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인의 투자 습관을 바꾸는 일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결국 제도적 개입 없이는 변화하기 어렵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와 채권 수요를 억지로 늘리려는 정책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문의 저자들은 일본을 긍정적인 사례로 제시한다. 고령 인구가 채권을 많이 사준다면, 국가가 많은 부채를 안고도 버틸 수 있다는 점을 일본이 보여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사례는 금융 억압 정책이 얼마나 쉽게 고착화되고 벗어나기 어려운지도 보여준다.
일본은 수년간 연기금이 대량의 국채를 매입한 덕분에 저금리를 유지해왔고, 최근에는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그 흐름이 이어졌다. 금리가 하락하고 채권 가격이 오르던 시기에는 이 방식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정부가 더 이상 채권을 매입할 수 없게 되며 채권 가격까지 하락하기 시작하면 이런 구조는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일본이 막대한 부채를 안고도 버텨온 시간도 이제 끝나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설령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본의 경제 모델은 결코 본받을 만한 사례는 아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채권 수요를 늘려 금리를 낮게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규제를 설계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는 상당히 위험한 금융 전략이며, 미국이 이 방식을 택할 경우 수익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그 결과 미국 경제는 잠재적인 성장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고, 미국 투자자들 역시 이전보다 더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앨리슨 슈라거 맨해튼 정책연구소 수석 연구원
이 글은 블룸버그 칼럼 Can America Get Americans to Buy Its Bonds?를 아시아경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이 칼럼은 아시아경제와 블룸버그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게재되었음을 알립니다.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한국인은 없으면 못 사는데" 美에선 벌써 70만명 ...
마스크영역
"한국인은 없으면 못 사는데" 美에선 벌써 70만명 ...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블룸버그 칼럼] 채권 투자가 美 경제위기 해법 될까](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5090114291014017_1756704550.jpg)






!["한국 오면 꼭 간다" 비행기 내리자마자 '우르르'…확 바뀐 외국인 관광코스[K관광 新지형도]②](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709335043566_1771288430.png)





![계엄으로 떨어진 군 별만 31개[양낙규의 Defence Club]](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03014130787990_1761801187.jpg)


![[러우전쟁 4년]④AI 투자 독식에 난항 겪는 재건자금 모집](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210402940055_1770860430.jpg)

![[기자수첩]개성공단 '보상'과 '지원'의 간극](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210430293507A.jpg)
![[초동시각]설탕부담금, 세금논쟁보다 설계가 먼저](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308330896636A.jpg)
![[논단]보이지 않는 병 '괜찮은 척' 요구하는 사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515323064266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