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국 직접 투자액 약 68억달러
147% 급증해 日·美 앞지르고 1위 기록
지역 경제 활성화, 공급망 안정화 효과
"우회 수출, 기술 유출 등은 대응해야"
중국이 미국의 대중 규제를 우회하면서 한국 산업 인프라와 기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한국 직접 투자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투자가 국내 지역 및 산업 육성에 이점이 될 수 있지만 기술 유출 등의 우려가 생길 수도 있는 만큼 업종별 관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최근 중국의 대한국 투자 증가 배경 및 시사점'을 보면, 지난해 중국의 대한국 직접투자 신고액(홍콩 포함)은 전년 대비 147.4% 급증한 67억9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미국(52억4000만달러) 투자액보다 큰 규모로, 이로써 중국이 지난 7년간 대한국 투자 1위였던 미국을 추월하게 됐다. 한국 외국인직접투자(FDI)에서 중국 비중은 지난해 19.6%까지 치솟으며 일본(17.7%), 미국(15.2%) 등을 앞질렀다.
반면 지난해 중국의 대한국 직접투자 도착액(실제 집행액)은 12억3000만달러로 한국 FDI 전체 순위에서 6위(7.0%)에 그쳤다. 도착액 기준으로는 몰타(14.3%), 싱가포르(12.5%), 일본(10.2%), 미국(9.9%) 순으로 많았다.
도착액의 77.7%는 제조업(9억6448만달러)으로 흘러갔다. 전체 도착액에서 ▲전기·전자(33.3%) ▲의약(33.3%) ▲기계장비·의료정밀(3.6%) 등의 제조업 비중이 두드러졌다. 서비스업 비중은 2010년대 초반에 82%에 육박했지만 지난해 21.6%에 그쳤다.
보고서는 "지난해 실제 투자는 의약품 제조업을 제외하면 일차전지 및 축전지, LCD 제조업과 같이 전략적·기술적 중요도가 높은 업종에서 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또 "최근 개별 투자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새만금을 중심으로 중국 배터리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졌다"며 "비야디(BYD), 지커(??) 등의 전기차와 알리바바, 테무 등 유통·물류 기업도 한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대한국 투자가 늘어나는 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미국이 중국을 외국우려기관(FEOC)으로 지정한 후 대중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한국 진출을 보다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한국 투자 증가는 기술 활용, 생산 및 진출 확보 등의 목적을 내포한다"며 "한국과의 경제적 연결 고리를 강화하려는 전략적 필요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실제 중국은 우리나라 첨단 산업 인프라와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한국 투자를 늘리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대한국 직접투자 신고액의 18.5%(12억5900만달러)가 배터리 분야로 흘러간 것이 주요 사례다.
다만 미국의 대중 견제 강화에 따른 규제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신고액과 도착액 간 격차가 커졌다는 게 보고서 평가다. SK온과 에코프로, 중국 GEM은 2023년 새만금에 전구체 공장을 설립한다고 밝혔지만 이후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보고서는 중국의 대한국 투자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배터리와 반도체 등 전략 산업의 핵심 소재인 흑연 등의 수입을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는 만큼 협력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기업의 진출로 국내 동일 품목 생산 기업의 경쟁력이 낮아지거나 기술 유출 우려, 미국의 고율 관세 부 가능성 등의 리스크는 관리 요인으로 꼽힌다. 보고서는 "정부가 업종별 투자 유치 및 관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배터리, 반도체 등 외부 규제에 민감한 업종 관련 우회 수출 목적 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기술 유출 방지 등 지속 가능한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허참, 나보다 낫네…" 92만원 몽클 패딩 입고, 호...
마스크영역
"허참, 나보다 낫네…" 92만원 몽클 패딩 입고, 호...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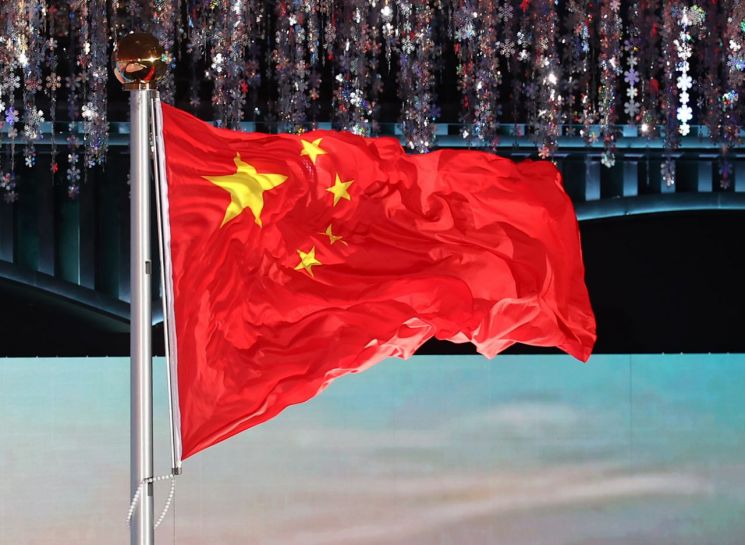
















!['두쫀쿠 열풍'에 증권가 주목하는 이 기업 어디?[주末머니]](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018115837041_1770714718.jpg)

![[경제 인사이트]부동산 세금, 9년을 버틸 수 있을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308282085220A.jpg)
![[초동시각]설탕부담금, 세금논쟁보다 설계가 먼저](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308330896636A.jpg)
![[기자수첩]개성공단 '보상'과 '지원'의 간극](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210430293507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