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정책 비현실적 발상
AI시대 인재 해외유출 가속 우려
지역별 창의적 성장 전략 마련을
서울대학교가 법인화 이후 14년 만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대학 등록금 동결에 따라 10년 넘게 한국 대학 교수들의 연봉이 정체되어 스타 교수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내놓은 대책으로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서울대학교의 QS세계대학순위는 2025년 31위에 올랐지만 2026년에 38위로 떨어졌다. 50위권에 연세대학교가 처음 이름을 올렸다. 일본에서는 도쿄대학이 39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의 대학들이 강세를 보여 14위의 베이징대학을 포함해 5개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세계는 바야흐로 인재 전쟁이다. 최고의 AI 인재의 몸값이 1조원에 달한다는 말까지 들린다. 세계의 대학들이 최고의 인재를 모으고 최고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반면에 우리의 현실은 안타깝게도 인재가 떠나고, 부자들이 떠나고, 기업이 떠나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 S급 인재들에 제대로 대우를 못 하고, 초부자(超富者)들을 징벌적 과세 대상으로나 여기고, 더 크고 더 복잡한 사업을 벌이는 기업에 온갖 멍에를 씌우니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서울대학교가 오랫동안 국내에서 최고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것은 전국의 수재들이 모이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자들이 교수진에 포진해 있으며, 오랜 기간 국가나 기업들이 투자해 최고의 시설과 제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 그런 환경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이 평균적으로는 국가의 각 부문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것이다.
전국에 서울대학교를 10개로 늘린다고 수재급인 학생이나 교수들이 그만큼 늘어날 리 만무하다. 또 등록금도 동결하고 교수진의 연봉이나 연구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처지에 그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도 없다. 누가 봐도 어불성설(語不成說)인 '서울대학교 10개' 같은 수사(修辭)를 내놓는 건 혹세무민(惑世誣民)이다. 느닷없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떠오르게 한다. 그걸 국가 교육 전략이라고 제시한 사람은 교육부 장관 자리에 지명되었다 하니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차라리 지방에서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옳다.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는 인재들을 기득권으로 낙인찍지 말고 더 발전하고 국가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수월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념에 경도되어 하향 평준화를 지향하면 AI를 기반으로 한 극도의 글로벌경쟁을 이겨낼 수 없다.
지방소멸이나 지역 균형발전을 꾀한다고 국가의 경쟁력이나 성장의 발목을 잡는 정책을 경계해야 한다.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별로 창의적인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별로 서로 베끼거나 중복 투자하고 별 효과가 없는 정책에 예산을 손쉽게 낭비하는 걸 보자면 답답할 뿐이다.
10개의 서울대학교가 아니라 한두 개라도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교를 키워야 한다. 우선 포항공대나 카이스트(KAIST)가 왜 지방에 산재해 있는 긴 역사를 가진 국립대학교들보다 경쟁력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꼭 봐야할 주요뉴스
![또 19억 판 아버지, 또 16억 사들인 아들…농심家 '셋째 父子'의 엇갈린 투심[상속자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6013009165322085_1769732214.jpg) 또 19억 판 아버지, 또 16억 사들인 아들…농심家 ...
마스크영역
또 19억 판 아버지, 또 16억 사들인 아들…농심家 ...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논단]서울대학교가 서울대학교인 이유](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5072113285853426_1753072138.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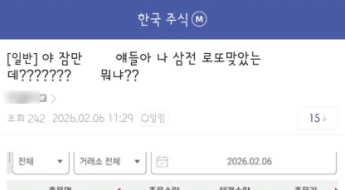






!["쉿! 말하지 마세요" '통 김밥' 베어먹었다간 낭패…지금 일본 가면 꼭 보이는 '에호마키'[日요일日문화]](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6162132271_1770362181.jpg)
!["삼성·하이닉스엔 기회" 한국 반도체 웃는다…엔비디아에 도전장 내민 인텔[칩톡]](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031309072266065_1741824442.jpg)
![[상속자들]신라면 믿고 GO?…농심家 셋째 父子의 엇갈린 투심](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3009165322085_1769732214.jpg)






![[기자수첩]전략적 요충지, 한국GM에 닿지 않나](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1061194711A.jpg)
![[기자수첩]설탕·밀 가격 인하 '눈 가리고 아웅'](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0485436390A.jpg)
![[논단]정말 시장은 정부를 이길 수 없을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710012185549A.jpg)

![[속보]NHK 출구조사](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090916295225964_1757402992.pn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