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발정책 반복된 실패의 굴레
민간투자 부족, 강국과 격차 심화
과학혁신 생태계 전면 쇄신해야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 비전을 세우고 AI 수석 신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여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의 최고책임을 맡기는 방안 등 AI 굴기에 강한 의욕을 보인다. 인공지능 산업은 21세기 기술혁명에서 모든 다른 산업의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일반목적기술(GPT)로서 가장 중요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인 만큼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산업으로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AI 3대 강국' 비전은 경제성장률의 0%대 추락으로 좌절에 빠진 국민들에게 반전의 희망을 주는 국가 비전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과거 정부가 추진한 AI 개발정책은 전형적으로 실패한 정책이었다.
정부는 이미 2019년 '인공지능 국가전략', 2022년에는 '디지털 인재양성종합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는 AI 인재 순 유출 국가로 OECD 38개국 중 인재 유치에 35위로 평가된 바 있다. 과연 이재명 정부는 이 반복되는 AI정책 실패의 굴레를 단절할 수 있을 것인가?
2013년부터 2024년까지 AI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규모에 있어 우리나라는 세계 9위로 투자 규모에 있어 1위인 미국의 1.9%에 불과할 정도로 'AI 3대 강국'의 꿈은 실로 요원하다. 한편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인공지능 연구자 수는 미국이 6만4000명으로 세계의 31%에 이어 중국 26%(5만3000명), 유럽연합(EU) 18% 순이다. 특히 중국은 인공지능 전문가의 수를 2015년 1만명에서 2024년 5배 넘게 증가시켰다. 중국이 인재 육성에 성공한 요인은 2015년부터 착수한 '중국제조 2025' 추진의 핵심 산업으로 인공지능 분야에 지속해서 막대한 투자를 추진한 결과다.
특히 주목해야 할 사실은 중국 정부는 국내 인재 육성은 물론 전 세계로부터 '인재'를 유치하고 연구를 지원하는 데 지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또한 '중국제조 2025'는 한 부처의 정책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발전전략으로 정부의 전 부처가 총력을 투입해 추진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이처 인덱스(Nature Index)에 따르면 세계 상위 100대 연구기관 중 중국은 2014년 9개에서 2024년 43개로 발전했으며 올해 1월 세계를 놀라게 했던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출현은 이러한 중국 과학 생태계의 발전이 이룩한 상징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10년간 2개로 머물렀다. 이 놀라운 격차는 중국 정부가 지난 10년간 '중국제조 2025'로 과학기술 굴기를 추진했던 반면에, 우리 정부는 2009년 이명박 정부의 등록금 동결부터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10% 삭감과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이르기까지 과학혁신 생태계를 황폐화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이전 정부들의 반복된 실패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AI를 넘어서 과학혁신 생태계의 누적된 적폐를 총체적으로 혁신하는 접근이 절실하며, 과기부 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전 부처가 총력을 기울이는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AI 3대 강국' 비전은 AI에 편중된 결과로 다른 분야의 연구 생태계를 악화시키는 또 다른 구조적 문제를 가중할 뿐이며 그 결과 지난 정부들의 실패를 거듭할 위험이 높다. 반면에 이재명 정부가 과학기술 전반의 혁신 생태계를 개혁하는 데 성공한다면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새로운 도약의 시대 전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김동원 전 고려대 초빙교수
꼭 봐야할 주요뉴스
 "요즘 고객님들 가격은 안 봐요" 과일 하나 팔려고...
마스크영역
"요즘 고객님들 가격은 안 봐요" 과일 하나 팔려고...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논단]'AI 3대 강국'의 조건을 갖추려면](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5071110282342375_1752197302.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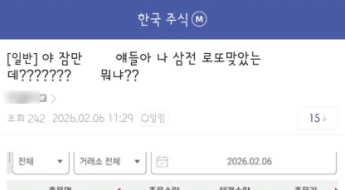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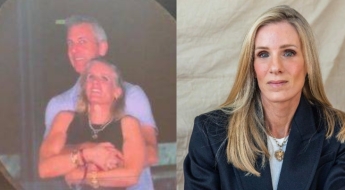


![[날씨]내일 아침 최저 -18도까지 '뚝', 전국 종일 영하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2217070912326_1769069229.jpg)

![다음 주 3492가구 공급 예정…1분기 서울 분양 2002년 이후 최다[부동산AtoZ]](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6451932306_1770363918.jpg)



![[기자수첩]전략적 요충지, 한국GM에 닿지 않나](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1061194711A.jpg)
![[기자수첩]설탕·밀 가격 인하 '눈 가리고 아웅'](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0485436390A.jpg)
![[논단]정말 시장은 정부를 이길 수 없을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710012185549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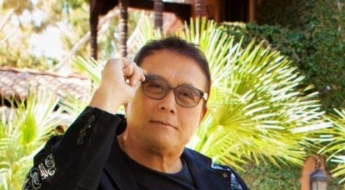
!["삼성·하이닉스엔 기회" 한국 반도체 웃는다…엔비디아에 도전장 내민 인텔[칩톡]](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031309072266065_174182444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