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제강 英 자회사, 공장 건설 막바지
1년에 모노파일 최대 200개 생산
건설기간에 2250개 일자리 창출
티스밸리, 친환경 도시로 변신
국내 해상풍력 보급, 해외 기업 협업 필수
경제 기여↑ 운영·보수도 내재화해야
지난달 25일 런던에서 기차로 2시간, 다시 버스로 1시간을 달려 도착한 영국 북동부 해안 도시 티스밸리(Tees Valley). 유럽 내 2위 철강기업이었던 SSI철강이 2015년 문을 닫고 폐허로 남아 있던 이 지역은 해상풍력 공급망 기업들이 하나둘 들어서면서 친환경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변화를 이끌고 있는 기업은 한국 기업인 세아윈드. 세아제강의 영국 자회사로 해상풍력의 하부구조물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날 찾은 세아윈드 티스밸리 공장은 공정률 99%로 막바지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었다. 축구장 30개 크기에 맞먹는 90에이커의 부지에 들어선 세아윈드 공장은 총 800m의 길이로, 한눈에 다 들어오지 않을 정도의 거대한 규모를 자랑했다.
세아윈드는 이곳에서 1년에 최대 200개의 모노파일을 생산해 북해 해상풍력단지에 공급할 계획이다. 모노파일은 높이 120m, 지름 50m로 무게만 수천t에 달한다. 티스밸리는 고중량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항만을 정비했다. 그러자 다른 해상풍력 기자재 기업들도 잇따라 티스밸리를 찾고 있다.
이날 세아윈드 앞 부두에는 GE리뉴어블에너지가 설치할 해상풍력 타워 기자재가 높이 쌓여 있었다. 안내를 맡은 티스밸리시 관계자는 "세아윈드 공장이 들어서고 해상풍력 설치 항만이 건설되면서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잇따라 투자를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기업 투자로 지역 경제 살아나"
영국은 해외 기업의 투자를 적극 받아들여 해상풍력 산업을 육성하고 성공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티스밸리 지역의 알렉 브라운 레드카·클리블랜드 군수는 이 지역이 해상풍력 공급망 전진 기지로 거듭날 수 있었던 주요 배경 중 하나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꼽았다.
영국은 핵심 기자재인 터빈을 다른 유럽 국가나 미국에서 공급받고 있다. 오스테드, 에퀴노르 등 해외 개발사들도 활발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일례로 영국 북동부 해안 지역에는 프랑스전력공사(EDF)가 62메가와트(㎿) 규모의 티사이드 해상풍력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인 3.6GW 도거뱅크해상풍력단지는 영국의 SSE, 노르웨이 에퀴노르 및 바르그논이 공동으로 개발한다.
영국은 외국 기업의 진출을 막기보다 현지 투자와 고용을 유도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쳤다. 티스밸리시의 마이클 켄달 매니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해외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에 대해 거리낌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세아윈드는 건설 기간에 2250개의 일자리를 비롯해 1500개의 공급망 일자리를 새로 만들었다. 도거뱅크 프로젝트의 경우 미국 GE와 현지 기업들이 협업해서 기자재를 공급하고 있다. GE는 현지 레드카·클리블랜드대에서 견습생을 뽑고 있다.
해상풍력 공급망 기업들의 투자로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자 주민 수용성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됐다. 티스밸리시는 500만파운드(약 92억원)의 추가 세수를 지역에 재투자했다.
영국이 해상풍력을 공격적으로 확대하자 중국 기업들도 진출을 노리고 있다. 현지에서도 찬반 목소리가 엇갈린다. 마이클 켄달 매니저는 "1년 전부터 중국의 터빈, 전선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안보 차원에서 견제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한국 기업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유지·보수는 내재화 필요"
국내에서도 해상풍력을 빠르게 보급하기 위해선 국내 공급망을 최대한 활용하되 부족한 부분은 해외 기업과 협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노파일, 재킷, 부유체 등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과 케이블은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나셀, 블레이드, 터빈은 공급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터빈의 경우 두산에너빌리티와 유니슨이 8㎿급을 상용화했으나 전 세계적으로는 규모의 경제와 투자비 절감을 위해 15㎿ 이상 대형 터빈을 선호하는 추세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연간 생산능력도 240㎿에 불과해 국내 수요를 채우기 어렵다.
㈔넥스트의 김은성 부대표는 "과거 사례를 살펴봤을 때 15㎿급 국산 터빈 시스템을 2030년까지 상용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해외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공급 부족을 해결하고 기술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말했다.
영국은 국산 터빈이 없는 상태에서도 해상풍력 강국으로 거듭났다. 자체 터빈 브랜드가 없는 일본은 최근 미국 GE버노바의 공장을 유치하면서 자국 내 기업과 기술 협력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풍력발전 설비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해외 기업과 협업하더라도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운영 및 보수(O&M)의 내재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범석 제주대 풍력공학부 교수는 "O&M은 에너지 안보, 지역투자, 고용 창출 효과가 높고 20년 이상 장기적인 수혜가 예상되므로 국내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한국기자협회와 ㈔넥스트의 지원으로 제작됐습니다.
티스밸리(영국)=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6000명 잘려나간다…"요즘 누가 먹어요" Z세대가 ...
마스크영역
6000명 잘려나간다…"요즘 누가 먹어요" Z세대가 ...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국 기업이 살렸다" 폐허에서 친환경도시로 부활… 해상풍력 강국 된 英[해상풍력, 영국에서 배운다]②](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5070709212935458_1751847689.jpg)




![오입금 된 비트코인 팔아 빚 갚고 유흥비 쓴 이용자…2021년 대법원 판단은[리걸 이슈체크]](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910431234020_1770601391.png)
!["세 낀 집, 8억에 나왔어요" 드디어 다주택자 움직이나…실거주 유예에 기대감[부동산AtoZ]](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509352029563_177025172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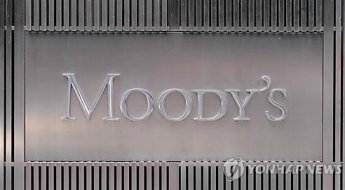
![[서용석의 퓨처웨이브]'도구'가 아니라 '존재'임을 선언하는 AI](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210480619240A.jpg)
![[초동시각]지역의사 10년 '유배' 아닌 '사명' 되려면](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210225661581A.jpg)
![[기자수첩]개성공단 '보상'과 '지원'의 간극](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210430293507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