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가수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위축된 청년세대 정서와 맞닿아
대선, 청년 꿈 지켜내는 순간 되길
노숙자에서 빌보드 차트까지 오른 무명 가수 황가람(41)의 노래 '나는 반딧불'이 빛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소개된 그의 노래는 듣는 이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으며 각종 음원 차트를 석권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성이 아니었지만 또박또박 들리는 노랫말이 깊은 울림을 줬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황가람은 숨겨진 이야기가 많았다. 그는 스무 살 때 가수라는 별을 좇아 경남 마산에서 무작정 서울에 왔다. 홍대 놀이터에서 노래를 하며 147일간 노숙을 했다. 공원 벤치에서, 공중화장실 라디에이터 옆에서, 온기가 느껴지는 곳을 찾아 눈을 붙였다. 서른 살을 넘길 때까지 가수가 되길 꿈꾸며 버텼다. 300대 1의 경쟁을 뚫고 유명 그룹 '피노키오' 보컬이 됐지만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공연을 하지 못하자 "세상이 나서서 (나에게) 이 길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데 나만 못 알아듣나…"며 좌절했다. 그는 오랫동안 무명으로 지내다 마흔 살에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운명적으로 만나 세상에 빛을 발했다.
이 노래는 불안한 미래에 위축된 청년 세대의 정서와 깊이 맞닿아 있다. 노랫말은 '별'과 '반딧불'이라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자존감을 찾아가는 빛을 이야기한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믿었던 시절이 있다. 무언가가 틀림없이 될 수 있다고 믿고,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세상은 냉정하고 엄혹하다. 현실의 벽은 자신을 벌레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로 느끼게 만든다. 그러나 '나는 반딧불'은 노래한다.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별은 이상이고 꿈이다. 반딧불은 현실이고 자각이다. 둘은 위치도 크기도 존재감도 다르지만 '빛난다'는 사실만은 같다.
'12·3 비상계엄'에 맞서 응원봉으로 상징되는 광장의 빛으로 이뤄낸 조기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은 저마다 '별의 순간'을 잡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우리 사회 청년들의 의제는 뒷전으로 밀려난 듯하다. 청년들은 국민연금도 불만이고 정년 연장에도 불안해한다. 유권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중장년층을 겨냥한 정치적 구호와 정쟁만 난무하고 있다.
지금 청년들은 경제 위기 속에 구조적 약자로 전락하고 있다. 안정적인 일자리는 줄어들고 주거비 부담은 커지고 있다. 화려한 소셜미디어 속에서 타인의 삶과 비교되며 관계의 단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더해지고 있다. 지난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20대 이하 연령대에서 일자리가 14만8000개나 급감해 역대 최대 감소 폭을 나타냈다. 20대 임금근로일자리는 8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청년 정책은 '일자리'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을 느끼고 자신이 충분히 먹고살 수 있는 환경이 돼야 결혼도 하고 출산이 늘어나 대한민국의 인구소멸 위기를 막을 수 있다.
청년 세대가 진정 바라는 것은 선심성 공약이 아니다. 무엇보다 공정한 기회의 보장과 실패하고 스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가 있는 대한민국이다. 이번 대선은 가수 황가람처럼 자신만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청년들을 지켜내는 빛이어야 한다. 그 빛은 최고 권력을 잡기 위한 '별의 순간'이 아니라 청년 세대의 발밑을 비추는 '반딧불의 순간'이어야 한다. 그 반딧불이 세상을 밝힌다.
조영철 콘텐츠편집1팀장
꼭 봐야할 주요뉴스
![또 19억 판 아버지, 또 16억 사들인 아들…농심家 '셋째 父子'의 엇갈린 투심[상속자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6013009165322085_1769732214.jpg) 또 19억 판 아버지, 또 16억 사들인 아들…농심家 ...
마스크영역
또 19억 판 아버지, 또 16억 사들인 아들…농심家 ...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시시비비]'별의 순간'보다 '반딧불의 순간'](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4082210273493009_1724290054.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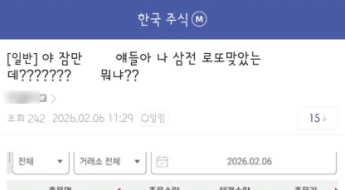






!["쉿! 말하지 마세요" '통 김밥' 베어먹었다간 낭패…지금 일본 가면 꼭 보이는 '에호마키'[日요일日문화]](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6162132271_1770362181.jpg)
!["삼성·하이닉스엔 기회" 한국 반도체 웃는다…엔비디아에 도전장 내민 인텔[칩톡]](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031309072266065_1741824442.jpg)
![[상속자들]신라면 믿고 GO?…농심家 셋째 父子의 엇갈린 투심](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3009165322085_1769732214.jpg)






![[기자수첩]전략적 요충지, 한국GM에 닿지 않나](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1061194711A.jpg)
![[기자수첩]설탕·밀 가격 인하 '눈 가리고 아웅'](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0485436390A.jpg)
![[논단]정말 시장은 정부를 이길 수 없을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710012185549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