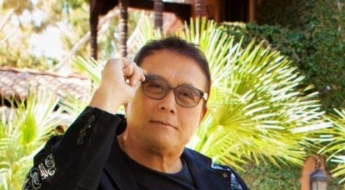수익기반 '정치 인플루언서' 통해 콘텐츠 확산
'필터 버블' 알고리즘 가짜뉴스 노출 악순환
사실 일부 왜곡해 허위정보 판별 구분 어려워
주요 대선 후보를 겨냥한 각종 허위 정보는 유통 과정에서 진실은 축소되고, 감정은 과장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콘텐츠는 공통적으로 '빠른 소비' '강한 자극' '모호한 출처'를 기반으로 한다. 틱톡에서는 15~30초 길이로 빠르게 요약된 영상이 유통된다. 자막과 배경음악은 시각적·청각적 자극을 강화한다. 특히 화면에 '팩트' 혹은 '충격' 등의 키워드를 삽입해 신뢰와 관심을 유도하고, 가짜 뉴스를 진짜 뉴스로 오해하게 만든다.
이런 유사 콘텐츠 확산의 중심에는 이른바 '정치 인플루언서'가 있다. 이들은 콘텐츠 조회수 수익 구조를 기반으로 활동하며, 특정 후보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조장해 유저들의 반응을 유도한다. 정보 제공의 차원을 넘어 여론을 선동하는 방향으로 영상 흐름을 제작해 실제 내용보다 감정의 동요가 큰 게 특징이다. 조회수와 시청 시간이 곧 유튜브 광고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플랫폼 알고리즘도 이런 콘텐츠 확산 구조에 일조한다는 분석이다. 틱톡은 사용자 '체류 시간'과 '반응'에 따라 비슷한 콘텐츠를 연쇄적으로 추천하고, 페이스북은 이용자 정치 성향에 따라 특정 게시물을 상단에 노출하는 이른바 '필터 버블(FILTER BUBBLE)' 구조를 지닌다. '필터 버블'이란 인터넷 정보 제공자가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 필터링된 정보만 이용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이로 인해 한 번 특정 성향의 가짜 뉴스를 본 이용자는 더 많은 유사 콘텐츠를 보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셈이다.
SNS 플랫폼 자율규제가 가짜 뉴스를 온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은 정책상 허위 정보에 대해 신고 후 검토 절차를 거치지만, 신고 처리 속도가 늦고 삭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틱톡의 경우 신고된 정치 콘텐츠 상당수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아님'이라는 이유로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더 많다.
콘텐츠가 '가짜 뉴스' 판별 기준을 교묘히 피해 간다는 점도 피해를 키운다. 핵심은 완전한 날조가 아닌, 사실 일부를 왜곡하거나 발췌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관련 영상이 신고되더라도 플랫폼 측의 삭제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허위사실이나 노골적인 비방 콘텐츠에 대한 신고를 받더라도 삭제가 필요한 콘텐츠인지 우선 판단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소요된다"며 "삭제 권한 역시 각각의 커뮤니티에 있는 만큼, 즉각적인 삭제가 어려워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의 소비자였던 유권자가 확산의 매개자로 변모한 점도 특징이다.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한 청년 유권자는 "SNS를 통해 정치인의 막말이나 가짜 뉴스 영상 등을 접하게 되면 이를 개그 코드로 보거나, 장난으로 친구들에게 전달하며 즐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문철수 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는 "결국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한 리터러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며 "가짜 뉴스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일반인들에게 채우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요즘 고객님들 가격은 안 봐요" 과일 하나 팔려고...
마스크영역
"요즘 고객님들 가격은 안 봐요" 과일 하나 팔려고...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번 빠지면 더 많이 몰려온다…강한 자극 때리려 "충격" "팩트" 붙여 현혹[가짜 판치는 SNS 정치②]](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4032815124421177_1711606364.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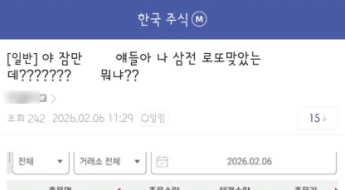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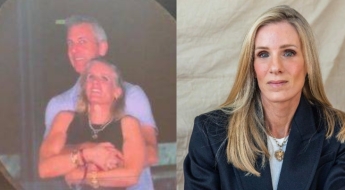


![[날씨]내일 아침 최저 -18도까지 '뚝', 전국 종일 영하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2217070912326_1769069229.jpg)

![다음 주 3492가구 공급 예정…1분기 서울 분양 2002년 이후 최다[부동산AtoZ]](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6451932306_1770363918.jpg)



![[기자수첩]전략적 요충지, 한국GM에 닿지 않나](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1061194711A.jpg)
![[기자수첩]설탕·밀 가격 인하 '눈 가리고 아웅'](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0485436390A.jpg)
![[논단]정말 시장은 정부를 이길 수 없을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710012185549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