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민주화후 출판·서점 황금기
스마트폰 보급되며 서점들 타격
SNS 확산으로 도시풍경 소비
서점 북클럽·북토크로 고객유치
중심 매대는 이벤트 공간 마련
독서가들에게 지적 네트워크
마포·종로구에만 책방 88곳
1980년대 초 종로2가 종로서적 앞은 사람들로 늘 붐볐다. 약속 장소로도 편리했지만 책을 사는 사람들도 많았다. 종로서적 말고도 근처 광화문에 교보문고가 문을 열었고, 각 대학가에는 당연하게 오래된 책방들이 있었다. 주택가 어디를 가더라도 책방 몇 개는 꼭 있었다. 사람들은 주로 종이책을 읽었고 책방에 가는 것이 일상이었다. 당시 서울은 정치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서점이 번성하는 드문 도시였다. 1987년대 이후 민주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표현의 자유 역시 보장되었고 그로 인해 출판과 서점은 황금기를 맞이했다.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사람들은 인터넷 쇼핑에 금방 적응했다. 학령 인구 감소로 학업 관련 책들의 소비층이 줄어들었다. 2014년 대학생 인구수는 이미 정점을 찍었고,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전화기를 보는 이들이 훨씬 많아졌다. 책이 아니어도 읽을 수 있는 글이 훨씬 다양해졌다. SNS 등장과 확산으로 인한 변화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오늘날 서울의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사람은 거의 보기 어렵다.
이로 인해 동네의 책방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 줄줄이 폐업에 이르렀다. 대형서점들 역시 매출을 올리기 위해 책 이외의 다른 물건들의 비중을 점차 늘렸다. 그렇다고 해서 종이책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서울에는 여전히 대형 서점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2010년대 후반부터 새로운 형태의 ‘동네책방’이 여기저기 생겼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인한 변화의 광풍 앞에서 이런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책 읽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말은 새삼스럽지 않다. 최근 여러 통계를 보면 한국인은 1년에 5.69권의 책을 읽는다. 10권을 읽는 미국이나 17권을 읽는 프랑스보다 낮지만, 6.2권을 읽는 일본과는 비슷하다. 이른바 황금기 때는 학생들이나 대학을 졸업한, 이른바 지식층들이 주로 책을 열심히 읽었다. 하지만 요즘은 독자층이 훨씬 넓어졌고, 많지는 않아도 꾸준히 읽는 이들도 꽤 많다. 서울의 대형 서점이 버틸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책 시장이 비교적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네마다 새로 들어서기 시작한 동네책방에서는 다른 모습도 감지된다. 책을 둘러싼 변화를 반영한다기보다 도시인들의 생활 습관과 소비 형태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듯하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여러 선진국에서는 도시에 대한 생각이 점차 달라지고 있다. 한국 역시 조금 늦긴 했지만 2010년 이후 이런 변화의 기운이 감지된다. 변화의 핵심은, 개성 있는 도시의 풍경이 소비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1980년대 종로2가나 신촌을 찾는 젊은이들은 그곳에서 친구를 만나고 같이 먹고 마셨다. 만나면 무언가를 소비하는 것이 당연했다. 다른 번화가들 역시 고객층은 달랐지만 어쨌든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모이면 소비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래서 번성한 상가가 형성된 지역의 도시를 일컬어 소비 도시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다.
지금은 조금 다르다. 물론 도시의 풍경을 소비하면서 지갑을 열기도 하지만, 그곳을 가는 주된 목적은 대상 지역을 걸으며 풍경과 분위기를 소비하고, 그 순간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공유하는 데 있다. 이렇듯 도시의 풍경을 소비하는 첫 사례는 2000년대 삼청동이었다. 북촌은 그보다는 조금 늦었다. 같은 시기 홍대는 풍경보다는 분위기로 인해 인기를 끌었다. 2010년대 이후 한옥이 많은 익선동, 붉은 벽돌 창고가 많은 성수동, 골목이 많은 서촌 등이 연달아 부상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감수성은 알려지지 않은 지역과 지역의 도시로까지 전파되었다.
도시 풍경의 소비를 촉진한 것은 SNS의 확산이었다. 한복을 빌려 입고 셀카를 찍으려면 배경이 되는 풍경에 특색이 있어야 한다. 궁궐 같은 유명한 장소가 아닌 한옥이나 붉은 벽돌, 골목 등을 사진 배경으로 훨씬 좋아한다. 고객들의 취향에 발맞춰 가게들마다 사진 찍기 좋은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만든다.
이러한 흐름 속에 동네책방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서점은 근본적으로 책을 팔아야 유지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동네책방은 책만으로는 충분한 매출을 기대하기 어렵다. 동네책방들마다 북클럽과 북토크 등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도 생존을 위한 방편일 수 있다. 오래전 동네서점을 떠올리면 학습지와 참고서를 비롯한 책들이 가득 꽂힌 서가가 떠오른다. 오늘날 동네책방에 가면 책들은 주로 벽면의 서가에 꽂혀 있고, 중심 매대는 이벤트 공간을 위해 대체로 이동형이다. 말하자면 오늘날 동네책방은 책이 있는 분위기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면서 실제로 책을 읽으려는 이들에게 지적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떤 고객들은 이곳에서 분위기만 소비하고 어떤 독자들은 이곳에서 책을 사서 읽는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사업은 쉽지 않아 보인다. 개업하고 몇 년 뒤 폐업하는 곳들이 역시 많다. 하지만 놀랍게도 모두 다 그렇지는 않다. 단단하게 고객 네트워크를 만들고 오래 유지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고, 새로운 책방도 계속 생겨나고 있다. 전국의 동네책방 정보와 지도를 제공하는 ‘동네서점’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는 266개의 동네책방이 있다. 마포구에는 55개, 종로구는 33개가 있다. 도시 풍경 소비의 대표적인
곳이라 할 수 있는 이 지역에만 약 33%의 책방이 존재한다. 곳곳에서 동네의 지적 사랑방으로서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다.
미래는 어떨까. 2020년대가 후반으로 향해 가면서 도시의 소비 양상은 다시 달라지고 있다. 도시 풍경을 향한 소비 열기가 점점 식어가는 조짐을 보인다. 그런 한편으로 인터넷 쇼핑과 전자책은 더욱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종이책을 찾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점점 줄어들 전망이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어찌 보면 지금 이 순간이 동네책방들의 황금기일지도 모른다. 풍경만을 선호하던 이들이 책 그 자체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책을 찾는 이들의 숫자는 훨씬 줄어들겠지만 좋아하는 이들은 더 분명하게 꾸준히 책을 읽을 것이다. 그런 시대를 위해 오늘의 동네책방은 새로운 의미와 역할을 스스로 만들어낼 것이다. 힘들겠지만 지치지 않기를, 그들 모두의 건투를 빈다.
로버트 파우저 전 서울대 교수
꼭 봐야할 주요뉴스
![또 19억 판 아버지, 또 16억 사들인 아들…농심家 '셋째 父子'의 엇갈린 투심[상속자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6013009165322085_1769732214.jpg) 또 19억 판 아버지, 또 16억 사들인 아들…농심家 ...
마스크영역
또 19억 판 아버지, 또 16억 사들인 아들…농심家 ...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걸으며 서울을 생각하다]공동체의 지적 사랑방, 서울 동네책방](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4110610211188219_1730856072.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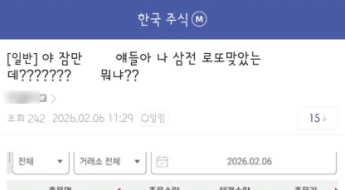






!["쉿! 말하지 마세요" '통 김밥' 베어먹었다간 낭패…지금 일본 가면 꼭 보이는 '에호마키'[日요일日문화]](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6162132271_1770362181.jpg)
!["삼성·하이닉스엔 기회" 한국 반도체 웃는다…엔비디아에 도전장 내민 인텔[칩톡]](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031309072266065_1741824442.jpg)
![[상속자들]신라면 믿고 GO?…농심家 셋째 父子의 엇갈린 투심](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3009165322085_1769732214.jpg)






![[기자수첩]전략적 요충지, 한국GM에 닿지 않나](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1061194711A.jpg)
![[기자수첩]설탕·밀 가격 인하 '눈 가리고 아웅'](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0485436390A.jpg)
![[논단]정말 시장은 정부를 이길 수 없을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710012185549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