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신뢰 관계 없는 한동훈은 위험
수직적 당정 관계인 원희룡도 문제
"대통령실과 견제적 협력관계 견인" 자신
"총선이 끝난 지 80여일이 지나도 총선 백서 하나 못 만드는 당이다. 공동묘지 평화 같은 국민의힘은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
윤상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시아경제의 인터뷰에서 "지금 전당대회가 친윤(친윤석열)과 친한(친한동훈) 구도로 싸우고 있다. 줄 서거나, 줄 세우기 하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을 폭파하러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고질적인 계파 정치로 공멸의 길을 가고 있다"며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후보도 '변화'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무슨 변화를 말하는지 모르겠다. 변화라는 것은 일단 우리 당이 성찰과 반성 위에서 혁신을 이뤄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총선에서 완전히 괴멸적 참패를 당했는데 그것에 대해 반성과 성찰의 총선 백서를 내는 게 먼저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있다. 자기 잘못을 당당하게 보려고 하는 용기가 있어야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 총선 패배 책임은 얘기하지 않고 변화만 이야기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총선 백서 출간해라, 내가 검증받겠다'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해야 한다. 한 후보가 변화라는 단어를 말로 옮기기에는 부족한 면이 너무 많아 보인다.
한 후보로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변화를 완성하겠다는 것 아닐까.
2~3개월 만에 다시 나올 것이면 왜 사퇴하나. 사퇴할 필요가 뭐가 있었나. 사퇴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하기 위한 제스처였다. 그리고 또 나온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점이 뭐가 있나. 보수가 품격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 책임을 상수로 놓고 선거는 누가 치렀나. 비대위원장이 공천 전략, 메시지, 인사, 정책 다 총괄했다.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자세를 갖추는 게 옳은 태도다.
김건희 여사와 갈등, 대통령실과의 갈등도 부각되고 있다.
한 후보는 문자메시지를 공적인 관계, 사적인 관계로 나누는데 (대통령 부부는) 오랫동안 한 후보를 키워주신 분이다.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서 몇 단계 뛰어서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을 만들어줬다. 일종의 '황태자'다. 인간적 관계에서 응당 그분 입장에서 해야 할 도리가 있었을 것 같다. 그런데 공적 관계, 사적 관계로 나누는 것을 보면 김 여사한테도 신뢰가 없는 것이다. 그 당시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이 나왔는데 일부러 무시한 것 아닌가 강한 의구심이 든다. 차별화 전략 속에서 자기가 잘 되려면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한 후보 지지율은 여전히 높다.
국민의힘에 대권주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발표되는 지지율은 국민 여론이라서 당원 여론과는 엄청 다를 것이다. 현장에 가면 느낄 수 있는데 당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성공하길 바라고 두 번 다시 탄핵의 악몽에 갇히길 원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한 후보의 신뢰가 바닥이라는 식으로 대통령실에서 험악한 말이 나오면 당원들이 여러 생각을 할 것이다.
당대표가 된다면, 당정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너무 윤심에 기대면 안 된다. 원희룡 후보가 지금 그렇다. 수직적 당정 관계면 어떻게 되는지 봐왔지 않나. 대신 대통령과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 신뢰를 갖고 민심의 따가운 목소리를 다 전해야 한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에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고 뒷받침을 해야 한다. 대통령을 견인해 나가는 것은 당이다. 당은 민주당과 협상도 해야 하므로 대통령실과 때로는 협력도 하고 어떨 때는 견제적인 협력 관계로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관계다.
정통 보수를 강조하는데 나경원 후보와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인가.
나 후보와는 전공 자체가 다르다. 법이 아닌 경제와 국제정치를 공부했다. 저는 지난해 공천 협박 속에서 수도권 위기를 계속 얘기했지만, 나 후보는 수도권 위기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세 분은 모두 찬성했지만 나는 끝까지 반대했다.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우파가 위기에 처하고 당이 분열되는 상황에서 당원들과 동고동락하고 같이 울었다. 당이 저를 버렸을 때도 저는 당을 버리지 않았다. 계속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살아 돌아오면 복당하고…. 무소속과 복당을 오갔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나경원 "팬덤·줄세우기 안 먹혀…이재명 퇴출 내가 적임자"[당권주자 인터뷰]②](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7/2024070514225341744_172015697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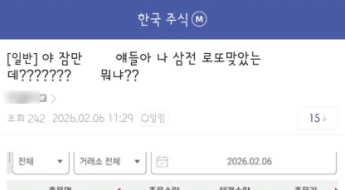






!["쉿! 말하지 마세요" '통 김밥' 베어먹었다간 낭패…지금 일본 가면 꼭 보이는 '에호마키'[日요일日문화]](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6162132271_1770362181.jpg)
!["삼성·하이닉스엔 기회" 한국 반도체 웃는다…엔비디아에 도전장 내민 인텔[칩톡]](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031309072266065_1741824442.jpg)





![[PE는 지금]](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1101931756_1770343819.jpg)
![[상속자들]신라면 믿고 GO?…농심家 셋째 父子의 엇갈린 투심](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3009165322085_1769732214.jpg)
![[기자수첩]전략적 요충지, 한국GM에 닿지 않나](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1061194711A.jpg)
![[기자수첩]설탕·밀 가격 인하 '눈 가리고 아웅'](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0485436390A.jpg)
![[논단]정말 시장은 정부를 이길 수 없을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710012185549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