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대구 오페라 하우스를 방문했다. 독일 작곡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1864~1949)의 대표 오페라 작품 중 하나지만 국내에서 보기 힘들다는 ‘살로메’를 관람했다. 올해 대구 오페라 축제 개막작이다. 오는 20~21일에는 슈트라우스의 또 다른 오페라 ‘엘렉트라’가 무대에 오른다. 엘렉트라의 국내 공연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에도 오페라 축제 기간 중 대구를 찾았다. 지난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리하르트 바그너(1813~1883)의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였다. 살로메와 엘렉트라의 공연 시간은 2시간이 채 안 되지만, 4편으로 구성된 니벨룽의 반지는 4일에 걸쳐 15시간 이상 공연해야 하는 대작이다. 막간 휴식 시간까지 포함하면 총 공연 시간은 17시간을 넘는다. 니벨룽의 반지는 긴 공연 시간 때문에 오페라의 본고장 유럽에서도 보기 힘들다. 지난해 니벨룽의 반지 대구 공연도 2005년 9월 세종문화회관에서 국내 초연이 이뤄진 뒤 17년 만이었다.
차별화된 작품으로 눈길을 끄는 대구 오페라 축제는 올해 20회째를 맞았다. 서울에서도 보기 힘든 공연을 잇달아 무대에 올리며 오페라 도시 대구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전라남도 구례로 여행을 갔다. 도시를 둘러보던 중 양수발전소 유치가 꼭 필요하다는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지난 여름휴가에 경북 영양군을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풍경을 볼 수 있었다. 영양군은 양수발전소 유치에 사활을 건 듯한 인상을 줬다. 지자체 예산을 모두 쏟아부은 듯 도로 곳곳에 양수발전소 유치를 주장하는 현수막과 깃발이 나부꼈다. 활력을 잃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방 중소 도시들의 발버둥이다.
차별화된 문화예술 콘텐츠가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시장 규모가 작은 지방에서 문화예술 공연을 성공시키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지레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될 일도 되지 않는다.
지난 3월 독일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내한 공연을 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악단이지만 밤베르크는 인구 8만명의 소도시에 불과하다. 밤베르크 심포니는 체코에 살던 독일인 음악가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6년에 창단했으며 오늘날 밤베르크라는 도시를 규정하는 아이콘이 됐다.
국내에서도 개성 있는 문화예술 축제가 특정 지역을 연상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전라북도 무주 산골영화제, 강원도 평창의 계촌 클래식 축제 등이 그렇다.
대구는 일제강점기부터 걸출한 작곡가들이 잇달아 배출됐고 6·25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 음악예술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1950~1960년대에는 대구 지역 대학에서 잇달아 음악과가 신설됐고 1992년에는 전국 최초로 시립오페라단을 창단했다. 이러한 문화예술적 자산은 대구 오페라 축제가 탄생할 수 있는 토양이 됐다.
인구 감소 시대에 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 도시들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문화예술 자산이 무엇일지 찾아야 할 때다.
박병희 문화스포츠부장 nut@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6000명 잘려나간다…"요즘 누가 먹어요" Z세대가 ...
마스크영역
6000명 잘려나간다…"요즘 누가 먹어요" Z세대가 ...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진 제공= 대구오페라축제]](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3101612412516504_1697427685.jpg)



![오입금 된 비트코인 팔아 빚 갚고 유흥비 쓴 이용자…2021년 대법원 판단은[리걸 이슈체크]](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910431234020_1770601391.png)
!["세 낀 집, 8억에 나왔어요" 드디어 다주택자 움직이나…실거주 유예에 기대감[부동산AtoZ]](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509352029563_177025172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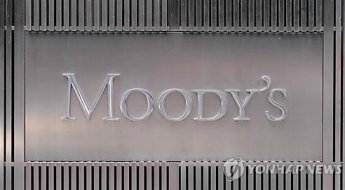
![[서용석의 퓨처웨이브]'도구'가 아니라 '존재'임을 선언하는 AI](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210480619240A.jpg)
![[초동시각]지역의사 10년 '유배' 아닌 '사명' 되려면](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210225661581A.jpg)
![[기자수첩]개성공단 '보상'과 '지원'의 간극](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210430293507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