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견기업법' 제정 10년차…"현실성 떨어져"
"중견기업 육성틀 마련이 '피터팬 증후군' 극복 열쇠"
경기 이천시에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대표는 올해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중견기업이 된 다음해부터 3년간 부여되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됐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자격으로 받았던 취업자 소득세 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등 고용 관련 세제 혜택을 올해부터 받을 수 없다. A대표는 해외 영업부서를 법인분할해 중소기업으로 다시 돌아갈지 고심중이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건실한 중견기업마저 중소기업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있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얻는 혜택이 줄지만 규제는 늘어 중소기업이 대기업까지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꺾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성장사다리론'에 입각해 중견기업법 제정 등 각종 지원책이 마련된지 약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중소기업 평균매출이 업종별 400억~1500억원을 초과하거나 업종에 상관없이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면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 중견기업이 되면 기존에 받던 57개의 규제에 126개가 더해져 183개의 규제를 받는다. 반면 고용지원, 세액공제, 정책자금, 수출지원 등 160여개의 혜택은 사라진다. 내야하는 세금만 30여종이 늘어난다. 기업 인지도 향상과 자금조달 규모 확대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기업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중견기업에 진입할 유인동기는 거의 없다.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진입할때도 상황은 비슷하다.
우리나라에서 중견기업이라는 개념은 2014년 1월 중견기업법을 제정하면서 구체화됐다. 대·중소기업 사이 별도 구간을 만들어 세제·금융 혜택을 주자는 취지였다. 도입 당시 10년 한시법으로 2024년 7월 일몰 예정이었으나 지난 3월30일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지난 10여년간 곧 소멸될 법이라는 인식 탓에 현장을 반영한 법안 구체화는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중견기업은 개념만 존재했을 뿐 중소기업을 관할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기업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사이 주무부처 없이 '회색지대' 취급을 받았다.
산업계에서는 피터팬 증후군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된 중견기업 육성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라는 이분법적 구조에서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책 남발이 피터팬 증후군을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이제라도 중견기업 배양을 위한 토대를 갖춰 중소기업을 온실속 화초처럼 정부 지원에만 의지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얘기다.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정부 지원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자금지원보다는 규제 완화쪽으로 유인책을 줘 도약을 이끌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권 학회장은 "정부 예산이 한정적이라 중소기업에 주던 혜택을 중견기업까지 지속적으로 주긴 어렵다"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넘어왔을 때 자금 지원이 줄더라도 규제는 완화됐다는 느낌이 들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 자원 운영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권 학회장은 벤처·중소·중견·대기업이라는 형식적인 분류를 통한 지원보다는 시장을 선도하거나 뒤처진 업종과 기업군을 추려 '핀셋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과 같은 형태의 제도를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의견이다. 원샷법은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권 학회장은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사업 확장을 위해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데 경영권 방어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복수의결권제도도 벤처기업에만 국한할 게 아니라 다양하게 적용하는 등 제도를 유연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대기업 못키우는 대한민국]⑤기업 규모 키웠더니…정책지원 사라지고 "30종 세금 더내라"](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3071808503410790_1689637834.png)

![[대기업 못키우는 대한민국]④"기업 커지면 불이익 버틸 유예기간 필요"](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7/2023042711210413488_1682562064.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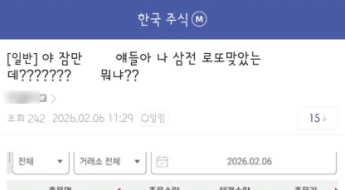









![[날씨]내일 아침 최저 -18도까지 '뚝', 전국 종일 영하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2217070912326_1769069229.jpg)

![다음 주 3492가구 공급 예정…1분기 서울 분양 2002년 이후 최다[부동산AtoZ]](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6451932306_1770363918.jpg)



![[기자수첩]전략적 요충지, 한국GM에 닿지 않나](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1061194711A.jpg)
![[기자수첩]설탕·밀 가격 인하 '눈 가리고 아웅'](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0485436390A.jpg)
![[논단]정말 시장은 정부를 이길 수 없을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710012185549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