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과 진보당, 금태섭·양향자 신당 비판
"어떤 당을 하려는지 모르겠다" 연대론 선긋기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에 실망한 '무당층' 표심을 잡으려는 제3지대 신당이 금태섭 전 의원, 양향자 의원 등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제3지대 내에서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정의당과 진보당이 먼저 금태섭 전 의원이 이끄는 '성찰과 모색',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희망'에 대해 "궤적이 달라 함께 하기 힘들다", "기회주의적 야합"이라고 했고, 성찰과 모색 측은 반박하고 나섰다.
'제3지대' 세력과 연합해 재창당을 준비 중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서 "정의당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적 약자를 뚜렷이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한 길을 걸어 왔는데, 그런데 두 분(금태섭·양향자)의 이전까지의 정치적 이력은 정의당이 걸어왔던 길하고 좀 다른 사이드에서 진행돼 왔던 것"이라며 함께 하기 힘들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일단 두 분들이 뭐를 어떤 당을 하려고 하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며 "두 분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거대 양당 심판론, 이걸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대 양당을 심판해서 대한민국 사회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거냐(를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재창당 계획을 밝힌 지난 25일에도 "그 분들의 궤적, 정당을 선택해 온 과정을 보면 함께 하는 것에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희숙 진보당 대표는 지난 26일 대표단회의 모두발언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기회주의적 야합이 본격화됐다"며 "이들은 ‘제3지대’ 신당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공천을 못 받은 사람들의 ‘헤쳐모여’가 된다면 결말은 뻔하다"고 했다.
'성찰과 모색' 측은 발끈했다. 금 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감을 표하며 "노선에 차이가 있다거나 정책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삶의 궤적' 운운하는 말씀에는 반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조국 사태 당시 그 심한 욕을 먹어가면서 내 딴에는 꼭 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말을 할 때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 편을 들어주는 발언을 들은 기억이 별로 없다"고 했다.
성찰과 모색은 대변인 명의로도 정의당을 향해 "이 대표는 '성찰과 모색'을 주도하는 금 전 의원을 콕 찍어 '삶의 궤적' 운운하며 공격했다. 무례하다"며 "조국 사태를 방관했으며, 위성정당 꼼수에 들러리 서고, 검수완박에 찬성한 정당의 대표가 반성과 성찰은커녕 특정 개인의 삶을 공격하고 있으니 어이없는 일"이라고 했다.
진보당을 향해서는 "전주 재보궐 선거에 '고맙습니다, 민주당'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당선된 의원이 진보당 의원 아닌가, 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인 ‘처럼회’에 가입하려고 기웃거렸다가 안팎의 거센 반발에 철회한 의원 또한 진보당 의원 아닌가"라며 "제발 민주당과 야합할 생각이나 하지 마라"고 쏘아붙였다.
정의당, 진보당, 성찰과모색, 한국의희망 모두 거대 양당에 실망한 30% 무당층의 표를 노리는 광의의 제3지대 정당들이다. 정의당은 원내교섭단체 기준인 최소 20석, 성찰과모색은 '수도권 중심 30석', 한국의희망은 50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손을 잡을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 한정된 '무당층' 파이를 두고 경쟁하는 상대인 셈이다.
하지만 이들에게 과연 무당층이 웃어줄지는 미지수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서 "무당층이 많다고 해서 무당층들이 제3지대를 지지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다시 양당제로 어떤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3지대가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싫어함이라는 감정만으로 누군가를 데려올 수는 없지 않겠나"며 "그런 점에서 유권자들도 분명한 정책적 비전이나 가치 노선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표를 주시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또 19억 판 아버지, 또 16억 사들인 아들…농심家 '셋째 父子'의 엇갈린 투심[상속자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6013009165322085_1769732214.jpg) 또 19억 판 아버지, 또 16억 사들인 아들…농심家 ...
마스크영역
또 19억 판 아버지, 또 16억 사들인 아들…농심家 ...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3062715463777887_1687848397.jpg)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3062715464877888_1687848408.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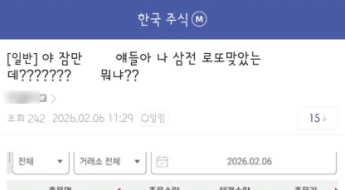






!["쉿! 말하지 마세요" '통 김밥' 베어먹었다간 낭패…지금 일본 가면 꼭 보이는 '에호마키'[日요일日문화]](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6162132271_1770362181.jpg)
!["삼성·하이닉스엔 기회" 한국 반도체 웃는다…엔비디아에 도전장 내민 인텔[칩톡]](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031309072266065_1741824442.jpg)
![[상속자들]신라면 믿고 GO?…농심家 셋째 父子의 엇갈린 투심](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3009165322085_1769732214.jpg)






![[기자수첩]전략적 요충지, 한국GM에 닿지 않나](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1061194711A.jpg)
![[기자수첩]설탕·밀 가격 인하 '눈 가리고 아웅'](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0485436390A.jpg)
![[논단]정말 시장은 정부를 이길 수 없을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710012185549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