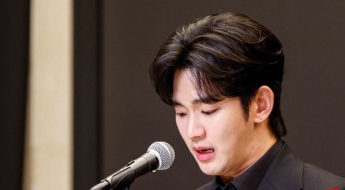[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구글 클라우드가 정부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제도 개편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구글 클라우드 "CSAP 제도 개편되면 혁신 일어날 것"
장화진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 사장은 22일 '넥스트 22 리캡: 서울'에서 미디어브리핑에서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관련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다"면서 "만약에 바뀌면 거기에 맞게 구글 클라우드도 인증을 받고 공공사업을 활발하게 펼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이날 CSAP와 관련된 구글 클라우드 입장을 묻는 질문에 “CSAP 규제 완화가 돼 공공 고객에게 선택권이 생기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것 같고 시장의 선한 경쟁을 통해 혁신도 많이 일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 클라우드는 한국은 아니지만 미국, 호주, 싱가포르, 일본, 유럽 등 많은 공공시장에서 좋은 레퍼런스를 갖고 있다”며 “그것을 한국의 공공고객에게 소개하고 혁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CSAP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지켜보면서 거기 맞게 인증 프로세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SAP 등급제, 토종 역차별 우려
CSAP는 지난 2016년 처음 도입된 제도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민간 클라우드 기업들은 필수적으로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이 인증을 받으려면 소스 코드 공개와 함께, 공공기관용 클라우드 서버와 민간 클라우드 서버가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사업자(CSP)들은 민간 클라우드 시장의 80%를 장악했음에도, 물리적 망분리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CSAP를 등급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의 데이터를 다루는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인증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이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게 공공부문에 시장을 열어줌으로써 클라우드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내세운 제도 개편의 취지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취지와 달리 등급제 전환이 국내 기업들의 수요 확대는커녕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과 같은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곧바로 논란이 제기됐다.
물리적 망분리 조건을 완화할 경우, 해외 사업자들의 공공 시장 진입이 쉬워질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국내법에 따라 CSAP 인증을 받기 위해 비용을 투입하고 공공존에 물리적 망분리를 완료한 국내 기업들만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10월까지 등급제 시행을 위한 세부 기준과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뒷받침할 고시 개정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업계와 국회의 반발로 제도 도입과 시행 시기가 연기된 상태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또 19억 판 아버지, 또 16억 사들인 아들…농심家 '셋째 父子'의 엇갈린 투심[상속자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6013009165322085_1769732214.jpg) 또 19억 판 아버지, 또 16억 사들인 아들…농심家 ...
마스크영역
또 19억 판 아버지, 또 16억 사들인 아들…농심家 ...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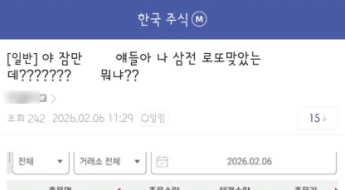






!["쉿! 말하지 마세요" '통 김밥' 베어먹었다간 낭패…지금 일본 가면 꼭 보이는 '에호마키'[日요일日문화]](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6162132271_1770362181.jpg)
!["삼성·하이닉스엔 기회" 한국 반도체 웃는다…엔비디아에 도전장 내민 인텔[칩톡]](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031309072266065_1741824442.jpg)

![[상속자들]신라면 믿고 GO?…농심家 셋째 父子의 엇갈린 투심](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3009165322085_1769732214.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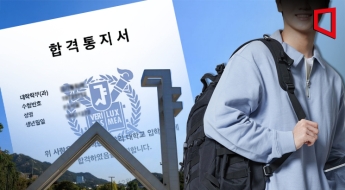

![[기자수첩]전략적 요충지, 한국GM에 닿지 않나](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1061194711A.jpg)
![[기자수첩]설탕·밀 가격 인하 '눈 가리고 아웅'](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0485436390A.jpg)
![[논단]정말 시장은 정부를 이길 수 없을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710012185549A.jpg)

![1년새 10배 올랐는데 아직 더 남았다…폭발 성장하는 이 기업[주末머니]](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811051332854_1770516313.pn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