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자산 중 부동산 비중만 80%
상위 20% 12억, 하위 20% 490만원
청년들, 매달 80만원씩 17년간 갚아야
빚 부담 훅 뛰자 2030 "결혼 안할래요"
코로나19 펜데믹 국면에서 부동산발(發) 자산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평균 자산 중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80%에 육박한 가운데 고·저자산층 간 자산격차는 4년래 최고 수준으로 벌어졌다. 이에 따라 약 90%가 빚 부담을 안고 주택구매 행렬에 동참하는 2030세대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고·저자산층간 부동산 자산격차 251배
5일 신한은행이 20~64세 경제활동인구 1만명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통해 설문을 진행, 조사·분석해 발간한 ‘보통사람 금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가구 내 평균 보유자산은 전년 대비 7983만원 증가한 5억1792만원으로 집계됐다.
자산 종류별로 보면 보유 자산 중 부동산 자산 비중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보유자산 중 부동산 자산은 21.1%(7214만원) 증가한 4억1386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가구 내 평균 자산의 79.9% 수준이다. 부동산 자산 비중은 지난 2018년 75.9%, 2019년 76.0%, 2020년 78.0% 등으로 4년 연속 성장세를 보였다.
가구소득 구간별로도 부동산 자산이 모두 늘었다. 5구간(상위 20%)의 경우 1억779만원 증가한 8억3130만원, 4구간(상위 20~40%)의 경우 8654만원 증가한 5억2394만원, 3구간(중간 20%)은 1억490만원 늘어난 4억1968만원이었다. 5·3구간의 경우 증가폭이 1구간(하위 20%)의 부동산 전체 자산 규모보다도 컸다. 1구간도 2052만원 늘어난 8722만원, 2구간 역시 4100만원 늘어난 2억718만원이었다. 모든 소득 구간에서 자산규모가 커지며 지난 2020년 10.8배 수준이던 가구소득 5·1구간 부동산 자산 격차는 지난해 9.5배로 하락했다.
하지만 고·저자산층의 부동산 자산격차는 4년래 최고 수준으로 벌어졌다. 총자산구간별 부동산 자산규모를 살펴보면, 5구간은 전년 대비 2억4183만원 늘어난 12억2767만원으로 집계됐으나 1구간은 110만원 줄어든 490만원에 그쳤다. 이에 따른 5·1구간 간 부동산 자산 격차는 251배로 지난 2018년(125배)의 2배를 넘어섰다. 신한은행은 "총 자산 증가에 부동산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흐름은 1997년 외환위기, 2009년 세계금융위기 등과도 궤를 같이 한다. 매 위기 때마다 고자산·고소득층은 안정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위기 속에서도 자산·소득을 늘려 지위를 공고화 하는 반면, 안정된 자산·소득기반이 없는 저자산·저소득층은 어려움을 겪으며 계층 하락의 위기를 겪고 있다. 경제위기 때마다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부동산발 자산불평등은 ‘삶의 질’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해 ‘최상’ 이라고 답한 응답자들의 보유 총 자산은 평균 7억6119만원으로 ‘최하’라고 답한 응답자들의 평균 2억8598만원보다 2.66배(3억6690만원) 많았다. 두 응답군 간 소득격차(1.71배)보다 높은 수준이다.
"집사면 17년 갚아야" 결혼·출산 포기하는 2030
이처럼 부동산발 자산불평등이 심화되며 결혼·출산을 앞둔 청년층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거주 주택을 구매한 가구 중 2030세대의 비중은 전년 대비 1%포인트 늘어난 7.2%로 집계됐다. 구입한 주택의 84.1%는 아파트였다.
문제는 2030 가구의 자금 융통 방식이 ‘대출’이란 점이다. 주택을 구매한 2030세대 중 89.8%가 대출을 이용했는데, 이는 지난 2020년보다 14.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는 전 연령의 대출이용률(79.1%)과 비교해도 10%포인트 가량 많은 수준이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청년들이 구매한 주택의 평균 가격은 3억6446만원이었는데, 이 중 대출금은 1억6720만원이었다. 집 값은 전년 대비 3352만원 올랐는데 대출금은 4955만원이 늘었다. 대출금의 증가는 곧 청년세대의 빚 부담으로 이어진다. 2030세대는 평균적으로 매월 80만원을 17.4년간 상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빚으로 주택 구매를 원하는 청년은 56.9%에 달했다. 이는 전 연령대 평균(53.9%)을 웃도는 수치다. 소득 여력이 부족한 탓에 ‘2년 내 (주택을) 구매하겠다’고 응답한 비중은 10.8%에 불과했다. 이 역시 전 연령대 평균(11.6%)을 밑돈다.
이런 집값 상승과 이에 따른 부채 증가는 2030의 결혼·출산관(觀)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결혼 1년차인 신혼가구 비중은 4.5%로 4년 전(6.4%)보다 1.9%포인트 감소했다. 결혼 준비 시 부담스러웠던 점을 묻자 절반이 넘는 55.0%가 "주택 마련"이라고 응답했다. 같은 기간 결혼비용은 1억3404만원에서 1억6916만원으로 3512만원 불어났는데 97.8%(3437만원)가 주택마련에 따른 증가분이었다.
2030세대 부부 중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비중도 4년 만에 11.6%에서 17.4%로 5.8%포인트 커졌다. 자녀출산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58.0%가 가치관적 이유를 꼽았다. 경제적 이유가 18.0%로 뒤를 이었고 시기적 이유(8.0%), 사회적 이유(6.0%), 건강·가족부양(2.0%) 순이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또 19억 판 아버지, 또 16억 사들인 아들…농심家 '셋째 父子'의 엇갈린 투심[상속자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6013009165322085_1769732214.jpg) 또 19억 판 아버지, 또 16억 사들인 아들…농심家 ...
마스크영역
또 19억 판 아버지, 또 16억 사들인 아들…농심家 ...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보통사람 보고서] 부동산 자산격차 251배…그래도 빚 내 산다는 2030](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2040510582416574_1649123904.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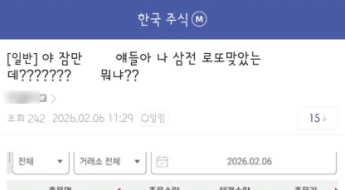






!["쉿! 말하지 마세요" '통 김밥' 베어먹었다간 낭패…지금 일본 가면 꼭 보이는 '에호마키'[日요일日문화]](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6162132271_1770362181.jpg)
!["삼성·하이닉스엔 기회" 한국 반도체 웃는다…엔비디아에 도전장 내민 인텔[칩톡]](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031309072266065_1741824442.jpg)
![[상속자들]신라면 믿고 GO?…농심家 셋째 父子의 엇갈린 투심](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3009165322085_1769732214.jpg)






![[기자수첩]전략적 요충지, 한국GM에 닿지 않나](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1061194711A.jpg)
![[기자수첩]설탕·밀 가격 인하 '눈 가리고 아웅'](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0485436390A.jpg)
![[논단]정말 시장은 정부를 이길 수 없을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710012185549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