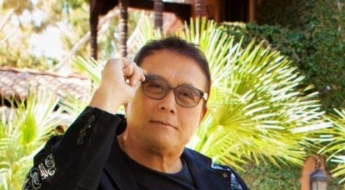코로나시대, 넷플릭스 등 가입자 폭발…극장관객 80% 추락, 126년만 최대위기
거대 자본 앞세운 OTT에 투자·배급사도 극장서 등돌리는 중
사실상 영화관 선공개 포기…디즈니플러스 등 진출시 입지 더 좁아져

18일 서울 CGV 용산아이파크몰이 평소보다 한산하다. 이날 CGV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다음달 2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1천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영화관이 탄생 126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기피 공간이 돼버렸다. 지난 1~2월 영화관 관람객 수는 489만8053명. 지난해 같은 기간 2421만6065명보다 80% 정도 적다. 영화관 내 코로나19 전염 사례가 없는데도 악화일로다. 중대형급 영화들이 개봉을 회피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로 이동해버렸다. 일정한 ‘홀드백(콘텐츠 부가 판권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포기했지만 돌아올 기미가 없다.
◆45년 독점 시대 마감
영화관은 TV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1960년에도 존폐 위기를 맞은 바 있다. 많은 곳이 폐관하고 영화 편수는 급감했다. 영화계는 블록버스터를 만들어 위기에서 벗어났다. 제작·선전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높은 수익을 노렸다. 이에 동조해 생겨난 영화관이 오늘날 시네마 콤플렉스(cinema complex·건물 하나에 상영관 여러 개를 갖춘 대규모 극장)다. 수용 정원이 많은 상영관을 블록버스터 중심으로 운영해 효율성은 극대화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죠스(1975)’를 시작으로 45년간 유지된 흐름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뚝 끊겼다. 중대형급 영화들이 제작비 회수조차 어려워지자 영화관을 하나둘 떠나버렸다. 그래서 새롭게 찾은 둥지가 OTT다.
OTT는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투자·배급까지 병행한다. 배급·제작사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없다. 하지만 일정 수익을 보장받아 다음 영화를 만들 수 있다. 코로나19로 자금난이 심해지면서 너 나 할 것 없이 OTT의 문을 두드린다. 그 사이 영화관은 서브 플랫폼으로 전락했다. 투자·배급사를 만나 개봉을 설득하기에 이르렀다. 굳건히 지켜온 홀드백은 그렇게 사라졌다.
◆찬밥 신세
배급사 CJ ENM은 공유·박보검이 주연한 영화 ‘서복’을 다음달 15일 영화관과 OTT(티빙)에서 동시 공개한다. CJ ENM은 티빙에 판권을 독점으로 넘기는 대신 일정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침체한 극장 산업을 고려해 보장액 일부를 포기했다.
협의 과정에서 영화관은 어떤 목소리도 내지 못했다. 당장 스크린에 걸 영화가 절실했던 까닭이다. 지난 주말(19~21일) 박스오피스 10위권의 세 영화(반지의 제왕: 두 개의 탑,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 중경삼림)는 재개봉작이다. 2위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1월 27일)’과 5위 ‘소울(1월 20일)’은 개봉한 지 약 두 달이 됐다.
영화관은 개봉 유치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최근에도 배급사들과 만나 류승룡·염정아 주연의 ‘인생은 아름다워’, 소지섭·김윤진 주연의 ‘자백’, 정성화·김고은 주연의 ‘영웅’, 박소담·송새벽 주연의 ‘특송’ 등을 상영하자고 부탁했다. 그러나 매번 "아직…"이라는 답만 돌아왔다.
배급사 A 관계자는 "우리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제작사는 물론 많은 투자자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급사 B 관계자는 "지난해 큰마음 먹고 영화를 개봉했으나 별 혜택이 없었다"며 "영화관이 얼마나 안전한지 알리는 노력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급사들의 난색에 영화관 C는 이미 OTT에서 공개한 영화·드라마 상영을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홍보·마케팅에 참여하지도 않고 스크린에 걸면 그만이냐는 핀잔을 들어야 했다. 재개봉 추진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상영 중인 ‘반지의 제왕’ 시리즈의 경우 성사까지 6개월 이상 걸렸다.
◆‘서복’에 달린 명운
‘서복’ 같은 개봉 방식은 당분간 굳어질 수 있다. 배급사 B 관계자는 "영화관·OTT의 성적을 모두 눈여겨보고 있다"며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진다면 비슷하게 개봉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배급사 C 관계자도 "최근 한 OTT로부터 지식재산권(IP) 계약을 제안받았으나 ‘서복’ 개봉 뒤로 답을 미뤘다"며 "기존의 영화관 선공개 방식은 사실상 깨졌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18일 서울 CGV 용산아이파크몰에 영화 관람료 인상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이날 CGV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다음달 2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1천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원본보기 아이콘배급·제작사가 영화관을 포기하지 않은 건 가장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9년 영화산업 매출의 76%는 영화관 관람료에서 비롯됐다. 결국 극장 수입을 최우선한다면 적기를 기다릴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복’과 같은 절차를 밟거나 OTT로 직행할 수밖에 없다. 물론 신작과 가장 빨리 만날 수 있었던 이점을 잃은 이상 예전의 1000만 관객 영화는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영화관 D 관계자는 "디즈니플러스, HBO맥스 등 해외 OTT들이 사업을 본격화하면 설 자리가 더 좁아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털어놨다. 영화관 C 관계자도 비슷하게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갑이 아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요즘 고객님들 가격은 안 봐요" 과일 하나 팔려고...
마스크영역
"요즘 고객님들 가격은 안 봐요" 과일 하나 팔려고...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영화관의 몰락]OTT에 밀려난 극장 OTL](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1032310552744635_161646453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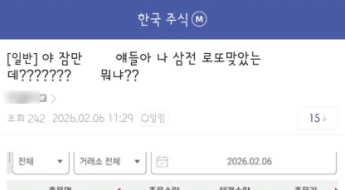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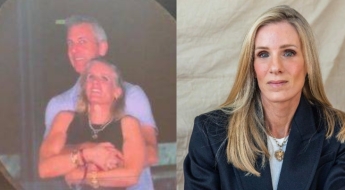


![[날씨]내일 아침 최저 -18도까지 '뚝', 전국 종일 영하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2217070912326_1769069229.jpg)

![다음 주 3492가구 공급 예정…1분기 서울 분양 2002년 이후 최다[부동산AtoZ]](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6451932306_1770363918.jpg)



![[기자수첩]전략적 요충지, 한국GM에 닿지 않나](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1061194711A.jpg)
![[기자수첩]설탕·밀 가격 인하 '눈 가리고 아웅'](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0485436390A.jpg)
![[논단]정말 시장은 정부를 이길 수 없을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710012185549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