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채권 발행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환경개선, 사회적 가치창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된 채권이다. ESG 채권은 특수목적채권으로 자금사용목적이 발행취지에 맞는지 평가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는다. 또 자금소진이 이루어질 때까지 발행일로부터 1년마다 사후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제시해야 한다.
은행들은 대체로 중소기업대출지원,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투자 등 ESG의 취지에 부합한 자금이용 범위가 넓은 편이다. 더욱이 은행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대출수요 급증으로 위험가중자산 증가에 대비한 자본확충이 필요하다. 은행들은 자본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증권 형태의 5년 만기 ESG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자본을 확충하고, 발행금리도 낮게 책정할 수 있어 동 채권발행을 늘리고 있다. 또 은행권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ESG 등급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신인도 제고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도 ESG 채권발행에 동참하고 있다. 대체로 소상공인 등 소규모 가맹점의 결제대금 지급주기 단축,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연체료 감면 등 금융지원 용도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최근 국민연금 등 대규모 기관투자자들도 ESG 채권 인수 등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채권발행의 유인이 되고 있다. 특히 올해 신용경색으로 인해 카드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여전사들은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하기에 ESG 채권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해석된다.
전기차 배터리 개발 기업에 대한 투자 및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그린본드(green bond) 성격의 ESG 채권발행에 적극적인 은행권에 비해 여전사들의 ESG 채권은 주로 소셜본드(social bond) 발행에 국한된 면이 있다. 여전사들도 ESG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을 활용해 공익창출과 사업 다각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ESG에 부합된 사업을 통해 공익성 외에도 여전사의 수익성 제고도 기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그린본드 형태의 ESG 채권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자동차 구독경제 사업 확장에 이용하는 방안이다. 전기자동차 대상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해 구독료를 할인해줌으로써,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유도해 매연 저감이라는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전기차 제조기업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그린본드 발행 목적에 상당부분 부합된다.
자동차 금융은 여전사의 주력사업으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됐다. 하지만 신차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 중고차 할부금융 사업은 은행, 카드사, 캐피탈사의 치열한 각축장이 돼 새로운 자동차 금융 모델 발굴이 필요하다. 이에 친환경 프로젝트라는 ESG의 자금이용 목적에도 부합하고, 여전사의 신사업 발굴 차원에서 중고 전기자동차 대상 구독서비스 모델을 고려해봄직하다.
금융지원 대상을 리스 만료차로 확대할 필요도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중고 전기자동차 대상의 구독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제3자 구독 서비스 중심의 사업모델이 유망하다. 해당 서비스는 중고차 및 리스 만료 자동차를 모바일 등 디지털 채널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구독료가 저렴한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이용시 구독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고려할 수 있다. 미국의 버로우(Borrow)라는 업체는 인기 있는 테슬라의 전기차 중고 모델을 중심으로 구독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ESG 채권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을 친환경 차량 구독서비스에 활용하는 측면에서 공익에 기여하고,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는 여전사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꼭 봐야할 주요뉴스
!["세 낀 집, 8억에 나왔어요" 드디어 다주택자 움직이나…실거주 유예에 기대감[부동산AtoZ]](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6020509352029563_1770251720.jpg) "세 낀 집, 8억에 나왔어요" 드디어 다주택자 움직...
마스크영역
"세 낀 집, 8억에 나왔어요" 드디어 다주택자 움직...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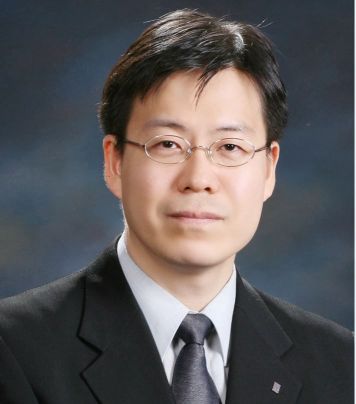

















![[산업의 맥]양자, 준비 없는 미래는 없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009051978520A.jpg)
![[초동시각]배달앱 수수료 규제, 섬세한 접근을](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010344789673A.jpg)
![[기자수첩]AI 강국의 조건은 '영향력'](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009561362505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나혼자 산다' 800만 최고 찍었는데 72% 급감…"아파트 말곤 새 집이 없어요"[부동산AtoZ]](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2013165363780_1766204214.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