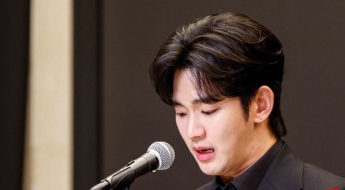러시아, 미국 셰일산업 타격 목적
사우디, 단기간 러시아 항복 받아내려는 듯
양측의 기대와 달리 예상밖 장기전 벌어질 수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가 전 세계에 고통을 안겨준 가운데,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오일 전쟁'에 들어갔다. 수요가 주는 데도, 원유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러시아와 사우디는 무엇을 위해 제살깎아먹기 경쟁에 들어갔을까?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들은 5일과 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OPEC+(주요 산유국 10개국 협의체)를 열어 감산을 논의했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원유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회의였다. 하지만 러시아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감산을 거부했다. 이후 사우디는 전격적으로 원유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오일전쟁' 개막을 선언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3년간 국제 유가를 관리해왔던 산유국 간의 협의 채널은 깨지게 됐다.
러시아는 왜 유가 하락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감산을 거부했을까.
일차적으로는 러시아는 유가 하락을 유도해 경쟁자였던 미국의 셰일산업에 타격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국은 셰일을 통한 원유 개발 등에 힘입어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됐다. 다만 사우디나 러시아 등의 원유와 달리 채굴단가가 높다는 점이 약점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유지될 경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이 기준선이 무너지면 채산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러시아로서는 각종 제재로 경제에 부담을 안겨줬던 미국에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현재와 미래의 잠재적 경쟁자를 무너뜨리려 했을 수 있다.
더욱이 러시아는 그동안 원유 수출을 통해 쌓아둔 재정적 여력도 충분한 상황이다. 유가가 하락해도 1500억달러(183조원) 국부펀드 등을 통해 쌓아둔 자금으로 버텨볼 만 하다는 것이다.
물론 러시아는 무적이 아니다. 당장 재정적 타격이 크지 않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러시아가 짊어질 부담도 크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개헌을 통해 임기를 2036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푸틴의 장기 집권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러시아 경제의 성장세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재정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유가 하락으로 재정수입이 줄면 사업 지출에 타격은 불가피하다.
사우디의 경우는 더 위험하다. 사우디의 경우 러시아처럼 저유가에 대한 대비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현대화 계획 등으로 필요한 재정 수요는 크기 때문이다. 사우디의 경우 저유가가 되면 1200억달러의 재정적자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유 부국이지만 이처럼 재정적자가 크면 사우디로서는 감당하기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사우디가 증산까지 밝히면서 유가를 끌어내린 것은 실은, 짧은 기간 내 러시아의 항복을 받아내려 했던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재정 사정이 좋은 러시아가 먼저 손을 들지는 의문이다.
미국의 국제 문제 전문 싱크탱크 대서양위원회의 중동전문가 장 프랑수아 세즈넥 은 "지금 돌아가는 모습은 세계 1차대전을 생각나게 만든다"면서 "프랑스와 독일은 당시 크리스마스가 끝나기 전에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4년간 참호 속에 전쟁을 벌였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사우디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오일전쟁'에 파국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또 19억 판 아버지, 또 16억 사들인 아들…농심家 '셋째 父子'의 엇갈린 투심[상속자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6013009165322085_1769732214.jpg) 또 19억 판 아버지, 또 16억 사들인 아들…농심家 ...
마스크영역
또 19억 판 아버지, 또 16억 사들인 아들…농심家 ...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19040908144349071_155476528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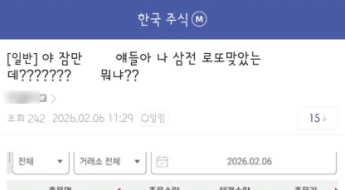






!["쉿! 말하지 마세요" '통 김밥' 베어먹었다간 낭패…지금 일본 가면 꼭 보이는 '에호마키'[日요일日문화]](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6162132271_1770362181.jpg)
!["삼성·하이닉스엔 기회" 한국 반도체 웃는다…엔비디아에 도전장 내민 인텔[칩톡]](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031309072266065_1741824442.jpg)

![[상속자들]신라면 믿고 GO?…농심家 셋째 父子의 엇갈린 투심](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3009165322085_1769732214.jpg)






![[기자수첩]전략적 요충지, 한국GM에 닿지 않나](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1061194711A.jpg)
![[기자수첩]설탕·밀 가격 인하 '눈 가리고 아웅'](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0485436390A.jpg)
![[논단]정말 시장은 정부를 이길 수 없을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710012185549A.jpg)

![1년새 10배 올랐는데 아직 더 남았다…폭발 성장하는 이 기업[주末머니]](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811051332854_1770516313.pn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