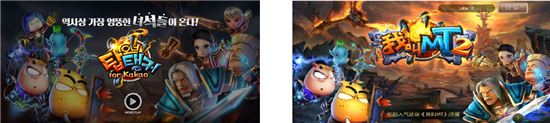
넥슨의 모바일게임 '탑오브탱커'(왼쪽)는 중국 게임업체 로코조이의 '마스터탱커2'(오른쪽)를 한국어 버전으로 출시한 것이다.
넥슨·웹젠·팡게임 등 중국게임 앞다퉈 수입
"개발자 한명 한명이 원천기술인데…푸대접에 해외로"[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중국에 잠식당하고 있다. 중국 모바일 게임이 대거 수입되는 것은 물론 기술까지 역전당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모바일게임의 국내 성공사례가 늘면서 국내 업체들이 앞다퉈 중국 모바일 게임 수입에 나서고 있다. 웹젠은 '뮤 오리진'의 흥행을 잇기 위해 지난 1일 중국의 퍼블리싱 업체 U9게임과 손잡고 모바일게임 '용창각성(중국명)'을 국내에 서비스하기로 했다. 넥슨 역시 중국 창유사의 모바일 게임 '천룡팔부3D'를 출시할 계획이다. 팡게임도 중국 모바일게임을 수입해 '도봉전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국내 업체들이 앞다퉈 중국 모바일 게임을 수입하는 것은 흥행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현재 구글플레이 매출 순위 2위에 올라 있는 웹젠의 '뮤 오리진'은 중국 게임업체 킹넷의 '전민기적'이 원작이다. 넥슨의 '탑오브탱커' 역시 중국 로코조이의 '마스터탱커2'를 국내화 한 것이다.관련업계는 이와 같은 수입 현상에 대해 중국 모바일 게임 수준이 높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정보기술(IT)전문 매체 벤처비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간 중국에서 출시된 모바일 게임은 모두 3만4000여개. 하루에 출시되는 게임 수만 140여개라는 소리다. 이 중 지금까지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은 9%인 3000개. 치열한 중국 게임 시장에서 살아남은 게임은 국내 모바일 게임 이상이라는 평가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은 온라인게임처럼 상대적으로 많은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다"며 "10명이 할 일을 중국에서는 100명이 붙어서 하다 보니 우리 게임보다 게임성이 한수 위"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모바일게임의 수준이 높아진 배경에는 국내 게임 개발자들의 인력 유출도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중국 게임업체 넷미고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저장성에 '한국모바일게임 개발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국내 유망 게임 개발자와 게임사를 중국에 유치하기 위해서다. 사무공간과 숙소를 3년간 무료로 제공하고 각종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의 경우 제조업과 다르게 개발자 한명 한명이 원천기술"이라며 "국내에서 푸대접 받느니 차라리 인정받고 임금도 많이 주는 해외로 나갈지 고민하는 개발자가 많다"고 전했다.
여기에 중국업체들은 자금력까지 갖추고 있다. 풍부한 자금력은 국내 게임업체들의 지분을 사는데 사용되고 있다. 텐센트는 2012년 카카오에 720억원을 투자해 13%의 지분을 확보했다.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에 이어 2대 주주의 자리에 앉았다. 또 지난해 3월에는 CJ게임즈에 약 5300억원 규모를 투자해 CJ게임즈의 지분 28% 확보, 3대 주주가 됐다.
이어 파티게임즈에 200억원, 네시삼십삼분에는 라인과 함께 1000억원을 각각 투자했고 자사 자본을 투입한 벤처캐피털인 캡스톤 파트너스를 통해 50개 이상의 국내 게임 게임에 간접적으로 투자를 진행했다. 중국 게임사 로코조이도 지난달 26일 무선통신사 이너스텍을 인수해 국내 상장사가 됐다. 룽투게임즈도 지난 2월 6일 온라인 교육업체 아이넷스쿨을 인수한 바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게임산업은 규제산업이지만 중국은 게임을 차세대 먹거리로 인식,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중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압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