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밖의 그림자들은 아직도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자전거에 비닐봉지를 싣고 페달을 밟았다. 자전거가 그림자가 없는 주인을 업고 달렸다. 얼마쯤 달려왔을까. 그가 달려온 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자전거는 제자리에서 헛돌고 있었다.
지금도 전당포 입구에는 긴 줄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 시간에도 저 멀리서 그림자 무리들이 다가와 기나긴 줄이 된다. 긴 줄은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은 그림자다. 아직도 전당포에 가면 그 앞을 기웃거리는 그림자가 있다. 비닐봉지를 싣고도 출발하지 못한 자전거들도 있다.
■어떤 단어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슬프다. '전당포'도 그중 하나다. 그 이유는 달리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공감할 것이다. 대부분 외진 골목 허름한 건물의 이 층이나 삼 층 한 귀퉁이에 자리 잡고 있는 '전당포'는 그곳을 찾는 사람들의 처지를 꼭 그대로 축약해 옮겨다 놓은 듯하다. 시인이 적어 놓았듯이 "아직도 전당포에 가면 그 앞을 기웃거리는 그림자"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생을 저당 잡힌 사람들이 꼭 그들뿐일까. 정도는 다르지만 누구나 이런저런 '전당포'에 매여 있기는 매한가지일 것이다. 채상우 시인
꼭 봐야할 주요뉴스
 "가만히 들고만 있었는데"…삼성·하이닉스 덕에 7...
마스크영역
"가만히 들고만 있었는데"…삼성·하이닉스 덕에 7...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후 한 詩]전당포에 가면/김태우](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18082709072850195_1535328447.jpg)




![동갑내기 캠퍼스 커플…"예뻐보이더라" 정원오, 배우자 문혜정 첫 인상[시사쇼][배우자 열전]①](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0808171783102_176782783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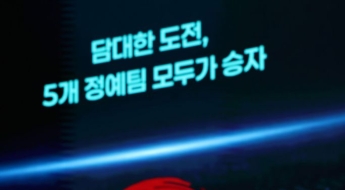






![[짜발량이]문화예술진흥기금 존중 받으려면](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0913462777543A.jpg)
![[기자수첩]반도체 산단, 정치논리 안된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0913385124234A.jpg)
![[시시비비]개성공단, 제대로 띄워보자](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0908554463826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비싸도 잘 팔린다고?"…달라진 라면시장, 무슨일이[주머니톡]](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32010373011041_17108986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