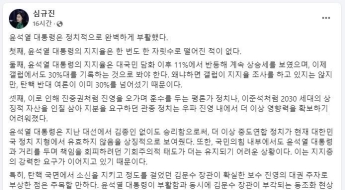어디든 빨리 떠나는 기차표를 사들고 오다 보니, 여깁니다. 익산 미륵사지. 결국은 절에서 비를 봅니다. 백제의 풀밭에 내리는 비 구경만도 좋은데, 꿈에 그리던 '임'이 곁에 있습니다. '미륵사지 석탑'. 해체해서 다시 세운다는 소식이 들릴 때부터, 간절히 보고 싶었지요. 대학생 시절에 보고, 오늘 봅니다.
1934년 우현(又玄) 고유섭(高裕燮)은 이 탑에 관한 논문에 '익산 용화산 아래 버려진 다층탑'이라고 쓰면서 가슴 아파했지요. 그의 제자(황수영)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탑은 금세기 초에 붕괴된 그대로 '응급 수리'한 것으로, 기이한 모습 그대로 서 있다. … (첫 인상은) '큰 돌로 세운 빌딩'같은 느낌…."
이 무렵의 사진 속 풍경은 더욱 처연합니다. 덩치가 커서 더 슬퍼 보입니다. 탑 뒤로 보이는 여남은 채의 초가집들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흉가처럼 서 있는 석탑 옆으로, 식민지의 농부가 지게에 나뭇짐을 지고 갑니다. 탑이 건축의 장르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워집니다.
"어느 날/선화는/미륵산 아래/산책하다/미륵불 캤다//땅에서/머리만 내놓은/미륵부처님의/돌.//마동왕의 손가락/이끌고 다시 가보았다,/안개./비단 무지개,//백성들이 모여/합장, 묵념.//그들은/35년의 세월/머리에 돌 이고/염불 외며/농한기/3만평의 땅에/미륵사,/미륵탑, 세웠다."
복원공사 현장은 6층 높이 가건물입니다. 관람객을 위한 통로 계단을 오르내리며, 미니어처를 보듯이 탑의 전신을 봅니다. '지붕돌' 위를 내려다보고, 살짝 접어올린 '처마 귀'를 쳐다봅니다. 탑의 허리를 눈높이에서 보고, 시멘트 덩이가 사라진 뒤태를 봅니다. 참으로 황홀한 집 구경입니다. 집들이에 초대받은 느낌입니다.
공사가 끝나고 가림막이 벗겨지면, 어떻게 이 각도와 이 높이에서 탑을 볼 수 있겠습니까. 사방으로 문이 나 있는 일층 중심부에서 은은한 빛이 뿜어져 나옵니다. 등불을 밝혀둔 모양입니다. 거대한 석등 같습니다. 한국은 석탑의 나라, '동방 최고의 석탑(東方石塔之最)'이 스스로 뿜어내는 신광(身光)인지도 모릅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는데, '돌집' 안엔 온기가 가득합니다. 화강암 말간 피부에 피가 도는 것처럼 발그레한 기운입니다. '이 빗속에 어딜 가느냐'는 식구들 걱정을 무시하고 내려오길 잘했습니다. 푸른 비 내리는 바깥 풍경이 거대한 연못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탑은 새로 피어나고 있는 연꽃입니다.
아주 싱겁고 실없는 생각도 하나 일어납니다. 1961년 문교부가 펴낸 국보도록에는 이 탑이 '국보 59호'로 나옵니다. 지금은 '11호'지요. 그것이 그저 등록번호에 불과하다는 것은 알면서도, 탑의 가치와 품격에 대한 새로운 자리매김으로 이해하고 싶어집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유치한 집착입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많습니다. 어떤 핑계도 통하고, 무슨 이야기라도 빌미가 됩니다. 비 오는데 무엇 하러 왔느냐 물으면, 빗속에서 보고 싶었다면 됩니다. 꼭두새벽이라면, 해 뜰 때까지 도저히 기다릴 수 없었노라고 말하면 됩니다. 한밤중에 웬일이냐 물으면, 달빛 물든 얼굴이 보고 싶었다면 그만입니다.
이 탑은 올해 연말에 달빛 아래 나온다지요. 그 밤에 다시 와 보고 싶습니다. 작가 현진건이 묘사한 '무영탑(無影塔)'과 견주어보고 싶어집니다. "초생 반달이 탑 위에 걸렸다. 그 빛 물결은 마치 흰 비단오라기 모양으로 탑 몸에 휘감기어 빛과 어둠이 서로 아롱거리며 아름다운 탑 모양은 더욱 아름답게 떠오른다."
무영탑은 백제의 '아사달'이 가서 지었고, 미륵사지탑은 신라의 '백공'이 와서 도왔다지요. 그렇다면, 두 탑 모두 국제적인 명품. 국경을 넘은 러브스토리를 품은 것까지 같습니다. 이 탑의 달밤엔 '선화공주'가 보이고, 불국사 무영탑엔 '아사녀'의 슬픈 그림자가 어른댈 것입니다.
시인
꼭 봐야할 주요뉴스
 "나만 몰랐나"…스타벅스 모든 음료 4000원에 먹는...
마스크영역
"나만 몰랐나"…스타벅스 모든 음료 4000원에 먹는...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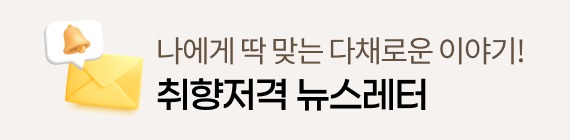


![[윤제림의 행인일기 99]익산에서](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18070608500644353_1530834605.jpg)



!['尹 탄핵 찬성' 10%P 급락…박근혜 때와 무엇이 다른가[폴폴뉴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010815145281518_1736316893.jpg)

![[단독]이준석이 띄운 회심의 '해임카드'…정작 허은아 '직인' 없이 못한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010310312616997_1704245486.jpg)




![일부러 대형마트 찾았는데...집 앞 편의점이 더 싸다?[헛다리경제]](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010913475982938_1736398079.jpg)






![[시시비비] 트럼프 시대, 한국은 중국을 지렛대로 삼을 수 없을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011008225502112A.jpg)
![[법조스토리]尹 수사, 지켜야 할 원칙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011011044551740A.jpg)
![[초동시각]멀고도 험난한 IPO 건전성 제고](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011013363673966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