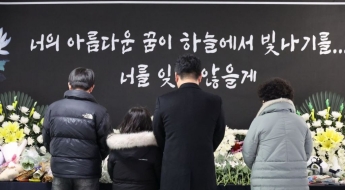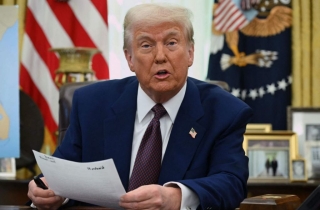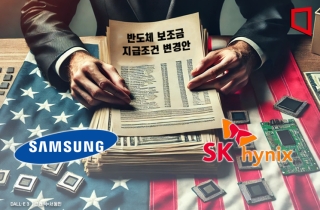[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본격적으로 개막되면서 정상회담 이후 실질적 문제로 떠오른 북한 '비핵화 비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비용이 얼마나 들지, 그리고 누가 어떻게 비용을 댈지 모든 부문이 미지의 영역에 둘러싸인 비핵화 비용 문제를 두고 갖가지 이론들이 난무하고 있다.
비핵화 비용이 만만찮게 들 것으로 추정되고 이중 상당액을 한국이 짊어져야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핵화 비용의 추정규모는 전문가마다 천차만별로 향후 10년간 적게는 200억달러, 우리 돈 '21조'원 규모부터 많게는 2조달러, 우리 돈 '2150조'에 달할 정도로 정확한 추산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북한이 실제 보유, 폐기해야할 핵무기의 개수와 북한 내부 핵시설 규모 등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실제 비핵화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비용'의 규모도 명확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24일 북한 핵무기연구소 관계자들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위한 폭파작업을 했다. 풍계리 핵실험 관리 지휘소시설 폭파순간 목조 건물들이 폭파 되며 산산이 부숴지고 있다. 이날 관리 지휘소시설 7개동을 폭파했다. 북한 핵무기연구소 관계자들은 '4번갱도는 가장 강력한 핵실험을 위해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원본보기 아이콘핵무기 해체 등 직접비용에 대한 사례는 과거 1993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핵폐기나 이듬해 있었던 우크라이나 핵폐기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당시 남아공은 보유 중이던 6개 핵무기와 핵시설 등을 폐기하는데 4억달러 정도가 든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우크라이나 핵폐기에는 6억달러 정도가 소모됐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북한의 경우엔 최소 20기~60기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핵시설은 북한 전역에 수백개가 산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들 나라보다 핵폐기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핵폐기를 위한 직접비용만 50억달러에서 70억달러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이 실제 핵폐기 비용보다 훨씬 큰 지분을 차지하는 것이 보상비용, 즉 북한 경제개발 비용이다. 지난달 13일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Fortune)과 영국의 유라이즌 캐피털 연구소는 북한 비핵화 비용이 10년간 2조달러에 달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는 거의 통일비용까지 모두 산정한 규모로 동·서독 통일 당시 서독이 통일비용으로 추정한 1조2000억달러를 기준으로 측정한 액수다. 실제 핵폐기만을 고려한다면 단기간에 2조달러나 되는 돈이 투입될 규모가 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이 지난달 26일 강원도 원산-갈마 해안관광지역 개발현장을 시찰하는 모습. 북한은 비핵화 보상비용으로 경제제재 해제와 함께 막대한 투자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북한 경제재건 비용에 대한 추산도 연구기관마다 제각각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4년 북한의 철도, 도로, 통신 등 기본 인프라 구축에 들 비용을 20년간 150조원 규모로 추산한 바 있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경제특구 개발과 인프라 투자까지 합쳐 270조원 정도가 소모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일단 핵폐기든 경제개발이든 기본 인프라가 먼저 갖춰져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기, 도로, 철도망 복구가 가장 우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도로 포장율은 2% 남짓, 전력 생산량은 남한의 4% 정도에 불과하고 철도는 70% 이상이 노후화 돼 일제강점기 때 쓰던 것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투자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북한의 경제재건 비용의 경우에는 중국과 한국이란 거대 소비지 사이에 놓인 북한의 지정학적 특성상 상당한 중계이익 발생을 기대하고 많은 기업들의 투자나 국제 투자기금들의 지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 북핵 당사국들이 직접 지불할 비용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핵폐기 비용의 경우에는 미국은 물론 한국과 중국, 일본 간 비용 부담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 향후 협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협상 과정에서 과거 북한 경수로 건설 때처럼 막대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과거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 뒤 시작된 북한 경수로 건설 당시 우리나라는 건설비용 46억달러의 70% 규모 비용을 10년6개월간 투입했고, 일본이 20%, 나머지는 유럽연합(EU)이 일부 부담했으며 미국은 연간 50만톤(t) 수준의 대북 중유지원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운영자금을 부담했다. 2006년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1차 핵실험을 시작하면서 한국이 부담했던 투자금 1조3655억원은 모두 손실처리된 바 있다.
 |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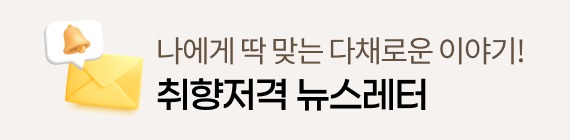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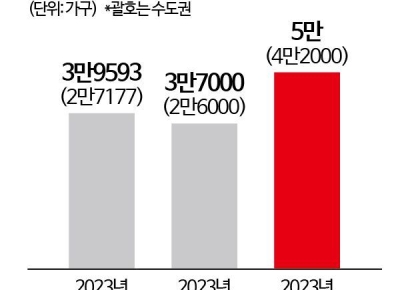





![40년 산 집 떠나는 노인들…"재건축 하면 어디로 가라고"[내 집을 시니어하우스로]](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110200341483729_1730475255.jpg)
![주5일 밥 주는 경로당, 30명 한 끼 예산 7만원 '빠듯'[내 집을 시니어하우스로]](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110200360583747_1730475365.jpg)

![[토허제 해제]매물 거두는 대치동…"분위기 완전 달라졌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021115540828221_1739256848.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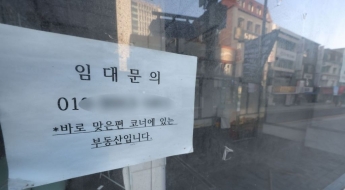
![모셔 오려면 '환율 1800원대' 치러야…광클로는 못구하는 엔비디아 GPU[백종민의 쇼크웨이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021212305329415_173933105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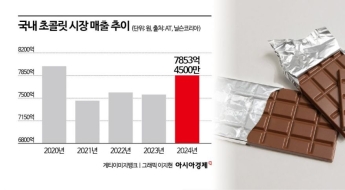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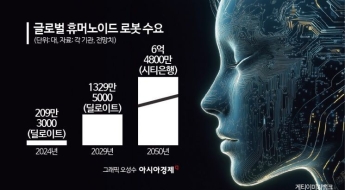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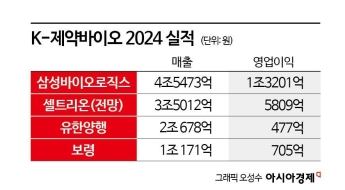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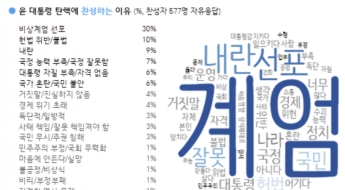
![[기자수첩]민주당, 추경청구서 두렵지 않나](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021410280878614A.jpg)
![[초동시각]'유익'보다 '무해'](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021410044905489A.jpg)
![[시시비비]'거래'라는 트럼프, 세계는 '협박'으로](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021413282854495A.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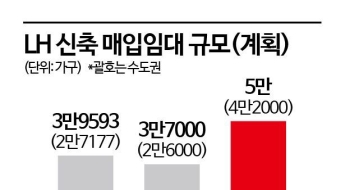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동네에 있는데도 대기 200번째래요"…'그림의 떡' 집 앞 요양원[내 집을 시니어하우스로]](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102416125972541_172975397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