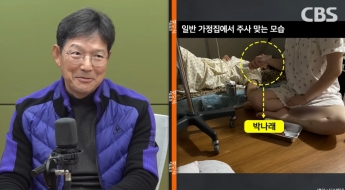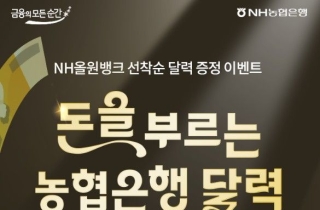선언문에서 남북한은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에 합의하였지만 양측이 생각하는'통일'의 방향이 무척 다르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북한은 주체사상에 의한 통일,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이 둘은 양립할 수 없다. 통일에 합의했다고 그 방식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다. 통일의 강조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또한 민족자주의 원칙이 한미동맹 폐기를 의미할 수도 있다.
오히려 그 뒤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이 나와서 북한 비핵화를 생각하는 한국과는 다르고, 북한의 기존 주장에 가깝다. 비핵화를 위해 각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라는 문구도 남한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 특히 이번 선언에서는 비핵화가 남북의 공동목표임을 확인하였을 뿐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의사는 명시되지 않았다. 핵무기의 시험ㆍ제조ㆍ생산ㆍ보유ㆍ접수ㆍ저장ㆍ사용 금지에 합의했던 1991년의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보다 더욱 애매하다고 비판받는 이유이다.
이번 판문점 선언에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을 전환한다는 합의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올해 내로 북핵이 폐기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북핵이 있는 상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한다는 말이 된다. 또한 평화협정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종전이 선언되면 현재의 휴전상태를 관리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어 한국의 전쟁 억제태세는 크게 약화될 것이고, 비무장지대 관리 등 남북한 분쟁 시 중재자가 사라져 작은 충돌이 악화될 소지가 커진다. 북핵 폐기의 방향조차 분명하지 않는 상태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분명히 성급한 조치이다.
선언문에는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한다는 조항도 있는데,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의 인권, 납치된 한국 국민, 국군포로 송환 문제 등이 거론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선언문에서 한국은 확성기 방송과 전달살포를 중단하고,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지만 북한이 실천해야할 과제로 명시된 것은 없다.
합의내용보다도 합의의 정신이나 남북한 간 신뢰형성이 더욱 중요하고, 한번의 합의를 모든 것을 해소할 수는 없다는 점도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두 사람은 합의에 숨어있는 함정까지 꼼꼼히 찾아서 살펴봐야 문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다음 합의에 반영하여 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안보는 만전지계(萬全之計)라야 한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꼭 봐야할 주요뉴스
![여윳돈 생기면 주식 말고 여기 몰린다…"고금리가 드디어" 21조 뭉칫돈 우르르[실전재테크]](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121009311250124_1765326672.png) 여윳돈 생기면 주식 말고 여기 몰린다…"고금리가 ...
마스크영역
여윳돈 생기면 주식 말고 여기 몰린다…"고금리가 ...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1인당 3500만원까지 받는다"…'직접 지원'한다는 FTA국내보완책[농업 바꾼 FTA]①](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052613261273177_174823357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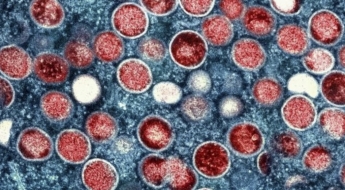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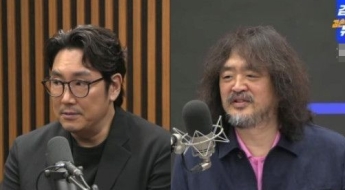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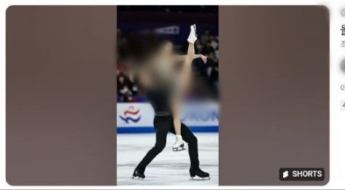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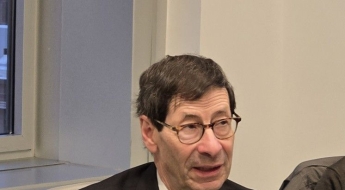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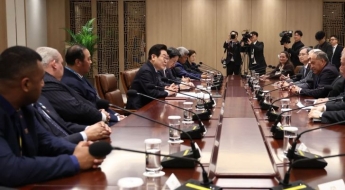


![[시론]경제수석이 안보인다는데…](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1009025928544A.jpg)
![[사사건건]개인정보 유출, 끝이 아니라 시작](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1010405361384A.jpg)
![[기자수첩]SK가 말하는 '구성원 행복'의 조건](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1011081826299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