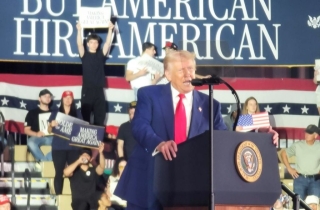요즘 철부지 청소년의 생각과는 한참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이 글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초등학교 4학년들이다. 이 글은 2004년 서울 서정초 4학년생의 소감문 중 일부다. 이 '초딩'들은 게임으로 경제를 배우고 난 뒤 소감문을 이렇게 썼다.
게임은 다양한 능력을 필요로 한다. 그 중에는 리더십도 있다. 토마스 말론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등은 2008년 발간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리더십 교육을 위한 게임의 유용성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다. "온라인 게임 환경에서 업무 활동은 자발적으로 조직되고 협력을 통해 이뤄지며, 조직 내 위계질서도 강하지 않다. 온라인 게임의 리더십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을 통해 미래 기업 리더들이 갖춰야 할 자질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었다."
게임은 미래 리더십에 대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단 이야기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평가는 전혀 다르다. 지금 한국의 대학입시나 기업 신입사원 선발 방식은 1970년대 개발독재 시절에나 요구되던 문제와 답안들로 점철돼있다. 영어라면 어휘 암기 능력, 수학이면 주어진 문제를 기능적으로 빨리 푸는 식이다. 여기에는 우리 사회가 절실하게 요구하는 미래 인재의 창의적 리더십을 판별할 수 있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세상이 이렇게 변한다면 어떨까. 서울대가 게임 속 리더십을 평가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삼성전자가 게임을 활용해 창의적 신입사원을 선발한다. 만일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전국 학부모는 '자식이 게임을 하지 않아 고민'이라고 눈물로 하소연할지 모르고, 어떤 아버지는 아들에게 게임하기를 강요하다 사회적 물의를 빚을지도 모를 일이다. 더 나아가 강남에는 게임 노하우를 교육하는 학원이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다.
게임은 전 세계의 젊은이가 즐기는 공통의 문화다. 다만 장ㆍ노년층이 이용하고 있지 않을 뿐이다. 게임을 청소년으로부터 떼어놓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그리고 굳이 떼어놓을 필요 없이 그 안에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지금의 젊은이가 장ㆍ노년층이 돼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뀔 때까지 그냥 손 놓고 기다리고만 있을 것인가. 서울대가 게임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면 되는 일일까. 보다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중앙대 교수
꼭 봐야할 주요뉴스
 "서울대 동기 대부분 시골 출신…겸손함 배워" CJ...
마스크영역
"서울대 동기 대부분 시골 출신…겸손함 배워" CJ...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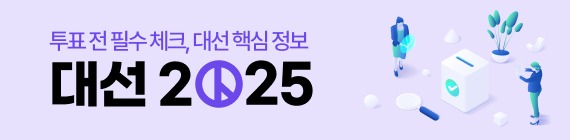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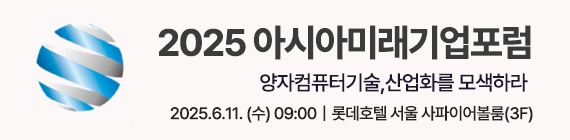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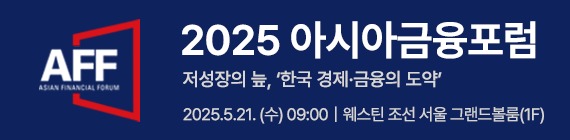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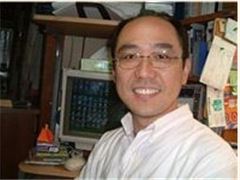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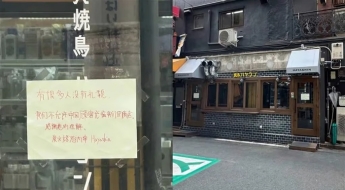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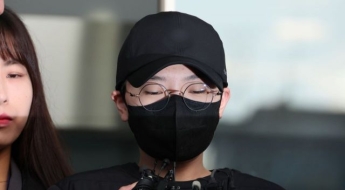


!["과소평가했다" 목표주가 140만원대 '픽'…깜짝실적에 황제주 등극한 삼양식품[특징주]](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051616014061036_1747378900.png)


![AI로봇이 ‘킬러’로 돌변하는 순간 [AI오답노트]](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051711081761461_1747447697.png)





![[소멸]⑦폐교, '깨진 유리창' 될라…소통·빠른 의사결정이 관건](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042316063831973_1745391998.jpg)
![[시시비비] 대선마다 소환되는 노무현 정신](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051611354894551A.jpg)
![[초동시각 ]페라리를 누가 탈 것인가…사모펀드 규제 단상](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051608304206959A.jpg)
![[기자수첩]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사기업 이전 공약](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051613254548253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남친 신고 안 할래요"…정서적 허기 채웠더니 180도 달라졌다[성착취, 아웃]](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051609275259924_174735527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