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가맹점주 배달비 현실화 요구
본사, 여론에 가격 인상 눈치보기 급급
[아시아경제 임춘한 수습기자] “주위에서 치킨 팔아서 남는 게 없으면 그만두라고 하는데 제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파지 주우러 다닐 순 없잖아요.”
16일 서울에 위치한 한 교촌치킨 매장. 가맹점주 A씨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배달 서비스 유료화라도 이뤄진 게 천만다행이라고 반겼다.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에 2년 전부터 치킨 가격 인상을 요구해왔지만 계속 불발됐기 때문이다. 그는 “닭, 식용유, 무 등 원재료비는 물론 인건비, 배달대행 수수료 등 이전에는 나가지 않던 비용들이 많아졌음에도 치킨 가격만 안 올랐다”며 “치킨 값 인상에 대한 반발이 거세니 배달비라도 따로 받아야 살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날 또 다른 교촌치킨 매장의 가맹점주 B씨는 소비자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다고 울부짖었다. 그는 “사람들이 산지에서의 닭 가격하고 치킨 가격을 비교하면서 비판하지만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며 “실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공급받는 닭의 가격은 4500원~5000원 사이고 기름 값, 포장비 등 다른 비용들 다 빼면 고작 2000원정도 밖에 안 남는다”고 한탄했다. 이어 “마진율이 워낙 낮아 하루 평균 190마리 정도를 파는 매출이 높은 매장임에도 점주가 버는 돈은 300만원도 안 된다”며 “장사가 안 되는 매장들은 상황이 더 안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점주들의 이 같은 하소연에도 치킨업계는 가격 인상 눈치보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는 소비자들의 여론을 의식해 제품 가격 인상을 단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업계 1위 교촌치킨이 배달료를 정식으로 유료화 전환하기로 하면서 현재 다른 프랜차이즈 본부들은 교촌치킨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BBQ의 가맹점주 D씨는 인건비 부담이 모조리 가맹점주한테 전가되니 문제라고 지적하며 가맹본부의 가격 인상을 요구했다. 그는 “예전에는 매장 직원 3명을 썼는데 이제는 1명으로 줄이고 그 빈자리를 주인인 내가 나와서 채우고 있다”며 “더 이상 수익을 낼 수 없다고 판단해 이미 가게를 내놓은 상태다”고 울분을 토했다.
다만 BBQ와 bhc는 아직까지 가격 인상이나 배달 유료화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소비자들은 치킨 가격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직장인 도해진(26)씨는 “지금도 치킨 값이 너무 비싼데 대체 얼마를 또 올리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지환(33)씨 역시 “이 가격이면 치킨을 차라리 집에서 직접 튀겨 먹는 게 낫겠다”며 “점주들도 힘들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본사가 가져가는 몫을 줄여야지 소비자한테 모든 것을 다 떠넘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혀를 찼다.
임춘한 수습기자 choo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부자들 몰려들어 사고, 또 산다"…대폭락 우려에...
마스크영역
"부자들 몰려들어 사고, 또 산다"…대폭락 우려에...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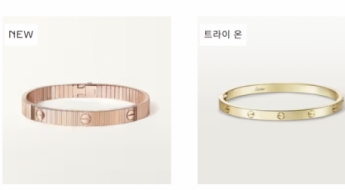

![폭증하는 AI 데이터해법은 그저 '빛'[주末머니]](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210465224669_1769996814.png)




![[Why&Next]다이어트 성공한 롯데免…투심 사로잡은 호텔롯데](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2809241818401_1769559858.jpg)
![[단독]](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209263624254_1769991995.jpg)
![[초동시각] 정책의 속도전·효능감 그리고 지속성](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209352124167A.jpg)
![[전쟁과 경영]전투로봇에게 투항하는 시대](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208451789749A.jpg)
![[기자수첩]법원 판결도 외면한 금감원의 'ELS 과징금 잣대'](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210123659252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10만원, 중국은 3000원"…'골든타임' 놓친 K로봇 부품[로봇 부품전쟁]①](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214230025096_1770009780.png)

![[단독]'간부 모시는 날' 뿌리 뽑는다… '기관명' 공개](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208444324079_1769989483.jpg)




![폭증하는 AI 데이터, 해법은 그저 '빛'[주末머니]](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10/2026020210465224669_1769996814.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