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 과학기술정책 철학 고민해야
버니바 부시의 보고서는 정부가 과학기술활동 지원을 위해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재단형태 기관 설립의 공감대를 형성했고, 과학기술자들의 자기 규율을 운영 원칙으로 하는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설립 기반이 되었다. 1944년 할리 킬고어(Harley Kilgore) 민주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행정부와 대통령에 의해 통제되는 재단 설립 법안과 충돌했지만, 1950년까지 오랜 논쟁을 거쳐 재단의 설립과 운영의 주도권이 정치인에서 과학 기술정책의 주권자인 연구자로 넘어오는 계기를 마련했다. 보고서는 과학자들의 연구 자율성과 도전성을 바탕으로 한 과학기술 발전의 모티브 제공과 과학자의 국가현안 해결 등의 미션을 제안하는 등 현재까지도 과학기술 최고 강국인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추진 기조로 유지하고 있다.
작년 2016년은 과학기술 50년의 해였다. 1967년 과학기술처 출범이후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과학기술행정체제를 갖추고 관련 정책들을 추진한지 50년이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50년을 되돌아 보고 미래 대안을 제시하는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고, 보고서들이 발간되었다. 하지만 대선을 지나면서 관련된 의견들은 희미하게 잊혀 졌고, 새정부는 앞으로 5년만의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새정부는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51년차에 출범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다. 새정부가 집권기간인 5년을 넘어 짧게는 10년, 20년 길게는 50년을 바라보는 실효성있는 과학기술의 비전과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마치 어느날 갑자기 시장에 등장한 것 같지만, 최근 관심을 받는 로봇과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 3D 프린터, 바이오 기술 등 이른바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은 하루아침에 탄생한 것이 아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투자와 관련 분야 기초연구 성과들이 결합해 이제야 빛을 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느 분야보다 과학기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더 이상 압축성장과 패스트 팔로우어 전략은 통하지 않는 시대다. 5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의 성과에만 연연 하지말고, 5년 후에도 기존의 정책들을 보완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추진 기반을 마련해야 성과다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기고]조현병은 위험하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7/2017051010281107754_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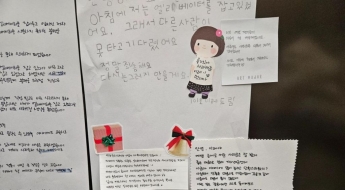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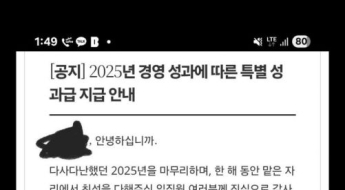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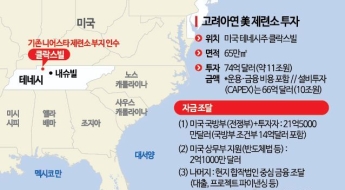


![[THE VIEW]AI를 멈추는 결정의 가치](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1615153957933A.jpg)
![[초동시각]'주사이모'가 의료계에 던진 과제](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1610552473136A.jpg)
![[기자수첩] 정책의 관심이 마른 자리, 식품사막이 생겨났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1615165965420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단독]잡기는커녕 문재인 때보다 더 올랐다…서울 아파트값 연간 상승률 '역대 최고'[부동산AtoZ]](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1614103458030_1765861835.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