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의 한 사립대에 다니는 16학번 박모(21·여)씨는 요즘 가벼워진 주머니 사정에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지난 3월 개강 이후 몰려드는 새내기와의 ‘밥약(식사 약속)’에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로 바짝 벌어 둔 돈이 떨어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박씨는 지금까지 새내기 12명과 12번의 밥약을 가졌다. 새내기와 밥약을 할 때는 대학가에서 비싸고 인기 있는 식당에 데려간다. 박씨는 “싼 음식점에 데려가서 밥을 사주면 뒷말이 나올까 눈치가 보인다”며 “안 사주는 것만도 못한 결과가 나올까 아예 비싼 축에 속하는 식당으로 불리는 파스타 가게나 찜닭 집에 데려간다”고 말했다.
대학 1학기의 중반이 지나고 있는 5월, 대학교 2학년 이상 ‘헌내기’들이 얇아진 주머니 사정에 ‘춘궁기(春窮期)’를 겪고 있다. 3월 개강 때부터 계속된 새내기들과의 밥약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후배와의 밥약을 거부하기 힘든 선배들은 울상이다. 박씨는 “후배들이 밥을 사달라는 건 좋지만 선배한테는 거부권이 없어 사주기 싫은 후배한테도 사줘야 한다”며 “동기들끼리 ‘이제 밥약 그만하고 싶다’고 푸념한 적도 있다”고 하소연 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는 새내기와의 점심 식사비용은 물론이고, 매일 같이 찾아오는 온갖 술자리, MT, 동아리 활동비를 내다보면 등골이 휠 지경이다.
선배들은 밥약에 대비해 고육지책으로 다른 비용을 아낀다. 이씨는 동기들과 밥을 먹을 땐 학식(학생식당)에서 끼니를 때우고, 혼자 있는 주말엔 최대한 굶는다. 또 이씨는 “쇼핑몰에서 사고 싶은 옷을 고르다가도 꾹 참고 사지 않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밥약 자리가 관행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밥약을 해도 선·후배간에 친해지기는커녕 한 번 스쳐가는 인연이 되기 일쑤고, 좋은 인간관계로 발전하는 건 다른 활동을 통해 만난 인연이라는 것이다. 이씨는 “밥약은 친해지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개인적인 만남을 지속하거나 동아리, 학생회 등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친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1인가구의 비극②]"현실 공간에서 사회적 관계망 중요해져"](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7/2017050111224899891_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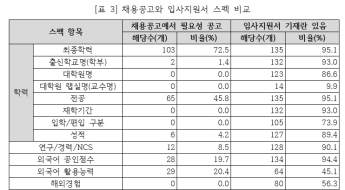

![[초동시각]'1422원 고환율'이 울리는 경고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0208590123465A.jpg)
![[에너지토피아]'재생에너지 85%' 뉴질랜드가 화석연료를 못버리는 이유](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0210445801810A.jpg)
![[기자수첩]'백기사' 찾기 전에 '흑기사'가 되자](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0211071464913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르포]"위험한 용접은 로봇이, 마지막 판단은 사람이"…'공존'의 한화오션 조선소[AI시대, 일자리가 바뀐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2911060772202_176697396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