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는 28Ghz 대역 이용 가능성 높아
전파연구원 "주파수 고저 차이는 유해성 변수 아냐
출력량이 변수…출시전 최대 전자파 엄격 테스트"
국립전파연구원은 21일 "주파수의 높낮이에 따라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 "유해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높낮이가 아니라 주파수의 출력량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기지국과 휴대폰이 어느 정도의 세기로 전파를 주고 받느냐가 문제가 될 뿐 28Ghz의 초고주파수를 쓴다고 해서 특별히 더 걱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내 전자파 흡수율의 안전 기준은 1.6W/㎏으로 스마트폰, 태블릿PC, 웨어러블 기기는 몸 1㎏당 흡수되는 전자파량이 1.6W 이하여야 시중에 판매될 수 있다. 한국의 안전기준인 1.6 W/㎏은 국제권고기준(2 W/㎏)보다도 높은 기준이다. 전자파의 위험 예상 가능 수준보다 50배나 더 엄격하게 설정한 것이다. 휴대폰의 SAR 측정은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0-45호(전자파 흡수율 측정 기준 및 측정 방법)에 따르며 측정값이 기준을 만족할 경우만 판매할 수 있다.
휴대폰 단말기제조사 관계자는 "한국은 전자파 유해성과 관련해 깐깐한 규제로 유명하다. 그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이라야 국내 판매든 수출이든 수입이든 할 수 있다"면서 "5G휴대폰이라고 해서 인체에 더 유해할 것이라는 전망은 기우"라고 말했다.
이르면 2019년 상용화 예정인 5G를 놓고는 글로벌 표준경쟁이 한창이다. 현재 어느 대역의 주파수를 쓸 것이냐를 놓고 국가 간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은 28Ghz 대역을 표준으로 밀고 있다. 이 대역은 국내 이통사에 수백 MHz의 폭을 공급할 수 있어 5G를 위한 최적의 주파수로 꼽힌다.
다만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일본 등 정보통신 강국들도 28Ghz 대역을 밀고 있어 한국의 전략이 세계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미국의 버라이즌, 일본의 NTT도코모 등이 28Ghz 대역을 활용한 시범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국내에선 6Ghz 이하에선 쓸 만한 주파수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세계 최초로 5G 시범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선 우선 활용할 수 있는 28Ghz 이상의 고대역 주파수를 쓸 수밖에 없고 이 대역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자파의 허와 실]초고주파 5G, 건강에 더 해롭다?](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17032111135714509_1.jpg)
![[전자파의 허와 실]휴대폰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딸 낳는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7/2017032111250010208_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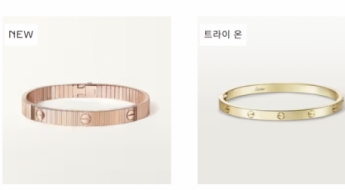

![폭증하는 AI 데이터해법은 그저 '빛'[주末머니]](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210465224669_1769996814.png)




![[Why&Next]다이어트 성공한 롯데免…투심 사로잡은 호텔롯데](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2809241818401_1769559858.jpg)
![[단독]](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209263624254_1769991995.jpg)
![[초동시각] 정책의 속도전·효능감 그리고 지속성](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209352124167A.jpg)
![[전쟁과 경영]전투로봇에게 투항하는 시대](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208451789749A.jpg)
![[기자수첩]법원 판결도 외면한 금감원의 'ELS 과징금 잣대'](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210123659252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10만원, 중국은 3000원"…'골든타임' 놓친 K로봇 부품[로봇 부품전쟁]①](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214230025096_1770009780.png)

![[단독]'간부 모시는 날' 뿌리 뽑는다… '기관명' 공개](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208444324079_1769989483.jpg)




![폭증하는 AI 데이터, 해법은 그저 '빛'[주末머니]](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10/2026020210465224669_1769996814.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