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이 몇 개인가에 대한 정답은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4개 회원국 대부분이 선진국이다. IMF는 2015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39개 국가와 지역을 선진경제권(Advanced economies)으로 지정했다. 이러한 선진 국가와 지역의 발전 경험을 종합해 보면 선진국이 되려면 첫째 과거 개발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효과가 컸고, 둘째 기업의 혁신과 개척 능력이 강하며, 셋째 교육과 문화의 선도 역할이 커야 한다.
1960년 한국의 인당 국민소득은 155달러에 불과해 필리핀(247달러)과 짐바브웨(281달러)보다 적었다. 1960년대 한국은 자원, 산업기반, 수요 및 숙련 인력이 모두 부족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계획수립부터 자원배분 단계까지 경제 전반을 주도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수출주도형 전략을 추진했으며 선진국과의 합작투자를 통해 기술을 도입했다. 또한 새마을 운동, 산림녹화 및 산아제한 운동을 전개해 경제 개발에 매진했다.
정부 주도의 개발정책으로 1962~1997년 한국 경제는 연평균 8.4% 늘었다.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1위로 성장했고 농업기반의 경제에서 중화학 공업 위주로 바뀌었다. 여가 및 해외여행이 확산되고 삶의 질이 크게 제고되었다.
한국의 경험은 지금 중국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중국 경제의 현황은 한국의 1990년대 초반과 유사하다. 1인당 GDP가 1만달러를 바라보면서 중산층이 급증하고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임금도 크게 상승한다. 고비용 구조가 빠르게 정착되고 주식과 부동산 버블 우려 및 부채 위기가 커진다. 중국 정부 주도의 정책 효과가 한계에 직면한 것이다.
이제부터는 기업의 혁신과 개척 능력, 교육 및 문화의 선도 역할이 강조되는데 시장화 및 개방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의 IMF 구제금융의 아픈 경험을 알고 있는 중국은 정부 주도의 경제운용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공급측 개혁',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대중창업, 만인혁신' 등 정책을 통해 중국 기업의 혁신과 개척 능력을 높이려 한다. 하지만 여러 선진국의 경험으로 볼 때 정부가 경제 전반을 통제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혁신과 개척 및 교육과 문화의 선도 역할이 크게 늘어난 경우는 없었다. 중국이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지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올지 모를 중국식 개발이 성공하는 그날을 미리 대비해야 할 것 같다.
김창도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차이나 프리즘]시기별 경제위기와 중국정부의 대응](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7/2016051206472760379_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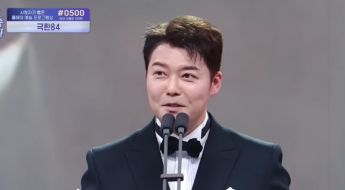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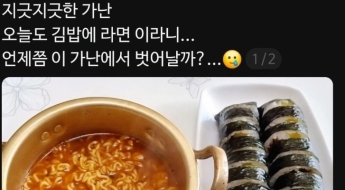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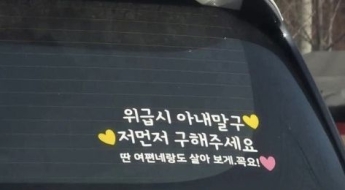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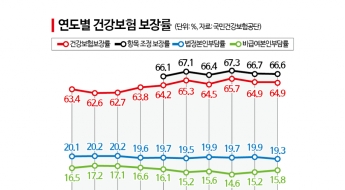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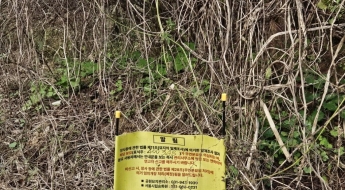
![[시시비비]확장재정의 대가, 물가일 수 있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3010415618027A.jpg)
![[기자수첩]벤처 4대 강국, 빗장 풀기부터](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3010014991698A.jpg)
![[산업의 맥]약가정책, 건강·미래관점 재설계해야](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3009554874672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