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전래동화 '콩쥐팥쥐'의 계모처럼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08년 무렵 A씨와 남편 B씨는 각각 딸 한 명씩을 데리고 재혼했다. 당시 B씨가 데려온 친딸은 초등학교 1~2학년 무렵이었으며, A씨의 친딸은 이보다 3살 많았다.
B씨와 재혼 후 아들을 얻은 A씨는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과 현 남편에게서 얻은 아들만 예뻐했다.
당시 B씨의 친딸인 C양이 학대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친할머니는 C양을 한동안 맡아서 양육했다. 하지만 얼마 못가 할머니가 힘에 부친다는 이유로 C양은 다시 친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졌다.
경찰에서 A씨는 "의붓딸이 다시 집에 돌아오고부터 가정이 화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C양의 친아버지는 직업상 가족과 같이 사는 날보다 집을 떠나 있는 날이 많았다.
친부가 없을 때는 C양은 가족과 함께 밥상에 앉지 못하고 늘 혼자 밥을 먹었다. 온 가족이 삼겹살을 먹을 때도 C양은 따로 차린 밥상에서 먹어야 했다.
지난해 8월 30일에는 계모 A씨가 친딸과 친아들만 데리고, C양은 홀로 집에 남겨둔 채 여행을 떠났다.
여행지에서도 계모는 집 안에 설치해둔 CCTV를 통해 C양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C양이 집 안 청소를 하지 않거나 장시간 집을 비우면 '집안이 돼지우리 같은데 청소는 하지 않고 어디 갔다 왔느냐'며 욕설을 했다.
그 벌로 C양은 같은 날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거실 바닥 걸레질 등 가사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는 다용도실 세탁기 앞에서 가만히 서 있으라는 벌을 받기도 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A씨는 벌을 제대로 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C양의 머리를 주먹으로 세게 밀치고 얼굴을 꼬집었다. 종아리도 10여 대 때렸다.
지난해 9월3일에는 자신의 친아들이 아프다는 이유로 C양에게 '동생을 돌보라'며 수학여행도 가지 못하게 했다.
같은 달 초께는 훈육을 명목으로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허벅지를 꼬집고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또 같은 달 21일 오후 8시께는 A씨는 다이어트를 위해 먹던 단백질 분말 가루가 없어진 것을 알고 이를 추궁했다.
A씨는 '배가 고파 단백질 가루를 먹었다'는 C양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단백질 분말 가루 통을 C양 머리에 덮어씌우고 주먹과 발, 옷걸이 등으로 수차례 때렸다.
평소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C양은 초등학교 5학년 수준으로 아주 왜소해 학급에서 가장 작은 아이였다.
지난해 9월23일에 A씨는 학교에 가려는 C양을 붙잡아 다짜고짜 가방과 소지품 검사를 했다.
신발 깔창 밑에서 1천원짜리가 발견되자 A씨는 또 C양의 얼굴과 허벅지를 꼬집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C양은 계모가 용돈으로 준 5천원을 아껴서 남은 것이라고 말했지만, A씨는 이를 거짓말로 여겼다.
결석이 잦았던 C양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몸의 멍 자국을 발견한 교사가 신고하면서 이러한 학대 사실이 알려졌다.
교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친부도 함께 조사했다.
친부 B씨는 비상근무가 많은 직업 특성상 집을 자주 비워 학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해 기소하지 못했다.
C양 역시 친부의 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일절 진술하지 않았다. 담당 경찰은 "C양이 애써 친부를 보호하려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결국 A씨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는 계모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학대와 상해가 지속해서 가해진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외에 2명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현재 C양은 친부와 계모에게서 분리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계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살짝 부딪혀놓고 "입원했어요" 이제 못할 수도…보...
마스크영역
살짝 부딪혀놓고 "입원했어요" 이제 못할 수도…보...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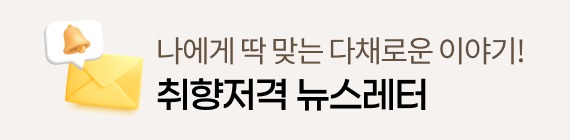










![이낙연 "사법리스크 끝났다는 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이미지 조작"[인터뷰]](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032816243088613_174314667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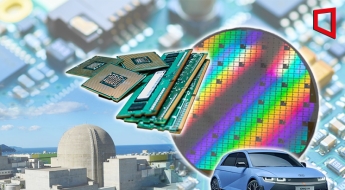


![[리셋정치]헌법재판관들에게 선고의 자유를 줘라](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033107550177694A.jpg)
![[시시비비]'대중문화예술 명예의전당' 이제는 현실 돼야](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033108464452216A.jpg)
![[기자수첩]‘뜨거운 블랙웰’ 들어온다…안전 문제 들여다볼 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033110393155182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