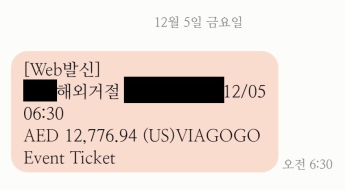'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는 취업 관문을 뚫고 들어간 회사를 얼마 안 다니고 관두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80통이 넘는 입사원서를 쓴 끝에 지난해 삼성전자에 합격했던 박모(31)씨도 같은 케이스다. 그는 6개월을 못 채우고 퇴사했다. 처음에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회사에 취직했다는 주변의 축하와 적지 않은 돈이 통장에 찍히는 것을 보며 만족스러웠지만 빡빡한 일과가 문제였다.
새벽 2~3시를 넘겨 야근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며칠씩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생활이 반복됐다. 퇴사 후 몇몇 회사를 전전했지만 결국 공부를 택했다. 박씨는 "정작 내 삶이 없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다"며 "선생님이 돼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못 버티고 나가는' 신입 직원들이 늘면서 선후배간 관계도 예전만 못하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9년차 직장인 오모(38)씨는 "최근 신입 2명이 부서에 배치됐는데 부서원들 사이에서 얼마나 버틸지를 두고 내기 아닌 내기를 하는 중"이라며 "곧 그만 둘 것을 알기 때문에 업무 인수인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신입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도 있다. 그는 "쥐꼬리 만한 월급도 문제지만 회사의 경직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근성이 떨어지는 신입 직원들도 문제이지만 경직된 기업 문화가 이들을 내모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세태는 돈보다는 자기만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상을 대변하기도 한다. 이시한 취업교육포털 이시한 닷컴 대표는 "더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 일단 취업했다가 그만두는 '징검다리형' 신입사원이 상당수"라며 "이들은 삶의 질과 비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과거보다 이직이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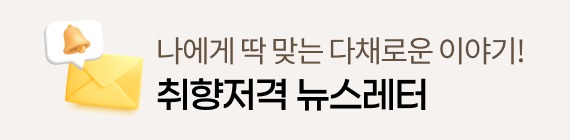
![[청년들이 뿔났다]대기업 들어가도 다시 수능본다…신입사원 퇴사 68%](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16011109212867422_1.jpg)
![[청년들이 뿔났다]'청백전(청년백수 전성시대)'을 아시나요](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7/2016020308211612006_1.jpg)

















![[경제 인사이트]돈 풀어댄다 하니 원화가치 떨어질 수밖에](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0510520023933A.jpg)
![[기자수첩]디지털 재난 시대…개인정보위가 안보인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0510513222182A.jpg)
![[시시비비]'수출 1조달러 달성을 위한 조건'](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0508193591009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