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다니며 일요일마다 '토즈'에 모여 꾸민 음모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게임회사를 다니고 있었지만 제가 진짜 만들고 싶은 게임을 개발하고 싶었어요. 젊을 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냐는 생각이었죠."
임현수 선토 최고기술경영자(CTO)는 3000만명이 즐긴 국민 모바일게임 '애니팡'을 만든 회사의 공동 창업자다.
선토는 지난 2009년 게임회사를 다니던 20대 청년 셋이 일요일에 스터디카페 '토즈'에 모여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작됐다.
그는 "한살이라도 더 먹으면 못할 것 같아서 도전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3년만 고생해보고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회사로 돌아오자고 약속했다. 일요일의 토즈에서 시작했다고 회사 이름도 선데이토즈로 지었다.
사무실이 없어 처음에는 임 CTO의 자취방이나 이정웅 대표의 어머니가 운영하던 학원의 교실에서 작업을 했다. 셋 다 개발자다 보니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디자이너 등 외부 인력이 필요했다. 이들은 아르바이트로 외주 그래픽 작업을 하면서 직원들의 월급을 줬다.
이들이 처음 내놓은 게임은 액션 역할수행게임(RPG). 사람들이 많은 곳에 게임을 출시해야한다는 생각에 페이스북에 게임을 올렸지만 결과는 참패였다. 당시 페이스북이 국내에서 알려지지 않은 탓이었다.
이후 페이스북과 비슷한 싸이월드에 게임을 출시하기로 했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이 낮은 게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임 CTO는 "싸이월드에서 1촌끼리 게임을 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데, 게임까지 어려우면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았다"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퍼즐게임을 개발하면서, 여기에 친숙한 동물을 게임 캐릭터로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후 선토는 '아쿠아스토리'의 PC버전을 출시하면서 처음으로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결과를 거뒀다.
하지만 오래 가지 않았다. 인터넷을 접속하는 형태가 PC에서 모바일로 변하면서 이용률이 급감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 선토는 빠르게 전략을 바꿨다. 모바일게임은 한 번도 시도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장르였다.
선토는 카카오톡을 주목했다. 싸이월드처럼 친구들과 게임을 하는데 최적이라는 판단이었다.
전략은 적중했다. 카카오톡과 애니팡은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켰다. 친구들과 순위 경쟁하고, 서로 하트를 주고받으면서 마케팅 없이 입소문만으로 애니팡은 국민 모바일게임의 자리에 올라섰다.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애니팡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중장년층까지 모바일게임에 친숙해지는 계기가 됐다.
그는 "출시 두 달 동안은 너무 바빠서 밖에 나가지 못해 게임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실감하지 못했다"며 "두 달 만에 링거를 맞으러 병원에 갔다가 카운터에 있는 간호사가 애니팡을 하는 것을 보고 게임이 드디어 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다.
지난 8일 선토는 1년여 만에 애니팡 시리즈의 신작인 '상하이 애니팡'을 출시했다. 108만명의 사전예약자가 모였다.
그는 상하이 애니팡은 선토가 초심으로 돌아간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전히 선토가 스타트업이라고 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재밌는 게임을 만들지 고민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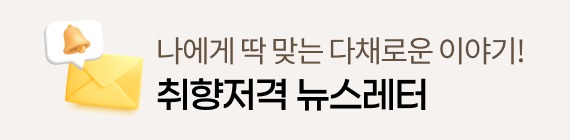






!["아버지가 농심 직원이신가요?" 품절대란…'제니 최애'보다 더 강력한 '동생킥'[먹어보니]](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050207154643389_1746137746.jpg)
![58% 급등의 주인공, 테슬라 아니었다…트럼프 취임 100일간 최대 수혜주는[기업&이슈]](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043015293842023_1745994578.jpg)
!["다이어트 중에도 죄책감 없이 먹어요"…요즘 여대생들 열광하는 편의점[르포]](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042807532636941_1745794406.jpg)









![[날씨] 어린이날 흐리고 비…일교차 15도 안팎](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040914172012949_1744175839.jpg)
![[초동시각]한미 통상협상, 국익 지키는데 여야 없어야](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050211030170171A.jpg)
![[기자수첩]VC '대펀'의 창업, 그냥 넘어갈 일 아니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050210421309554A.jpg)
![[시시비비]](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050210262086986A.jpg)
![황금연휴에 놀러 다니는 건 외국인 뿐…고급 호텔·뷔페서 실종된 현지인들[日요일日문화]](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19050315060296893_1556863563.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