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방식·공정성 논란…재정지원-구조조정 연계조치에 大學들 '한숨'
교육부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르면 DㆍE등급을 받은 일반대ㆍ전문대 66곳은 우선 내년부터 재정지원이 제한된다. 또 등급에 따라 3~15%(A등급 제외)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삭감을 권고받았다. 66개 대학은 재정지원 제한과 함께 구조조정 컨설팅 등을 수행토록 했다.
하지만 평가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대학가에서는 갑론을박이 무수히 쏟아져나오고 있다. 첫번째로 꼽히는 것은 평가방식의 한계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에서 정성평가 요소에 무게를 실었다. 단순한 수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의 질이나 학생 평가 등을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가미된 것이다.
때문에 평가방식에 대한 객관성 시비가 일어 대학이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결과 발표에 앞서 75개 대학(일반대 31개ㆍ전문대 44개)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를 신청하기도 했다.
교육부가 사실상 정원감축을 '강제'하고 있는 것도 논란거리다. 교육부는 A등급(정원 자율결정)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에 3~15%의 정원감축안을 권고했다. 이어 그룹Ⅱ에 해당하는 대학에는 3년 간 컨설팅을 의무화하고, 컨설팅 과제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재정지원 제한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재정지원'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는 만큼 각 대학들이 이같은 요구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방안은 대학 정원감축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 통과가 좌절되면서 교육부가 마련한 '고육책'의 성격이 짙다. 앞서 지난해 김희정 의원(현 여성가족부 장관)이 발의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에 실패한 바 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말이 권고사항이지 교육부가 평가 권한을 쥐고 있는 현실에서 대부분 대학들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평가를 통한 구조조정 방식은 수도권, 지방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작 교육의 질은 제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장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도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DㆍE등급을 받은 대학 명단을 보며 해당 대학에 원서를 써도 될 지 문의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수험생들은 해당 대학의 부실상태가 유지돼 학생들이 받을 불이익이 계속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내비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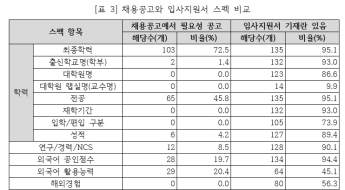
![[초동시각]'1422원 고환율'이 울리는 경고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0208590123465A.jpg)
![[에너지토피아]'재생에너지 85%' 뉴질랜드가 화석연료를 못버리는 이유](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0210445801810A.jpg)
![[기자수첩]'백기사' 찾기 전에 '흑기사'가 되자](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0211071464913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르포]"위험한 용접은 로봇이, 마지막 판단은 사람이"…'공존'의 한화오션 조선소[AI시대, 일자리가 바뀐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2911060772202_176697396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