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계적으로 난민의 수는 6000만명가량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도 넘는 사람들이 자신의 조국 밖에서 떠돌고 있는 셈이지요. 난민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많은 국제기구가 난민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이 쉽게 이해됩니다. 10년 전 900만명 정도였던 난민의 규모가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지요.
난민을 많이 받아들이는 국가들은 대규모 난민 발생국의 인접국가거나 선진국입니다. 아프리카나 중동국가들은 이웃나라에서 내전이나 기근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로 국경을 넘어오는 난민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선진국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예컨대 난민 발생지역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인 캐나다는 연간 20만~30만명씩이나 되는 난민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최대 난민 수용국이었고 유럽국가들도 매년 수만 명의 난민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이들 나라들이 점차 증가하는 난민들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아프리카에서 대규모의 난민이 유입되면서 이탈리아와 스페인 같은 나라들의 난민수용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자 유럽연합(EU)이 각 회원국들이 강제로 난민을 수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처럼, 난민수용이 세계시민의 의무라고 보는 자세는 여전합니다.
선진국들이 난민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난민수용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은 정치적, 종교적 난민을 수용하는 것이 인권문제라고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병역거부자와 동성애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기도 하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또 한편 이 나라들은 난민들이 뛰어난 인적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폴란드 난민 쇼팽은 오스트리아에서, 독일 난민 아인슈타인은 미국에서, 프랑스 난민 빅토르 위고는 영국에서 자신들의 재능을 꽃피운 바 있지요. 모국에서 정치적 혹은 종교적 이유로 박해받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상당한 지성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보호 방안을 만드는 등 우리나라의 난민정책이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보면 난민인정률이 매우 낮은 편이고 무엇보다 난민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난민문제를 조금 더 전향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난민들에 의해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은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난민의 자격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나라들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살아갈 공간을 조금이나마 열어주지 않았더라면 독립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난민의 날은 조용히 지나갔지만 곧 다가올 광복절에도 난민문제를 한 번 생각해 봄 직한 까닭입니다.
김도현 국민대 경영학 교수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충무로에서]'늦참다'인 청와대의 인사정책](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7/2011121510521875273_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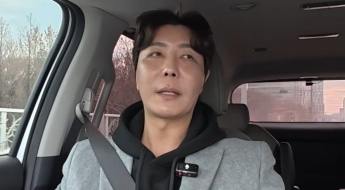




![밤 9시에도 20~30대 여성들 '북적'…어느새 홍콩 일상 된 K브랜드[K웨이브 3.0]⑪](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2215283712126_1769063316.jpg)










![[시시비비]'숙련공' 아틀라스와 '유희로봇' G1이 던진 질문](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2315140037678A.jpg)
![[법조스토리]판검사 수난 시대](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2310510130329A.jpg)
![[기자수첩]트럼프 2기 1년, 마가는 여전히 견고할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2311084104128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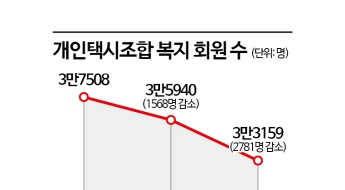
![[Why&Next]노조에 발목잡힌 아틀라스‥벌써 투입된 옵티머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2311181613236_176913469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