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작업은 살아있음을 의미해요. 남에게 작가로 알려지기보다 작업실에서 끊임없이 그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작가란 한편에선 굉장히 야박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일 수 있어요. 그래도 제주의 거상 '김만덕'처럼 남의 이타적인 삶을 보면 감동이 밀려들어요. 그림이 이 사회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보탬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일흔이 넘은 화가의 얼굴과 말투는 소녀 같았다.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젊은 모습이 놀라웠다. 윤석남(76) 작가. 주부에서 화가로, 어느 날 갑자기 나이 사십에 늦깎이로 그림을 시작한 그는 30 여년 세월 동안 그림만큼 더욱 환해지고 빛나는 모습으로 변모했다.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가 그에게는 큰 행복을 주는 듯 했다.
작가가 미술을 시작한 뒤 그린 첫 작품은 바로 '어머니'였다. 그의 어머니는 서른 아홉에 남편과 사별하고 육남매를 혼자 힘으로 키워냈다. 윤 작가는 이런 어머니의 삶을 늘 위대하다고 여겼고, 행상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을 관찰한 뒤 어머니의 형상과 결합해 1982년 '무제'라는 그림을 완성했다. 이후 뜻이 맞는 여성작가들과 함께 '시월모임'을 결성한 뒤 1986년 전시를 열어 모든 희생을 감내하는 어머니상을 미화하는 가부장적인 사회에 비판적인 시선을 담아 '손이 열이라도'라는 작품을 내놨다. 당시 언론과 미술계에 크게 회자된 작품이다. 윤 작가는 "많은 분들이 전시회를 찾아왔다. 여성운동단체도 와서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너무 무식했다. '페미니즘(feminism, 여성주의)'이란 말도 잘 몰랐다"며 "그때야 비로소 '그림이라는 게 그냥 감성만이 아니라 공부도 하고 사회도 보고 하면서 작업을 병행해야겠구나'하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의 작품은 시간이 지나면서 주제와 규모가 커져갔다. 유화 그림에서 나무판자를 배경으로 한 드로잉 및 설치작 등 평면에서 입체로 나아갔고, '어머니'에서 '천 마리가 넘는 유기견' 그리고 '김만덕ㆍ허난설헌ㆍ이매방' 등 역사적 인물까지 작품의 주제로 삼는 인물들이 확장돼 갔다. 그는 "이애신 할머니가 1025마리 버려진 개를 보살피고 있는 것을 기사를 통해 알았을 때, 나 자신에 대해 부끄럽다는 생각과 함께 할머니에 대해선 자랑스러운 마음이 느껴졌다. 감동을 주는 타인의 삶을 번역하는 작업이 기쁨을 준다"고 했다. 이번 신작도 '타인의 삶에 대한 번역'이었다. 윤 작가는 "전 재산 털어서 제주도민을 먹여 살린 '김만덕'의 삶은 '눈물'이다. 슬퍼서가 아니라 감동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문학적 천재성을 지녔지만 결국 이른 나이에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한 허난설헌, 파란만장한 삶을 산 조선의 여류시인 이매창 등의 삶을 제 나름대로 표현하고 싶었다"고 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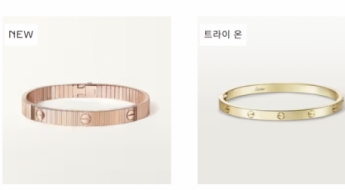

![폭증하는 AI 데이터해법은 그저 '빛'[주末머니]](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210465224669_1769996814.png)




![[Why&Next]다이어트 성공한 롯데免…투심 사로잡은 호텔롯데](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2809241818401_1769559858.jpg)
![[단독]](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209263624254_1769991995.jpg)
![[초동시각] 정책의 속도전·효능감 그리고 지속성](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209352124167A.jpg)
![[전쟁과 경영]전투로봇에게 투항하는 시대](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208451789749A.jpg)
![[기자수첩]법원 판결도 외면한 금감원의 'ELS 과징금 잣대'](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210123659252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폭증하는 AI 데이터, 해법은 그저 '빛'[주末머니]](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10/2026020210465224669_1769996814.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