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중국의 경제 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고정자산 투자는 5개월, 부동산개발 투자는 10개월 내리 하락세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배경은 무엇인가? 수출 부진, 저임금 노동력 감소, 에너지 낭비 및 환경오염 등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과도한 투자에 의존해온 성장이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우선 부동산 거품 리스크를 짚어 보자. 보통 주택가격의 소득대비비율(PIR)의 적정 범위는 3~6배인데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의 PIR는 10배 이상이다. 이를 근거로 부동산 거품 붕괴 우려가 확산됐다. 그러나 중국 전체로 볼 때 PIR는 아직 적정 범위에 있다. 또 중국 정부의 독신자 2주택 구입 제한 등 억제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은 현재 하락 추세다.
지방정부 부채와 그림자금융도 리스크 요인이지만 아직 크게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다. 중국의 공식 통계를 보면 지방정부 부채는 2008년 5조6000억위안에서 2013년 6월 17조8909억위안으로 5년간 약 3.2배 늘었다.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가 부각됐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총부채는 GDP의 53% 정도로 일본(238%ㆍ2012년), 미국(107%)과 비교하면 양호하다. 그림자금융 잔고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15%에서 지난해 상반기 55%으로 늘어나 이슈가 되었으나 유로지역(175%), 미국(160%), 한국(102%)에 비하면 낮다. 중국 정부가 보유한 자산이 총부채의 2배 수준이고 금융권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력을 갖고 있어 유사시에는 채무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특히 이 분야에서 한국과 글로벌 시장이 중국 업체의 수출 공세에 잠식 당한다. 우리의 대중국 수출도 줄어든다. 중국 철강산업의 강재 소비에서 수입 비중이 2003년 15.5%에서 2013년 1.9%로 하락한 반면 수출 물량은 연평균 24.5%씩 늘어났다. 지난해 1~11월 중국산 강재 수출 대상국에서 한국의 비중은 14.2%로 최대이고 동남아 5개국(베트남ㆍ필리핀ㆍ태국ㆍ싱가포르ㆍ인도네시아) 비중은 22.9%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자동차, 조선, 가전 등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도 철강 분야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 협회, 연구기관 등이 지혜를 모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김창도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데스크칼럼]세상에서 가장 만나기 어려운 '나'를 만나보자](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7/2014043009375082926_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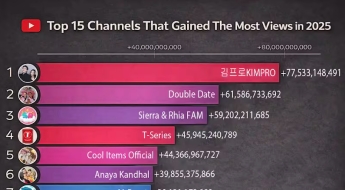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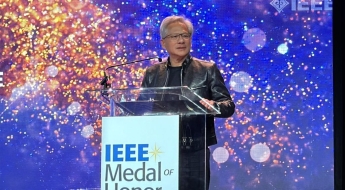



![[단독]퍼시스, 11년만에 '블랙'으로 리브랜딩](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0714472082374_1767764839.jpg)

![[사사건건]이해는 가능해도 면책은 불가능하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0710525403078A.jpg)
![[THE VIEW]69년 독점 이후, 자본시장의 선택](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0613575583032A.jpg)
![[기자수첩]'가시밭길' 재경부 총괄 리더십에 힘 실려야](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0608435972947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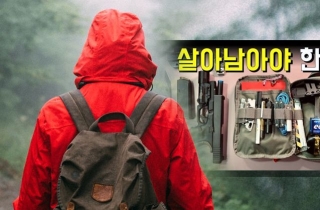

!['마두로 생포' 길 연 전자전기…우리 군도 개발한다[양낙규의 Defence Club]](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10/2026010710373682001_176774985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