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의 기모란 교수(예방의학)가 쓴 '우리가 진정 두려운 것? 에볼라의 역학적 특징과 우리의 준비'라는 제목의 논문이 국내 학술지 '역학과 건강' 최신호에 실렸다.
그는 "대중이 에볼라를 잘 모른 채 겁만 낸다면 방역(防疫)에 실패하기 쉽다"며 "모든 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솔직하게 알리고 교육하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활한 의사소통, 질병에 대한 바른 이해가 대중의 불필요한 불안ㆍ공포ㆍ과잉 반응을 잠재우고 차분하게 에볼라 사태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안이란 것.
우리나라에 에볼라 환자가 입국해 열이 나 병원을 찾을 경우를 가정하면 "입국 당시엔 고열ㆍ출혈 등 에볼라의 증상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므로 항공기 안이나 공항 등에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이 기 교수의 설명이다.
병원 검사 과정에서도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직접 만져야 하는 만큼 의료진이나 행정 인력에 대한 감염 확률도 낮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증상이 악화돼 출혈 상태로 병원을 찾을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환자의 간호나 이송을 위해 접촉한 환자 가족ㆍ의료인 등의 감염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의 혈액ㆍ체액에 노출된 의료인의 감염 위험성이 있다고 봤다.
기 교수는 논문에서 국내에서 에볼라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 환자를 다룰 전문 격리 병상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그는 “국내엔 국가 지정 격리병상을 운영하는 병원이 17곳 있지만 인플루엔자(독감) 같은 호흡기 감염병을 가정해 만든 시설"이라며 "에볼라처럼 혈액ㆍ체액 등으로 전파되는 경우를 고려해 환자가 격리된 곳에서 환자의 혈액ㆍ체액 등 모든 가검물을 검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병상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특히 에볼라 환자의 가검물은 환자의 격리 병상 밖으로 절대 나가선 안 되는데, 국내 병원에선 격리 병상에서 채취한 에볼라 환자의 가검물을 외부로 보내 검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또 에볼라는 가장 높은 단계인 '생물안전 4등급(Bio-safety level 4, BL 4) 실험실에서만 다뤄야 하는 병원체이지만 우리나라는 .BL4 실험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달 질병관리본부내 BL4 실험실이 생기지만 격리병상을 갖춘 대형병원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기 교수는 현재 에볼라 관련 두 번째 논문을 준비 중이다.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에볼라 환자의 사망 때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릴 위험이 가장 높다는 것이 새 논문의 결론이다.
그는 서아프리카 지역 주민들이 장례할 때 망자(亡者)의 입에 입을 맞추는 등 신체 접촉만 피한다면 에볼라 감염자수를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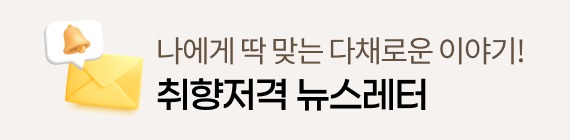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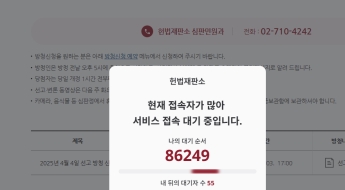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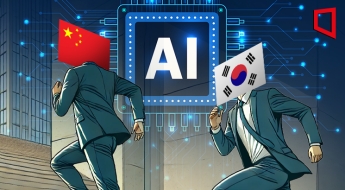

![[기자수첩]韓지도 달라는 구글, 공정경쟁이 먼저](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040313245686563A.jpg)
![[시론]불복을 끝내야 대한민국이 산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040311192764776A.jpg)
![[SCMP 칼럼]저무는 달러의 해…무엇이 대체할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040313531317954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