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 어머니에게 자식 중에 누구를 제일 아끼냐고 질투어린 질문을 하면 늘 열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며 은근슬쩍 넘어가셨다. 결혼해서 철이 들자 어머니는 열손가락 깨물면 다 아프지만 그 중에도 좀 더 아픈 것이 있고 덜 아픈 것이 있다고 하셨다. 뒤돌아보니 친정어머니가 제일 아끼는 딸 중의 하나라고 말씀하셨으면 충분한 답이 되지 않았을까. 어찌됐거나 제일 아낀다고는 하셨으니.
그런데 이 영어의 복수형 최상급 표현이 잘 통용되지 않는 곳이 과학기술이다.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은 인류에게 '가장 커다란' 혜택을 가져다준 과학자에게 노벨상을 수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기술 혁신은 가장 빠르고, 가장 가볍고, 가장 튼튼한 것을 만들기 위한 경쟁의 역사이다. 즉 최고 중의 하나가 아니라 하나의 최고를 이루거나 만들라는 것이다.
이렇게 단수형 최상급이 지배하는 과학기술에서 재미있는 것은 앞서 추측 중 (가)의 경우임에도 단수형을 쓴다는 점이다. 20세기 중반 과학사회학을 개척한 로버트 머튼은 근대 과학에서 비슷한 이론, 원리, 개념에 서로 다른 과학자들이 함께 도달하는 '동시 발견 (multiple discoveries)' 현상을 연구한 논문에서 264건의 동시 발견 사례를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179건이 2명, 51건은 3명이 동시 발견했고 심지어 9명의 과학자가 동시 발견한 경우도 2건이었다.
따라서 과학적 발견에서 '최초'가 중요한 것은 누가 가장 먼저 해당 지식을 만들어냈는가를 따지는 것이 그 지식에 대한 일종의 소유권을 정립하기 때문이다. 다시 궁금해진다. 근대 과학의 보상 구조가 복수형 최상급을 장려했다면 지금 과학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을까? 노벨상이 없어도 과연 노벨상급 연구가 이루어졌을까?
김소형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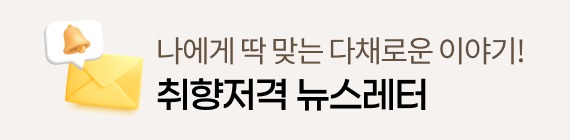
![[충무로에서]과학에서 '최초'가 중요한 이유](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13082711293029880_1.jpg)
![[데스크칼럼]일본은 인정받지 못한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7/2014021810535099749_1.jpg)

















![[정책의 맥]AI 정부, 판을 새로 짜라](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081414532570628A.jpg)
![[기자수첩]'용두사미' 국정기획위원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081410270436115A.jpg)
![[시시비비] 주택연금 가입률 2%를 위하여](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081409580495237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K-9·K-2·함포까지… ‘포’의 모든 것 [양낙규의 Defence Club]](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10/2025081414243984213_175514907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