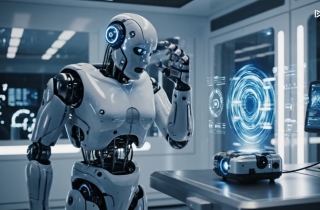특히 삼성증권이 야심 차게 신설했던 홍콩법인에서 1억달러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결국 최고경영자(CEO)가 교체되고 홍콩법인 규모도 크게 줄어드는 과정을 겪었다. 이는 업계에 '삼성증권이 이런 정도면 우리는…'이라는 두려움을 안겨 주기도 했다. 최근에는 싱가포르에 진출했던 국내 금융기관들도 줄지어 철수하는 뼈아픈 경험도 했다.
반면 금융은 수출제조업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정책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다 보니 정부의 개입이 늘 있었고 자립이나 발전은 거리가 멀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규모 공적자금까지 투입했고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커졌다. 금융업의 키워드는 관치와 규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금융기업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다.
하지만 답은 나와 있다. 제조업체가 그랬던 것처럼 금융업계도 해외진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성공 사례도 있다. KDB대우증권의 사례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우증권 사례가 주는 교훈은 첫째,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1994년 1000만달러로 시작해 수차례 증자를 통해 덩치를 키웠고 올해 3억달러로 성장했다. 3개년 진출계획을 세우고, 손실 나면 철수하는 '단기 업적주의'로는 해외 시장 진출에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이 대목에서 삼성증권에 당부하고 싶다. 삼성그룹에 전자만 있고 나머지는 모두 후자라는 우스갯소리가 시중에서 돈다. 대한민국에 제조업만 있고 금융이 없는 것과 닮은꼴이다. 홍콩에서의 실패 사례 때문에 해외진출에 위축되지 말고 원인과 대비책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금융업에서도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명성을 높여 주기 바란다. 성공과 실패는 서로 멀리 있지 않다.
이은형 국민대 경영학 교수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충무로에서]중간계층 근로자의 이유있는 조세저항](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7/2013081310312591669_1.jpg)





!["가방에 달린게 혹시" 매출 2억5000만원 돌풍…한복 담은 'K패션'[NE 커피챗]](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2414063468994_1766552794.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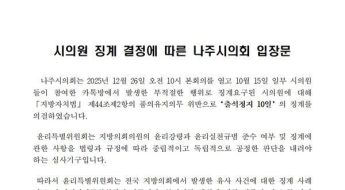


![[단독]'北매체 사이트 개방' 李대통령 지시에 속도냈지만…'방미심위'에 발목](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2609452270132_1766709923.png)




![[기자수첩]줄어드는 기부, 무너지는 울타리](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2613280974543A.jpg)
![[초동시각]'땜질 입법' 전에 민주적 숙의가 먼저였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2611370344816A.jpg)
![[논단]호모 사피엔스와 AI 사피엔스의 미래](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2613385438768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진중권 "이준석은 리틀 트럼프, 한동훈은 정치 감각 뛰어나"[시사쇼]](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2611154270395_176671534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