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칸방에 들어서자마자 숨이 막혔다. 실내 온도는 36.9도나 됐다. 백미자(89)씨는 "매일 다리 통증과 혈압 때문에 약을 먹어야 한다"며 "더우면 문을 열어 놓고 참는다"고 말했다.
원본보기 아이콘"집에 있으면 무척 더워요. 어지러움도 심하고...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주 무더워."
기상재해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추위도 태풍도 아니다. 더위다. 국립기상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모든 기상재해 중 연간 사망자수가 가장 많았던 것은 폭염이었다. 갑작스런 폭염이 덮쳤던 1994년 당시 사망자 수는 3384명에 달했다.
이 날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누상동 일대를 돌아보며 확인한 독거노인들의 '여름나기'는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전아진(83)씨는 반지하 단칸방에 불을 끄고 누운 채 선풍기로 버티고 있었다. "선풍기가 하도 뜨거워져서 물수건을 올려놨어요. 그래도 이것밖에 없는데 어떡해." 전씨의 수입은 기초노령연금 9만원이 전부다. "해가 지면 움직이려고 참고 있었다"는 백씨의 반지하방 실내 온도는 이미 34.5도였다.
2008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독거노인 냉난방 실태조사에 따르면 독거노인 3명중 1명(31.7%)이 열사병과 열경련 등 폭염으로 인한 질병을 겪고 있다. 폭염이 덮쳐도 59.8%는 자신의 집에서 더위를 피한다.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시원한 곳을 찾아 움직이기도 어렵다.
2003년 유럽에서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7만여명이 사망했다. 이 중 4분의 1 가까운 사망자가 프랑스에서 나왔다. 역시 도심의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피해가 집중됐다. 파리에서의 사망자만 4800여명이었다. 응급치료를 해야 할 의료진의 대부분은 휴가를 떠나 도시를 비웠다. 이 때문에 사망자는 더 늘어났다. "과연 우리가 문명국인지 반성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장 대표의 말이다.
먼 나라의 얘기만은 아니다. 2012년 현재 독거노인 119만명 가운데 ‘빈곤층’은 77%인 91만명에 이른다. 이 중 42.5%에 달하는 50만명이 50만원 남짓한 최저생계비로 삶을 유지한다. 지난해 7월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서울시 돈의동 쪽방촌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거주자의 평균연령은 73.4세, 쪽방의 평균 면적은 2.2㎡였다. 게다가 노인들은 체내 수분이 적어 온도 조절이 어렵고 실내 온도가 오를수록 혈압도 쉽게 떨어진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조사에서 폭염으로 인해 건강에 이상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변한 경우는 72.2%다. 올해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발생한 사망자도 6명 중4명이 70대 이상의 고령자였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폭염대책을 내놨지만 눈에 보이는 효과는 없다. 서울시는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고 주민센터, 복지회관, 경로당 등 3733곳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더위를 피할 수 있게 했으나 홍보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날 방문한 집 중 무더위 쉼터에 대해 알고 있는 노인은 아무도 없었다. 심국영(74)씨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안내를 해 준 적이 한번도 없다"고 말했다. 통인시장 입구 정자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던 방순원(79)씨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고 했다. 동네 노인들이 오전부터 더위를 피해 온다는 정자 역시 35도를 넘나드는 기온에 뜨겁기는 마찬가지였다.
홀로사는 노인들에게 선풍기와 모시이불 등을 지원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아름다운 재단 관계자는 "폭염은 사회적 죽음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은 확연히 나뉜다. 장 대표도 "지금까지 노인이나 저소득층의 혹서기 실태조사가 제대로 된 적이 없다"며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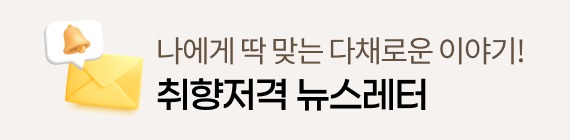


![[포토]무더위에 계곡 찾은 시민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7/2012080115280009888_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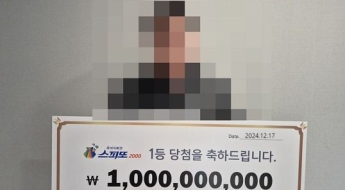










![[초동시각]삶과 죽음 사이의 '끄덕이는 마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121910322215856A.jpg)
![[시시비비]반복되는 슬픔, 더 이상 오지 않으려면](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121911154081806A.jpg)
![[김동기의 뷰포인트]세계가 놀란 시리아 정권 붕괴, 안갯속 중동정세](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4121911290408777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